мЎҙмһ¬мқҳ м„ё к°Җм§Җ кұ°м§“л§җ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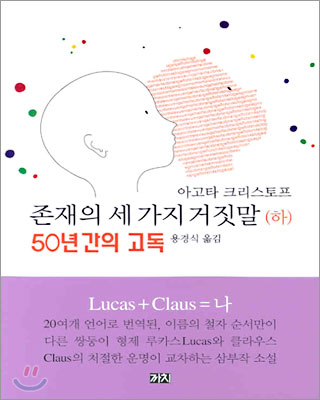
лЈЁм№ҙмҠӨ(Lucas)мҷҖ нҒҙлқјмҡ°мҠӨ(Claus)лҠ” мқҙлҰ„мқҳ мІ мһҗ мҲңм„ңл§Ң лӢӨлҘё мҢҚл‘Ҙмқҙ нҳ•м ңлӢӨ. к·ёл“Өмқҳ мӮ¶мқҖ м „мҹҒ мҶҚм—җм„ң 진н–үлҗңлӢӨ. нҸӯкІ©кіј кіөмҠө, кө¶мЈјлҰјм—җ лҢҖм Ғн•ҙ к°Җк№ҢмҠӨлЎң н•ҳлЈЁлҘј мқҙм–ҙк°„лӢӨ. к·ёл“ӨмқҖ кІ°мҪ” вҖҳм°©н•ңвҖҷ м•„мқҙл“Өмқҙ м•„лӢҲлӢӨ. көӯкІҪмқ„ л„ҳкё° мң„н•ҙ м•„лІ„м§ҖлҘј лҜёлҒјмӮјм•„ м§Җлў°л°ӯмңјлЎң ліҙлӮҙкі к·ёк°Җ м—„мІӯлӮң көүмқҢкіј н•Ёк»ҳ н„°м ё мЈҪмһҗ м•Ҳм „н•ң кёёлЎң лғ…лӢӨ лӢ¬лҰ°лӢӨ. к·ёлҰ¬кі нҳ•м ңлҠ” н—Өм–ҙм§ҖкІҢ лҗңлӢӨ. н—Өм–ҙ진 к·ёл“Өмқҙ м„ңлЎңлҘј м°ҫлҠ” -к·ёлҹ¬л©ҙм„ң к°Ғмһҗмқҳ мӮ¶мқ„ мӮ¬лҠ”- лӮҙмҡ©мқҙ (мӨ‘)к¶Ңм—җм„ң нҺјміҗ진лӢӨ. н•ҳм§Җл§Ң (мӨ‘)к¶Ңмқ„ мқҪлӢӨліҙл©ҙ м–ҙлҠҗ мғҲ кё°л¬ҳн•ң м°©к°Ғм—җ л№ м§ҖкІҢ лҗңлӢӨ. (мӨ‘)к¶Ңмқҙ, (мғҒ)к¶Ңмқҳ лӘЁл“ лӮҙмҡ©мқ„ л¶Җм •н•ҳкё° л•Ңл¬ёмқҙлӢӨ. мІ« к¶Ңмқ„ мқҪм—Ҳмқ„ л•Ң нҷ•мӢӨн•ҳлӢӨкі мғқк°Ғн–ҲлҚҳ мөңмҶҢн•ңмқҳ мәҗлҰӯн„°к°Җ лӢӨмқҢ к¶ҢмңјлЎң л„ҳм–ҙк°Җл©ҙм„ң л§Ҳкө¬ л’Өм„һмқёлӢӨ. м•„лӢҲ, м•„мҳҲ мғҲлЎңмҡҙ мқҙм•јкё°к°Җ мӢңмһ‘лҗңлӢӨкі н•ҙлҸ„ л¬ҙлҰ¬к°Җ м—Ҷмқ„ кІғмқҙлӢӨ. (н•ҳ)к¶ҢмңјлЎң к°Җл©ҙ к·ё кё°мқҙн•ң нҳ„мғҒмқҖ м Ҳм •м—җ лӢ¬н•ңлӢӨ. лЈЁм№ҙмҠӨмҷҖ нҒҙлқјмҡ°мҠӨ к°Ғк°Ғмқҳ к°ҖмЎұ кҙҖкі„лҸ„, мІҳмқҢм—җ м•Ңкі мһҲлҚҳ кІғкіј м җм°Ё кұ°лҰ¬лҘј лІҢлҰ°лӢӨ.
мҶҢм„ӨмқҖ мҙқ м„ё к¶Ңмқҙм§Җл§Ң, л§Ҳм§Җл§ү к¶Ңмқҳ л§Ҳм№Ён‘ңк№Ңм§Җ кјјкјјн•ҳкІҢ мӮҙнҺҙлҸ„ лӮҙк°Җ л¬ҙм—Үмқ„ мқҪлҠ”м§Җ, мқҙкІғмқҙ н•ҳлӮҳмқҳ м–јк°ңлЎң мқҙм–ҙ진 кёҖмқҙ л§һлҠ”м§Җ, л¬ҙм–ј л§җн•ҳкі мһҗ н•ҳлҠ” кұҙм§Җ м•Ң мҲҳ м—Ҷм–ҙ кіөнҷ©мғҒнғңм—җ лҶ“мқҙкІҢ лҗңлӢӨ. лЈЁм№ҙмҠӨк°Җ нҒҙлқјмҡ°мҠӨкі , нҒҙлқјмҡ°мҠӨк°Җ лЈЁм№ҙмҠӨмқёлҚ° лЈЁм№ҙмҠӨлҠ” лЈЁм№ҙмҠӨк°Җ м•„лӢҲкі , нҒҙлқјмҡ°мҠӨлҠ” нҒҙлқјмҡ°мҠӨк°Җ м•„лӢҢ нҢЁлҹ¬лҸ…мҠӨм—җ м§Ғл©ҙн•ҳлҠ” кІғмқҙлӢӨ. мқҙлҠ” лҸ…мһҗмқҳ 집мӨ‘л ҘмқҙлӮҳ мқҙн•ҙлҸ„мҷҖлҠ” н•ҳл“ұ мғҒкҙҖмқҙ м—ҶлӢӨ. л§Өмҡ° кіӨнҳ№мҠӨлҹ° мҶҢм„Өмқҙ м•„лӢҗ мҲҳ м—ҶлӢӨ. м–ҙл–Ө кё°мһҗлҠ” вҖҳлҸ…мһҗлҠ” м–ҙлҠҗ нҺҳмқҙм§Җ, м–ҙлҠҗ мӨ„м—җм„ңлӮҳ л¬ёл“қ мһҗмӢ мқҙ мқҪмқҖ кІғ мӨ‘ м–ҙл–Ө кІғлҸ„ нҷ•мӢӨн•ң кІғмқҖ м—ҶлӢӨлҠ” лҶҖлқјмҡҙ мӮ¬мӢӨмқ„ к№ЁлӢ«кІҢ лҗ кІғмқҙлӢӨвҖҷлқјлҠ” м„ңнҸүмқ„ лӮЁкІјлӢӨ. к·ёкІғмқҙ к·ёлӮҳл§Ҳ мң„лЎңк°Җ лҗҳм—ҲлӢӨ. мқҙ мұ…м—җм„ң л§җн•ҳлҠ” мЎҙмһ¬мқҳ м„ё к°Җм§Җ кұ°м§“л§җмқҙ л¬ҙм—Үмқём§Җ лӮҳлҠ” м•„м§Ғ м°ҫм§Җ лӘ»н–ҲлӢӨ. м•„лӢҲ м–ҙм©Ңл©ҙ, м• мҙҲм—җ кұ°м§“л§җмқҙ мЎҙмһ¬н•ҳм§Җ м•Ҡм•ҳмқ„ мҲҳлҸ„ мһҲлӢӨ.
мқҙ мҶҢм„Өмқҙ м§ҖлӢҢ 함축м Ғ, мӨ‘мқҳм Ғ мқҳлҜёмҷҖ кө¬мЎ°, м ңлӘ©мқҖ л§ҺмқҖ кІғмқ„ мӢңмӮ¬н•ңлӢӨ. лӮҙк°Җ мӮҙкі мһҲлҠ”, лӮҳлҘј л‘ҳлҹ¬мӢј мқҙ м„ёкі„мҷҖ лӮҙк°Җ нҷ•кі н•ҳлӢӨ лҜҝм—ҲлҚҳ 진лҰ¬м—җ лҢҖн•ҙ вҖҳмқҳмӢ¬вҖҷн• мҲҳ мһҲлҠ” л№ҢлҜёлҘј м ңкіөн•ҳлҠ” кІғмқҙлӢӨ. лӘЁм„ңлҰ¬л¶Җн„° мЎ°кёҲм”©, лӮҙк°Җ мҢ“м•„мҷ”лҚҳ кІғл“Өмқҙ л¬ҙл„Ҳм§ҖлҠ” лҠҗлӮҢмқ„ л°ӣм•ҳлӢӨ. лӮҳлҠ” лҢҖмІҙ л¬ҙм—Ү л•Ңл¬ём—җ нҷ•мӢ м—җ м°Ё мһҲм—ҲлҚҳ кұёк№Ң.
лӘ©мӮ¬лӢҳкіј лӮҳлҠ” лӢӨлҘҙлӢӨ. л¶ҖлӘЁлӢҳкіј лӮҳлҠ” лӢӨлҘҙлӢӨ. н•ҳм§Җл§Ң м—„л§Ҳ л§җм”ҖмІҳлҹј лӮҳлҠ”, лӘ©мӮ¬лӢҳкіј л¶ҖлӘЁлӢҳмқҳ мӢ м•ҷ(мҲҳмӨҖ)мқ„ лӮҙ мӢ м•ҷмқҙлқј м°©к°Ғн•ҳл©° мӮҙм•„мҷ”лӢӨ. мқҙкІғмқҙ м°ёмқём§Җ 진лҰ¬мқём§Җ, 진лҰ¬лқјл©ҙ м–ҙл– н•ң к·јкұ°лҘј к°–кі мһҲлҠ”м§Җ, мҷң 진лҰ¬мқём§Җ, к·ём Җ мқҳмӢ¬ м—Ҷмқҙ мҲңмҲңн•ҳкІҢ л°ӣм•„ л“Өм—¬мҷ”лҚҳ кІғмқҙлӢӨ. к·ёлҹ° мқҳлҜём—җм„ң мқҙ мӢ м•ҷмқҖ, лӮҙкІҢ лҸ…мқҙкё°лҸ„ н–ҲлӢӨ. кІҖмҰқ м Ҳм°Ёк°Җ м—Ҷм—ҲлҚҳ кІғмқҙлӢӨ. лӢ№м—°нһҲ мқҳл¬ёмқ„ к°Җм ём•ј н• кІғм—җлҸ„ вҖҳлӢӨ~ н•ҳлӮҳлӢҳмқҳ лң»мқҙлӢӨ!вҖҷлҘј лҢҖмһ…мӢңмјң мүҪкІҢ лӢөмқ„ лӮҙл ёкі , кіЁм№ҳ м•„н”Ҳ мқјмқҙ мһҲмңјл©ҙ н•ҳлӮҳлӢҳмқ„ л°©нҢЁл§үмқҙлЎң мҡ”лҰ¬мЎ°лҰ¬ н”јн•ҙмҷ”лӢӨ. к·ёлҹ° мӢқмңјлЎң мңЎмІҙмқҳ кё°нҡҢлҘј мӮјлҠ” лҚ°м—җ м“°лқјкі мқҙ л§җм”Җмқ„ мЈјмӢ кұҙ м•„лӢҗ н…җлҚ° л§җмқҙлӢӨ.
н•ҙм•ј н• кіөл¶ҖлҘј м ң л•Ң н•ҳм§Җ м•Ҡкі вҖҳләҖм§ҲвҖҷкұ°лҰ¬лӢӨ ліҙлӢҲ кІүл§Ң к·ёлҹҙмӢён•ҳкі мҶҚмқҖ н…… л№Ҳ лҠҗлӮҢмқҙлӢӨ. к·ёкІғмқҙ мҢ“мқҙкі мҢ“м—¬ н•ңкі„м—җ мқҙлҘё кІғ к°ҷлӢӨ. лӘЁл“ кІғмқ„ лӯүлҡұк·ёл Ө вҖҳн•ҳлӮҳлӢҳмқҳ лң»вҖҷмқҙлқјкі лҢҖлӢөн• мҲҳ мһҲм—ҲлҚҳ лӮҳ мһҗмӢ мқҖ, мӢӨмқҖ м ңлҢҖлЎң лҗң м§Ҳл¬ёмЎ°м°Ё к°–м§Җ лӘ»н•ҳлҠ” л©Қн……кө¬лҰ¬мҳҖлҚҳ кІғмқҙлӢӨ.
к·ёлҹјм—җлҸ„ мӢ кё°н•ң кұҙ, н•ҳлӮҳлӢҳмқҳ мЎҙмһ¬лҠ” лҜҝм–ҙ진лӢӨлҠ” кІғмқҙлӢӨ. лӢӨн–үнһҲ вҖҳ진лҰ¬вҖҷлқјлҠ” лӘ…нҷ•н•ң лҸ„м°©м җмқҙ мһҲмңјлӢҲ, мқҙм ң м„ұмӢӨн•ҳкІҢ н•ҳлӮҳн•ҳлӮҳ м§ҡкі мӮҙн”јл©° кұём–ҙк°ҖлҠ” мқјл§Ң лӮЁм•ҳлӢӨ. 진лҰ¬лҘј н–Ҙн•ҙ к°ҖлҠ” м—¬м •мқҖ мҲЁ к°ҖмҒҳл©ҙм„ңлҸ„ м“°кі лӢ¬мҪӨн•ҳлӢӨ. м–ҙл–Ө м§ҖмӢқмқҙл“ вҖҳн•ҳлӮҳлӢҳвҖҷмқ„ лҢҖмһ…н•ҙ мҶҚнҺён•ҳкі л№ лҘё кІ°лЎ мқ„ м–»мңјл ӨлҠ” мҡ”н–үмқ„ н”јн•ҳлҠҗлқј мҲЁмқҙ к°ҖмҒҳкі , м„ёмғҒмқҳ л¬ҙмҲҳн•ң м§Җнҳңмһҗл“Өмқҙ лӘ…м„қн•ң л‘җлҮҢлЎң 집필н•ң м Җм„ң мҶҚм—җм„ң кІ°мҪ” вҖҳнҷ•мӢӨн•ЁвҖҷ (진лҰ¬)мқ„ м°ҫмқ„ мҲҳ м—Ҷкё°м—җ м“°л©°, м–ҙм°Ңлҗҗкұҙ лӮҳлҠ” лҸ„лӢ¬н• 진лҰ¬к°Җ мһҲкё°м—җ лӢ¬мҪӨн•ҳлӢӨ.
кіөл¶Җн•ҙм•јкІ лӢӨ. н•ҳлӮҳлӢҳмқҳ м§ҖнҳңлЎң л¬ҙмһҘн•ҙм•јкІ лӢӨ. н•ҳлӮҳлӢҳмқ„ м•Ңкё° мң„н•ң м§ҖнҳңлҠ” кө¬н•ҳл©ҙ мЈјмӢ лӢӨ н•ҳм…ЁмңјлӢҲ кё°лҸ„лҸ„ м—ҙмӢ¬нһҲ н•ҙм•јкІ лӢӨ. н• кІҢ л„Ҳл¬ҙлӮҳ л§Һм•„ 짧мқҖ мқёмғқмқҙлӢӨ. н•ҳлӮҳлӢҳмқҳ м§ҖнҳңлЎң лӘЁл“ кІғм—җ нҶөлӢ¬н•ҳлҠ” лӮ мқҙ мҳӨл©ҙ, вҖҳмЎҙмһ¬мқҳ м„ё к°Җм§Җ кұ°м§“л§җвҖҷмқҙ л¬ҙм–ём§Җ к°„нҢҢн•ҙлӮј мҲҳ мһҲмқ„ мӨ„лЎң лҜҝмҠөлӢҲлӢӨ!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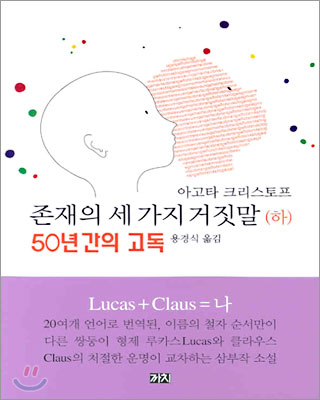
 лҲ„, лҲ„кө¬лғҗ л„Ң?
лҲ„, лҲ„кө¬лғҗ л„Ң? <мң м§ҖлӢҲм•„> 섬лң©н•ң м•„лҰ„лӢӨмӣҖм—җ л§ӨлЈҢлӢ№н•ң к°Җмқ„ л°Ө
<мң м§ҖлӢҲм•„> 섬лң©н•ң м•„лҰ„лӢӨмӣҖм—җ л§ӨлЈҢлӢ№н•ң к°Җмқ„ л°Ө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