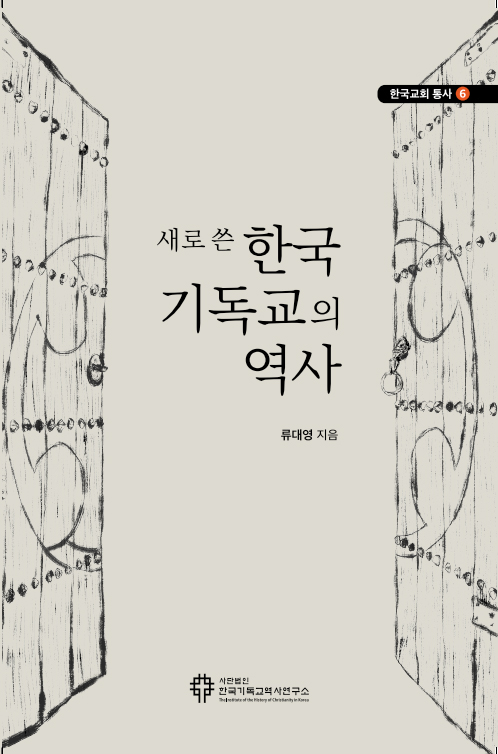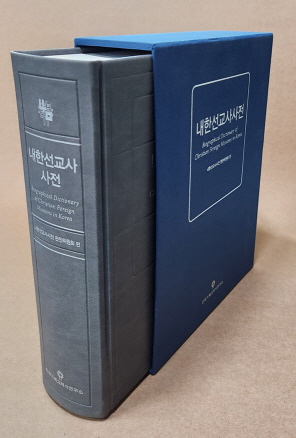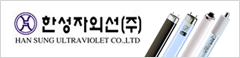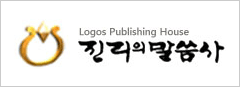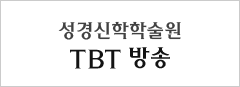мӢ н•ҷ
л°”лҘҙнҠёмқҳ мӢ н•ҷ, кё°лҸ…көҗм Ғ мІ н•ҷмңјлЎңм„ң н•ҷл¬ё
мҡ°лҰ¬лҠ” л°”лҘҙнҠёк°Җ көҗнҡҢмқҳ кё°лҠҘмқ„ вҖңмӢ н•ҷ, н•ҷл¬ё(Theo-logie, Wissenschaft)вҖқмңјлЎң к·ңм •н•ҳкі мһҲлӢӨкі м ңмӢңн–ҲлӢӨ. л°”лҘҙнҠёмқҳ кёҖмқҖ л„Ҳл¬ҙлӮҳ м•„н”Ҳ л¶Җ분мқ„ м°ҢлҘҙлҠ” кІғ к°ҷлӢӨ. к·ёлҹ¬лӮҳ к·ёлҹ¬н•ң лӘ…лЈҢн•ң м§Җм Ғм—җ лҢҖн•ҙм„ң лӢөліҖн•ҳм§Җ лӘ»н•ң көҗнҡҢлҠ” м–ҙл–»кІҢ н•ҙм•ј н• к№Ң? к·ёлҹ¬лӮҳ мӢ н•ҷмһҗлҠ” м•Ҫм җмқ„ көҗнҡҢм—җ м§Ҳл¬ён•ҳлҠ” кІғмқҙ м•„лӢҲлқј, көҗнҡҢк°Җ кіөкІ©мқ„ л°ӣмқ„ л•Ң ліҖнҳён•ҳлҠ” мң„м№ҳм—җ мһҲм–ҙм•ј н•ңлӢӨ. к·ёлҹ°лҚ° л°”лҘҙнҠёлҠ” л°ҳлҢҖлЎң көҗнҡҢк°Җ к°–кі мһҲлҠ” м•Ҫм җмқ„ нҢҢм•…н•ҙм„ң көҗнҡҢм—җ м§Ҳл¬ён•ңлӢӨ. көҗнҡҢлҘј ліҖнҳён•ҳлҠ” мӢ н•ҷмһҗк°Җ м•„лӢҢ көҗнҡҢм—җ м§Ҳл¬ён•ҳлҠ” мӢ н•ҷмһҗмқҙлӢӨ. к·ёмқҳ м§Ҳл¬ёмқҖ л„Ҳл¬ҙлӮҳ м •м§Ғн•ҳкі мҳҲлҰ¬н•ҳлӢӨ. к·ёмқҳ м§Ҳл¬ём—җ лӢөн• мҲҳ м—ҶлӢӨ. к·ёлҹ¬лӮҳ лӢөн•ҳм§Җ лӘ»н•ҳкё° л•Ңл¬ём—җ нҢЁл°°лҘј мқём •н•ҳлҠ” кІғмқҙ м•„лӢҲлӢӨ. мҳӨнһҲл Ө лӢөн–ҲлӢӨл©ҙ л¬ём ңк°Җ нҒҙ кІғмқҙлӢӨ.
л°”лҘҙнҠёк°Җ м§Ҳл¬ён•ң кІғмқҖ көҗнҡҢм—җм„ң н–үн•ҙм§ҖлҠ” м„Өкөҗмқҳ к·јмӣҗмқҙ м–ҙл””мқҙл©°, м„Өкөҗмһҗк°Җ л§җн•ң м–ём–ҙм—җм„ң мҳҲмҲҳ к·ёлҰ¬мҠӨлҸ„к»ҳм„ң н•ҳмӢ л§җмқҙ лӘҮ %к°Җ лҗҳлҠ”м§Җм—җ лҢҖн•ң л¬јмқҢмқҙлӢӨ. л°”лҘҙнҠёлҠ” кіјкұ°м—җлҠ” 분лӘ…нһҲ н•ҳлӮҳлӢҳмқҳ кі„мӢң м—ӯмӮ¬к°Җ мһҲм—ҲлӢӨкі мқём •н•ңлӢӨ. к·ёкІғмқҖ нҳ„мһ¬ көҗнҡҢк°Җ кіјкұ°м—җ м—°мҶҚмқ„ л‘җкі мһҲкё° л•Ңл¬ёмқҙлӢӨ. к·ёлҹ¬лӮҳ к·ё кі„мӢң м—ӯмӮ¬ кё°лЎқм—җ лҢҖн•ң 진мң„м„ұм—җ лҢҖн•ҙм„ңлҠ” мқём •н•ҳм§Җ м•ҠлҠ”лӢӨ. мҳӨнһҲл Ө кі лҢҖ көҗнҡҢм—җ кІ°м •н•ң кіөкөҗнҡҢмқҳ кІ°м •м—җ лҢҖн•ҙм„ңлҠ” мқҳмӢ¬н•ңлӢӨ.
л°”лҘҙнҠёлҠ” 진лҰ¬ л¬ём ң(л¬јмқҢ, Wahrheitsfrage)лқјкі н–ҲлӢӨ. л°”лҘҙнҠёлҠ” көҗнҡҢмқҳ мЎҙмһ¬лҘј мҳҲмҲҳ к·ёлҰ¬мҠӨлҸ„лқјкі к·ңм •н–ҲлӢӨ(das Sein der Kirche, d. h. aber Jesus Christus). к·ёлҰ¬кі к·ёкІғмқ„ вҖңмқҖнҳңлЎңмҡҙ н•ҳлӮҳлӢҳмқҙ мқёк°„м—җкІҢ кі„мӢңн•ҳлҠ” к·ёлҰ¬кі нҷ”н•ҙн•ҳкё° мң„н•ҙм„ң мҳӨлҠ” кІғ нҳ№мқҖ м—°м„Ө(Gott in seiner gnadigen offenbarenden und versohnenden Zuwendung zum Menschen)вҖқлЎң к·ңм •н–ҲлӢӨ.
л°”лҘҙнҠёлҠ” вҖҳм„Өкөҗ, кё°лҸ…көҗм Ғмқё л§җ(die christliche Rede)мқҙ мҳҲмҲҳ к·ёлҰ¬мҠӨлҸ„лЎңл¶Җн„° мҳӨлҠ”к°Җ? нҳ№мқҖ мҳҲмҲҳ к·ёлҰ¬мҠӨлҸ„к»ҳлЎң мқёлҸ„н•ҳлҠ”к°Җ?вҖҷлқјлҠ” мҳҲлҰ¬н•ң м§Ҳл¬ёмқ„ н–ҲлӢӨ. л°”лҘҙнҠёмқҳ м§Ҳл¬ёмқҙ л„Ҳл¬ҙлӮҳ лӘ…лЈҢн•ҳлӢӨ. к·ёлҹ¬лӮҳ к·ё м§Ҳл¬ём—җ лҢҖлӢөн• мҲҳ мһҲлҠ” мӢ н•ҷмһҗлҠ” м—ҶлӢӨ. лҢҖлӢөн• мҲҳ м—ҶлҠ” м§Ҳл¬ёмқ„ л§Ңл“ңлҠ” кё°мҲ мқҙ нғҒмӣ”н•ҳлӢӨ. лҢҖлӢөн• мҲҳ м—ҶлҠ” м§Ҳл¬ём—җ м„ұмӢӨн•ҳкІҢ лӢөн•ҳлҠ” кІғмқҖ мҳӨнһҲл Ө л¬ём ңк°Җ нҒ¬лӢӨ. н”„лһҖмӢңмҠӨ мүҗнҚј(Francis A. Schaeffer, 1912-1984)лҠ” м •м§Ғн•ң м§Ҳл¬ём—җ м •м§Ғн•ҳкІҢ лӢөліҖ(Honest Questions, Honest Answers)н•ҙм•ј н•ңлӢӨкі н–ҲлӢӨ. мҰү м •м§Ғн•ҳм§Җ лӘ»н•ң м§Ҳл¬ём—җ м •м§Ғн•ҳкІҢ лӢөліҖн•ҳлҠ” кІғмқҖ м–ҙлҰ¬м„қмқҖ кІғмқҙлӢӨ. л°”лҘҙнҠёмқҳ м§Ҳл¬ёмқҖ л„Ҳл¬ҙлӮҳ м •м§Ғн•ҳм§Җл§Ң, л„Ҳл¬ҙлӮҳ м–ҙл‘ЎлӢӨ. лҲ„кө¬лҸ„ лӢөліҖн• мҲҳ м—Ҷкё° л•Ңл¬ёмқҙлӢӨ. л°”лҘҙнҠёлҠ” н•ЁмҲҳм—җм„ң мӮ¬мң л…јмқҳлҘј мӢңмһ‘н•ңлӢӨ. л°ҳліөн•ҙм„ң л°ҳнӢё л°•мӮ¬(Cornelius Van Til, 1895-1987)мқҳ м „м ңмЈјмқҳлҘј м ңмӢңн•ңлӢӨ. л°ҳнӢё л°•мӮ¬лҠ” н•ҳлӮҳлӢҳмқҳ мЎҙмһ¬м—җм„ң мӢңмһ‘н•ҳм§Җл§Ң, л°”лҘҙнҠёлҠ” мӢ мЎҙмһ¬лҘј л¶Ҳк°Җм§ҖлЎ м ҒмңјлЎң ліҙлҠ” кҙҖм җм—җм„ң 진н–үн•ңлӢӨ(к№Җм„ұмӮј, вҖңн–үлҸҷн•ҳмӢңлҠ” н•ҳлӮҳлӢҳ, мЎҙмһ¬н•ҳмӢңлҠ” н•ҳлӮҳлӢҳ: л°”лҘҙнҠёмҷҖ м№јл№Ҳмқҳ н•ҳлӮҳлӢҳлЎ вҖқ, мҙқмӢ лҢҖн•ҷкөҗ лҢҖн•ҷмӣҗ л°•мӮ¬л…јл¬ё, 2005).
л°”лҘҙнҠёлҠ” 진лҰ¬ л¬јмқҢм—җ лҢҖн•ҙм„ң к·ңм •н•ҳкі , м„ұкІҪмӢ н•ҷ, мӢӨмІңмӢ н•ҷ, көҗмқҳмӢ н•ҷмқ„ к°ңл…җнҷ”н–ҲлӢӨ(GG., 29). м„ұкІҪмӢ н•ҷмқҖ л¬јмқҢм—җ лҢҖн•ң м •мҙҲм—җ лҢҖн•ң л¬јмқҢмқҙкі , мӢӨмІңмӢ н•ҷмқҖ к·ё лӘ©н‘ңм—җ лҢҖн•ң л¬јмқҢмқҙкі , көҗмқҳмӢ н•ҷмқҖ көҗнҡҢм—җ кі мң н•ң л§җм—җ лӮҙмҡ©м—җ лҢҖн•ң л¬јмқҢмқҙлӢӨ(GG., 29). л°”лҘҙнҠёлҠ” көҗмқҳмӢ н•ҷ 분야м—җм„ң кіјкұ° көҗнҡҢм—җ мһҲм—ҲлҚҳ кі мң н•ң л§җм—җ лҢҖн•ң л¬јмқҢмқ„ н•ҙмҶҢмӢңмј°лӢӨ. м°ёкі лЎң л°”лҘҙнҠёлҠ” көҗнҡҢмӮ¬лҠ” көҗмқҳн•ҷм Ғ мӢӨмІң мӢ н•ҷмқҳ ліҙмЎ° н•ҷл¬ёмңјлЎң к·ңм •н–ҲлӢӨ(GG., 29).
л°”лҘҙнҠёлҠ” көҗнҡҢк°Җ м„ұкІҪмӢ н•ҷм Ғ, мӢӨмІңмӢ н•ҷм Ғ, көҗмқҳмӢ н•ҷм Ғмқҳ мӮјмӨ‘м Ғ мқҳлҜёлҘј к°–кі м§„лҰ¬л¬ём ңлҘј мһҗмІҙ кІҖнҶ н•ҳлҠ” н•ҷл¬ём Ғ м„ұкІ©мңјлЎң к·ңм •н•ңлӢӨ(GG., 29). мқҙ м§Ҳл¬ём—җлҠ” кіјкұ°мҷҖ лҜёлһҳ к·ёлҰ¬кі нҳ„мһ¬к°Җ нҸ¬н•Ёлҗҳм–ҙ мһҲлӢӨ. 1м„ёкё° мӢӯмһҗк°Җм—җм„ң лҜёлһҳлҠ” лӢ№мӢң 20м„ёкё°мқҙлӢӨ. лҳҗ 20м„ёкё° нҳ„мһ¬м—җм„ң 1м„ёкё° кіјкұ°мҷҖ 21м„ёкё° лҜёлһҳлҘј л°”лқјліҙм•„м•ј н•ңлӢӨ. л°”лҘҙнҠёлҠ” мқҙ кҙҖкі„м—җм„ң м„ё м§Ҳл¬ё(м§Ҳл¬ёмқҳ м •мҙҲ, лӘ©н‘ң к·ёлҰ¬кі кі мң н•ң л°ңнҷ”м—җ лҢҖн•ң лӮҙмҡ©)мқҙ көҗнҡҢ, мӢ н•ҷ, н•ҷл¬ёмқҙ лҗңлӢӨлҠ” кІғмқҙлӢӨ.
мҡ°лҰ¬лҠ” көҗнҡҢлҠ” ліөмқҢмқҳ кё°кҙҖмңјлЎң, мЈј н•ҳлӮҳлӢҳмқҳ н”јлЎң мӮ¬мӢ кұ°лЈ©н•ң кё°кҙҖ(н–ү 20:28)мңјлЎң к·ңм •н–ҲлӢӨ. л°”лҘҙнҠёлҠ” көҗнҡҢлҘј мӢ н•ҷмқҙ л°ңмғқн•ҳлҸ„лЎқ н•ҳлҠ” м–ём–ҙ мӮ¬кұҙмқҙ мһҲлҠ” кіөк°„мңјлЎң к·ңм •н•ң кІғмқҙлӢӨ. вҖҳк·ё м–ём–ҙк°Җ м–ҙл–»кІҢ н•ҳлӮҳлӢҳмқҳ л§җм”Җмқҙ лҗҳлҠ”к°Җ?вҖҷм—җ лҢҖн•ң мһҗкё°к°Җ мІҙкі„нҷ”мӢңнӮЁ л©”м»ӨлӢҲмҰҳмқ„ л°қнһҲлҠ” кІғмқҙлӢӨ. к·ёлҹ°лҚ° л°”лҘҙнҠёлҠ” мһҗкё° л§Өм»ӨлӢҲмҰҳмқ„ л°қнһҲкё° мң„н•ҙм„ң, кіјкұ° көҗнҡҢм—җм„ң кІ°м •н•ң көҗлҰ¬м—җ лҢҖн•ҙм„ң мқҳмӢ¬н•ҳкі л¶Җм •н•ҳлҠ” мһҗм„ём—җм„ң л§Өм»ӨлӢҲмҰҳмқ„ кө¬м¶•н–ҲлӢӨлҠ” кІғмқҙ мӢ¬к°Ғн•ң л¬ём ңмқҙлӢӨ. к·ёкІғмқҖ 1м„ёкё°м—җ м „н–ҲлҚҳ, 16м„ёкё° мў…көҗк°ңнҳҒм—җм„ң м „н–ҲлҚҳ ліөмқҢмқҳ лӮҙмҡ©мқҙ к°ҷм§Җ м•Ҡмңјл©°, лҳҗн•ң 20м„ёкё°м—җм„ңлҸ„ ліөмқҢмқҳ лӮҙмҡ©мқҖ ліҖнҷҳлҗҳм–ҙм•ј н•ңлӢӨлҠ” кІғмқ„ л°қнһҲкі мһҲлҠ” кІғмқҙлӢӨ.
л°”лҘҙнҠёлҠ” 진лҰ¬ л¬јмқҢм—җ лӢөліҖн•ҳлҠ” кІғмқ„ мӢ н•ҷмңјлЎң к·ңм •н•ҳкі мһҲмңјл©°, мқҙ мӢ н•ҷмқ„ 진н–үн• л•Ңм—җлҠ” н•ҷл¬ё(кіјн•ҷ, Wissenschaft)мңјлЎң мҲҳн–үн•ҙм•ј н•ңлӢӨлҠ” кІғмқҙлӢӨ. л°”лҘҙнҠёлҠ” вҖңмӢ н•ҷмқҳ нҠ№мҲҳм„ұ(Besonderheit)вҖқмқ„ м ңмӢңн•ҳл©ҙм„ң, нҠ№мҲҳн•ң мӢ н•ҷмқҳ м ҲлҢҖм„ұмқ„ нҡҢн”јн–ҲлӢӨ. л°”лҘҙнҠёлҠ” 진лҰ¬м—җ лҢҖн•ң л¬јмқҢм—җм„ң 추мғҒм Ғмқё лӢөліҖмқҙ м•„лӢҢ мӢӨмІңм Ғмқё л…јмҰқмқ„ м ңм–ён–ҲлӢӨ(GG., 29). л°”лҘҙнҠёмқҳ м ңм–ёмқҖ н•ӯмғҒ мҳілӢӨлҠ” кІғмқҙ л¬ём ңмқҙлӢӨ. мўҢнҢҢмҷҖ мҡ°нҢҢмқҳ л…јмҹҒм—җм„ң мўҢнҢҢм—җкІҢ мҡ°нҢҢк°Җ м§Ҳ мҲҳл°–м—җ м—ҶлҠ” кІғмқҖ мўҢнҢҢлҠ” нӢҖлҰ° л§җмқ„ н•ҳм§Җ м•Ҡкё° л•Ңл¬ёмқҙлӢӨ. к·ёлҹ¬лӮҳ н•ң л§җмқҖ мӢӨнҳ„мқҙ л¶Ҳк°ҖлҠҘн•ң лҜём§Җмқҳ мҳҒм—ӯм—җ мһҲлӢӨлҠ” кІғмқҙ мӢӨмһ¬мқҙлӢӨ. к·ёлҹ¬лӮҳ к·ё мӢӨнҳ„ л¶Ҳк°ҖлҠҘн•ң к°Җм№ҳк°Җ лҜёлһҳм—җ м„ұм·Ёлҗ кІғмқҙлқјкі нқ¬л§қмқ„ мЈјлҠ” кІғмқҙ мўҢнҢҢм Ғ кҙҖл…җмқҳ нҠ№м§•мқҙлӢӨ. л°”лҘҙнҠёмқҳ м ңм–ёмқҖ л„Ҳл¬ҙлӮҳ мҳікё° л•Ңл¬ём—җ л°ҳл°•мқҙ л¶Ҳк°ҖлҠҘн• м •лҸ„мқҙлӢӨ. к·ёлҹ¬лӮҳ м„ёмғҒмқјмқҙ л§җмІҳлҹј мқҙмғҒмІҳлҹј лҗҳм§Җ м•ҠлҠ”лӢӨ. к·ёлҹ°лҚ° мӢ н•ҷмқҖ мҳҒм Ғ мҳҒм—ӯмқҙлӢӨ. мҳҒм Ғ мҳҒм—ӯмқҙ мқёк°„мқҳ н•©лҰ¬м„ұм—җ к·јкұ°н•ңлӢӨл©ҙ мҳҒм Ғмқё кІғмқҖ мҳҒмқҙ м•„лӢҲлқј м„ёмҶҚмқҙ лҗ кІғмқҙлӢӨ. м„ёмғҒмқј, кІҪм ңм—җм„ңлҸ„ мҳҲмёЎн• мҲҳ м—Ҷм–ҙ вҖңліҙмқҙм§Җ м•ҠлҠ” мҶҗ(invisible hand)вҖқмқ„ л§җн–ҲлӢӨ.
л°”лҘҙнҠёлҠ” мӢ н•ҷм—җ мһҲлӢӨкі мЈјмһҘн•ҳлҠ” нҠ№мҲҳм„ұмқ„ м ңмҷёмӢңмј°лӢӨ(GG., 30). л°”лҘҙнҠёлҠ” л ҳ 31:34мқҙ м„ұм·Ёлҗҳм—ҲмңјлҜҖлЎң(34м Ҳ. л„ҲлҠ” м—¬нҳёмҷҖлҘј м•Ңлқј н•ҳм§Җ м•„лӢҲн•ҳлҰ¬лӢҲ мқҙлҠ” мһ‘мқҖ мһҗлЎңл¶Җн„° нҒ° мһҗк№Ңм§Җ лӢӨ лӮҳлҘј м•Ңкё° л•Ңл¬ёмқҙлқј лӮҙк°Җ к·ёл“Өмқҳ м•…н–үмқ„ мӮ¬н•ҳкі лӢӨмӢңлҠ” к·ё мЈ„лҘј кё°м–өн•ҳм§Җ м•„лӢҲн•ҳлҰ¬лқј м—¬нҳёмҷҖмқҳ л§җм”ҖмқҙлӢҲлқј), мІ н•ҷмқҙлӮҳ м„ёмҶҚм Ғ н•ҷл¬ёмқҙ м„ёмҶҚм Ғмқҙкұ°лӮҳ мқҙкөҗм Ғмқҙм§Җ м•ҠлҠ”лӢӨкі м ңм–ён–ҲлӢӨ. к·ёлһҳм„ң л°”лҘҙнҠёлҠ” мӢ н•ҷмқҙ кё°лҸ…көҗм Ғ мІ н•ҷ(philosophia christiana)мқҙ лҗ мҲҳ мһҲлӢӨкі нҷ•м •н–ҲлӢӨ.
л°”лҘҙнҠёлҠ” м°ёлҗң мІ н•ҷмһҗлҠ” вҖңн•ҳлӮҳлӢҳмқ„ мӮ¬лһ‘н•ҳлҠ” мһҗвҖқ (verus philosophus est amor Dei)лқјкі н•ҳлҠ” м–ҙкұ°мҠӨнӢҙмқҳ м ңм–ёмқ„ мқёмҡ©н•ҙм„ң, м°ёлҗң мӢ н•ҷмһҗлҸ„ вҖңн•ҳлӮҳлӢҳмқ„ мӮ¬лһ‘н•ҳлҠ” мһҗвҖқмқҙл©°, мҳҒм Ғмқё нҶөм°°кіј м„ёмҶҚмқҳ мӢӨмІңм—җ лҢҖн•ҙм„ң м ңмӢңн•ҳкё° л•Ңл¬ём—җ көҗм°Ём ҒмңјлЎң мӮ¬мҡ©н• мҲҳ мһҲлӢӨлҠ” лҠ¬м•ҷмҠӨлҘј м ңкіөн•ңлӢӨ.
л°”лҘҙнҠёлҠ” көҗмқҳн•ҷмқ„ мӢӨмІңмӢ н•ҷмқҳ 분야м—җ нҸ¬н•ЁмӢңнӮӨлҠ”лҚ°, мқҙкІғмқҖ мҠҗлқјмқҙм–ҙл§Ҳн—Ҳмқҳ мҳҒн–Ҙмқ„ л°ҳмҳҒн•ҳлҠ” кІғмқҙлӢӨ. мӢ н•ҷмқҖ мӢӨмІңм Ғ нӣҲл ЁмқҙлӮҳ м§Җн–Ҙм„ұ мқҙм „м—җ, к°•лӢЁм—җм„ң м„ нҸ¬н• ліөмқҢмқ„ мң„н•ң кё°мҙҲ, мҲҷл Ёлҗң м§ҖмӢқмқҙкі нӣҲл ЁмқҙлӢӨ. м„ нҸ¬лҗң ліөмқҢмқҙ мһҲм–ҙм•ј көҗнҡҢлҠ” көҗнҡҢк°Җ лҗңлӢӨ. м„ нҸ¬лҗң ліөмқҢмқ„ мһҳ 분м„қн•ҙм„ң көҗнҡҢк°Җ лҗҳлҠ” кІғмқҙ м•„лӢҲлӢӨ. м„ нҸ¬лҗҳлҠ” ліөмқҢмқҳ нҠ№мҲҳм„ұкіј м ҲлҢҖм„ұмқ„ л°ҳл“ңмӢң кі л Өн•ҙм•ј н•©лӢ№н•ң мӢ н•ҷмқҙ лҗңлӢӨ. к·ёлҹ°лҚ° л°”лҘҙнҠёлҠ” к·ё нҠ№мҲҳм„ұмқ„ м ңкұ°н–ҲлӢӨ. к·ёлҰ¬кі мӢӨмІңмқ„ к°•мЎ°н•ңлӢӨ. мӢӨмІңмқҙ мӨ‘мҡ”н•ҳм§Җл§Ң м„ нҸ¬лҗң ліөмқҢмқҙ м—ҶлҠ” мӢӨмІңмқҖ мҡёлҰ¬лҠ” кҪ№кіјлҰ¬мҷҖ к°ҷлӢӨ(кі м „ 13:1).
|
кёҖм“ҙмқҙ н”„лЎңн•„ кёҖм“ҙмқҙ : кі кІҪнғң лӘ©мӮ¬ (мЈјлӢҳмқҳкөҗнҡҢ / нҳ•лһҢм„ңмӣҗ) мқҙл©”мқј : |
 л°”лҘҙнҠё: көҗнҡҢ, мӢ н•ҷ м—ҶлҠ” н•ҳлӮҳлӢҳм—җ лҢҖн•ң л§җн•Ё л°”лҘҙнҠё: көҗнҡҢ, мӢ н•ҷ м—ҶлҠ” н•ҳлӮҳлӢҳм—җ лҢҖн•ң л§җн•Ё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