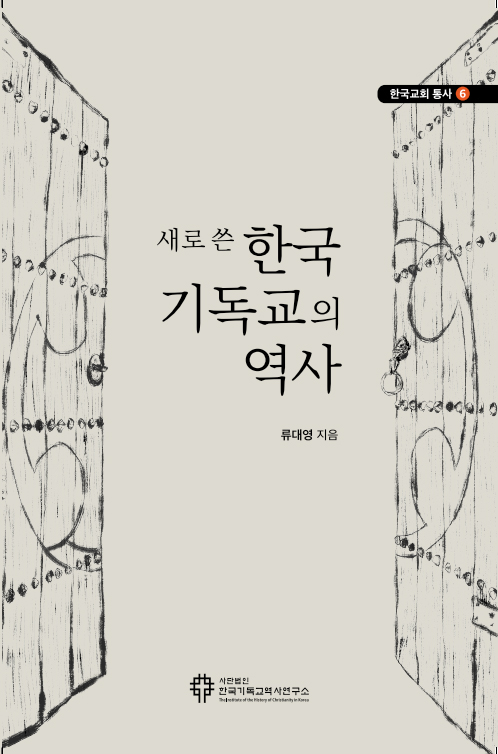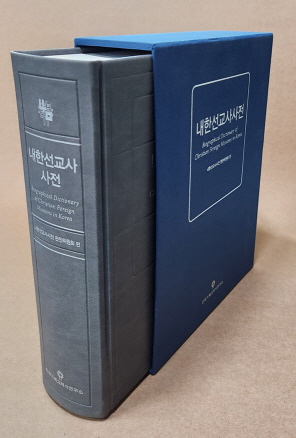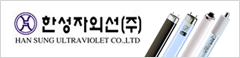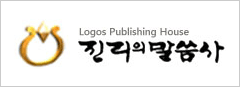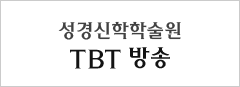мҳҲмҲңмқјкіұ: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қҳ лҜёмӮ¬мҷҖ мқҢм•…,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мң мӮ°
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 лҜёмӮ¬лҠ” кё°лҸ…көҗ кі мң мқҳ мҳҲл°° нҳ•мӢқмқҙ м•„лӢҲлӢӨ. мқҙлҠ”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кіөм ҒВ·мў…көҗм Ғ мқҳмӢқкіј м „лЎҖ м „нҶөмқҳ нҳјн•©л¬јмқҙлӢӨ. к°ҖнҶЁлҰӯ лҜёмӮ¬лҠ” нҠ№нһҲ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к¶Ңмң„, мқҳлЎҖ нҳ•мӢқ, кіөм Ғ м ңмӮ¬ мІҙкі„мҷҖ к№ҠмқҖ м—°кҙҖмқҙ мһҲлӢӨ.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мқҳлЎҖ кө¬мЎ°м—җм„ң кіөм Ғ м ңмӮ¬лҠ” нҷ©м ң мҲӯл°°мҷҖ лӢӨм–‘н•ң мӢ л“Өм—җкІҢ м ңмӮ¬(Sacrificium)лҘј л“ңлҰ¬лҠ” н•„мҲҳ н–үмң„мҳҖлӢӨ. л°ҳл“ңмӢң мӮ¬м ң(collegium pontificum)к°Җ м§‘м „н•ҙм•ј н•ҳл©° м •н•ҙ진 мқҳмӢқ м Ҳм°Ём—җ л”°лқј нҠ№м • мһҘмҶҢ(нҸ¬лЈё, мӢ м „)м—җм„ң кұ°н–үн–ҲлӢӨ. м ңл¬ј лҙүн—ҢмқҖ н•„мҲҳ мҡ”мҶҢмҳҖмңјл©° м •н•ҙ진 кё°лҸ„мҷҖ м°¬к°Җ к·ёлҰ¬кі н–үл ¬ л“ұ мқҳмӢқ м Ҳм°Ёмқҳ нҳ•мӢқм„ұкіј м—„мҲҷн•Ёмқ„ к°•мЎ°н–ҲлӢӨ.
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мқҳмӢқ м§‘м „мһҗ м ңмӮ¬мһҘ(pontifex)мқҖ к°ҖнҶЁлҰӯм—җм„ң лҜёмӮ¬лҘј м§‘м „н•ҳлҠ” мӮ¬м ң(Priest)лЎң лҢҖмІҙлҗҳм—ҲлӢӨ. (лЎңл§Ҳ көҗнҷ©мқ„ м№ӯн•ҳлҠ” мҡ©м–ҙ мӨ‘ вҖҳPontifex MaximusвҖҷк°Җ мһҲмңјл©° мқҙлҠ” вҖҳкөҗнҡҢмқҳ мөңкі мӮ¬м ңвҖҷлқјлҠ” лң»мқҙлӢӨ.) м ңл¬ј лҙүн—ҢмқҖ м„ұм°¬мқҳ л№өкіј нҸ¬лҸ„мЈј лҙүн—ҢмңјлЎң, кіөмӢқ кё°лҸ„мҷҖ м°¬к°ҖлҠ” лҜёмӮ¬ нҶөмғҒл¬ё(Gloria, Sanctus л“ұ)мңјлЎң, м ңкөӯмқҳ м—„кІ©н•ң мқҳмӢқ кө¬мЎ°лҠ” лҜёмӮ¬ м „лЎҖмқҳ м •нҳ•нҷ”лҗң мҲңм„ң(мһ…лӢ№вҶ’м„ӨкөҗвҶ’м„ұм°¬ м „лЎҖ л“ұ)лЎң, нҷ©м ңлҘј 비лЎҜн•ң мӢңлҜј н–үл ¬мқҖ лҜёмӮ¬ мӢңмһ‘ мӢң мһ…лӢ№ н–үл ¬мқҙлӮҳ мқҙлҘёл°” м„ұмІҙ н–үл ¬лЎң мһҗлҰ¬ мһЎм•ҳлӢӨ. лӢӨмӢң л§җн•ҙ м„ұкІҪм Ғ к·јкұ°к°Җ кұ°мқҳ м—ҶлҠ”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лӢӨмӢ көҗ мҲӯл°° м Ҳм°Ёл“Өмқҙ л§Ҳм№ҳ кё°лҸ…көҗмқҳ кі мң н•ң мқҳмӢқмІҳлҹј л‘”к°‘н•ң кІғмқҙлӢӨ. мқҙкІғмқҙ мқҙмғҒн•ҳм§Җ м•Ҡм•ҳлҚҳ мқҙмң мӨ‘ кІ°м •м Ғмқё кІғмқҖ 476л…„ м„ң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л©ёл§қ нӣ„ мҲҳл§ҺмқҖ м ңкөӯмқҳ мҷ•мЎұкіј к·ҖмЎұл“Өмқҙ мһҗмӢ л“Өмқҳ к¶Ңл Ҙкіј мһ¬мӮ°мқ„ мң м§Җн•ҳкё° мң„н•ң мҲҳлӢЁмңјлЎң көӯкөҗнҷ”лҗң кё°лҸ…көҗлЎң лӢЁм§Җ к·ёл“Өмқҳ мһҗлҰ¬лҘј мқҙлҸҷн–Ҳкё° л•Ңл¬ёмқҙлӢӨ. мҲӯл°° лҢҖмғҒмқ„ к·ёлҰ¬мҠӨ-лЎңл§Ҳ мһЎмӢ л“Өм—җм„ң н•ҳлӮҳлӢҳ, мҳҲмҲҳ, л§ҲлҰ¬м•„, м„ұмқёмңјлЎң лҢҖмІҙн–Ҳмқ„ лҝҗмқҙлӢӨ.
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лӢӨмӢ лЎ мҲӯл°°к°Җ к°ҖнҶЁлҰӯ лҜёмӮ¬лЎң мқҙн–үн•ҳлҠ” лҚ° кІ°м •м Ғ лҸ„мӣҖмқ„ мӨҖ н•ң мҡ”мҶҢк°Җ мһҲлӢӨ. л°”лЎң лқјнӢҙм–ҙ мӮ¬мҡ©мқҙлӢӨ.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кіөм Ғ мқҳмӢқмқҙлӮҳ лІ•лҘ к·ёлҰ¬кі н–үм •м—җм„ңлҠ” лқјнӢҙм–ҙлҘј мӮ¬мҡ©н–ҲлӢӨ. кё°лҸ…көҗк°Җ көӯкөҗнҷ”н•ҳл©ҙм„ң мқҙ лқјнӢҙм–ҙлҘј көҗнҡҢмқҳ кіөмӢқ м–ём–ҙлЎң мұ„нғқн–Ҳмңјл©° л”°лқјм„ң лҜёмӮ¬м—җм„ң лқјнӢҙм–ҙ мӮ¬мҡ©мқҖ мһҗм—°мҠӨлҹҪкІҢ м •м°©н–ҲлӢӨ. мқҙлҹ° м җм—җм„ң лқјнӢҙм–ҙлҘј нҶөн•ҙ лҜёмӮ¬мқҳ м ңмқҳм Ғ к¶Ңмң„лҘј к·№лҢҖнҷ”н•ҳлҠ” мқҳмӢқмқҖ лӢӨлҰ„ м•„лӢҢ м „ м ңкөӯмқҳ лӘЁл“ мӮ¬лһҢл“Өмқҙ лЎңл§Ҳ нҷ©м ңлҘј мҲӯл°°н–ҲлҚҳ мқҳмӢқмқ„ лӘЁл°©н–ҲлҚҳ кІғмқҙлӢӨ. м—°мҙҲ нҳ№мқҖ к°Ғмў… к°ҖнҶЁлҰӯ н–үмӮ¬м—җм„ң м „ м„ёкі„ мҲҳл§ҺмқҖ к°ҖнҶЁлҰӯ мӢ лҸ„л“Өмқҙ л°”нӢ°м№ё мӢңкөӯ(Città del Vaticano)м—җм„ң көҗнҷ©мқ„ нҷҳнҳён•ҳлҠ” м Җ м „нҶөмқҖ л©ёл§қлӢ№н•ң м„ң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нҷ©м ңмқҳ мҳҒкҙ‘мқ„ мһ¬нҳ„н•ҳл ӨлҠ” кІғмңјлЎң ліҙмқёлӢӨ.
лЎңл§Ҳ нҷ©м ңм—җ лҢҖн•ң мҲӯл°° мқҳмӢқкіј м Ҳм°Ём—җм„ң к°ҖмһҘ мӨ‘мҡ”н•ң лӘ©м ҒмқҖ л°”лЎң мқёк°„мқ„ мӢ мІҳлҹј мҲӯл°°н•ҳл©ҙм„ң нҷ©м ңм—җ лҢҖн•ң 충м„ұмқ„ 맹세н•ҳлҠ” кІғмқҙм—ҲлӢӨ. мқҙлҹ¬н•ң м ңмқҳ м Ҳм°ЁлҠ” к°ҖнҶЁлҰӯ лҜёмӮ¬м—җм„ң мҳҲмҲҳ к·ёлҰ¬мҠӨлҸ„мқҳ лӘёкіј н”јк°Җ мӢӨм ң нҳ„мЎҙн•ңлӢӨкі лҜҝлҠ” мғҒ징мқё м„ұмІҙм„ұмӮ¬(иҒ–й«”иҒ–дәӢ, Eucharist)лЎң лҢҖмІҙлҗңлӢӨ. мқҙлҹ¬н•ң м ңмқҳ м Ҳм°Ём—җм„ң м„ұмІҙм„ұмӮ¬мқҳ м •нҶөм„ұмқ„ ліҙмһҘн•ҳлҠ” мқёл¬јмқҙ л°”лЎң көҗнҷ©мқҙл©° көҗнҡҢ мқјм№ҳмқҳ к°ҖмӢңм Ғ н‘ңнҳ„мқҙ л°”лЎң көҗнҷ©мқҳ к¶Ңмң„лӢӨ. мқҙмІҳлҹј нҷ©м ң мҲӯл°°м—җ мӮ¬мҡ©н–ҲлҚҳ м„ң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лӘЁл“ мқҳлЎҖм Ғ к¶Ңмң„лҠ” көҗнҷ© мӨ‘мӢ¬мқҳ к°ҖнҶЁлҰӯкөҗнҡҢмқҳ мқҳлЎҖм Ғ к¶Ңмң„лЎң м „мқҙлҗңлӢӨ. нҢЁл§қн•ң м„ң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мҷ•мЎұл“Өкіј к·ҖмЎұл“ӨмқҖ көӯкөҗнҷ”н•ң кё°лҸ…көҗ мІҙм ңк°Җ м „нҳҖ лӮҜм„Өм§Җ м•Ҡм•ҳмқ„ лҝҗ м•„лӢҲлқј м ңкөӯмқҳ мҳҒкҙ‘кіј л¶ҖмҷҖ к¶Ңл Ҙмқ„ кё°лҸ…көҗлҘј нҶөн•ҙ мҳӨнһҲл Ө лҚ” нҷ•кі нһҲ н•ҳл©ҙм„ң вҖҳмҳҒмӣҗн•ң лЎңл§ҲвҖҷмқҳ мҳҒкҙ‘мқҙ лӢӨмӢң мһ¬нҳ„лҗҳкі мҳҒмҶҚн• кІғмқҙлқјлҠ” нҷ•мӢ мқ„ к°–лҠ”лӢӨ. м ңкөӯмқ„ мһғмқҖ лЎңл§Ҳ мҷ•мЎұл“Өкіј к·ҖмЎұл“Өм—җкІҢ кё°лҸ…көҗмқҳ көӯкөҗнҷ”лҠ” мўӢм•„лҸ„ л„Ҳл¬ҙ мўӢмқҖ м„ л¬јмқҙм—ҲлӢӨ.
к·ёлҰ¬кі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кіөкіө нҡҢн•© мһҘмҶҢмҳҖлҚҳ л°”мӢӨлҰ¬м№ҙ(Basilica)мқҳ к¶Ңмң„лҠ” кё°лҸ…көҗк°Җ көӯкөҗнҷ”н•ҳл©ҙм„ң мҳҲл°°лӢ№(көҗнҡҢ кұҙ축)мңјлЎң м „нҷҳн•ҳлҠ”лҚ°, лҜёмӮ¬ м „лЎҖмқҳ кіөк°„ кө¬мЎ°(мӨ‘м•ҷ нҶөлЎң, м ңлӢЁ, мўҢмҡ°мёЎ м„ұк°ҖлҢҖм„қ л“ұ)мқҳ мӣҗмІңмқҖ лЎңл§Ҳ кіөкіө кұҙ축 м–‘мӢқм—җм„ң л°ңм „н•ң кІғмқҙлӢӨ. м ңкөӯмқҳ лІ•м ҒВ·кіөм Ғ м„ұкІ©мқҳ мқҳлЎҖ м Ҳм°Ёл“ӨмқҖ ліёлһҳ мӢ м„ұн•ң к¶Ңмң„лҘј н‘ңл°©н–Ҳкё° л•Ңл¬ём—җ к°ҖнҶЁлҰӯ лҜёмӮ¬лҘј к°ңмқё мҳҲл°°к°Җ м•„лӢҢ кіөм ҒВ·кіөлҸҷмІҙм Ғ н–үмң„(Liturgia)лЎң м „нҷҳн•ҳлҠ” кІғмқҖ мһҗм—°мҠӨлҹ¬мҡҙ кІ°кіјлЎң мқҙм–ҙмЎҢлӢӨ. мқҙмІҳлҹј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лІ•, мқҳлЎҖ, көӯк°Җмқҳ нҶөмқјм„ұмқҖ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қҳ мІҙм ң нҷ•лҰҪмқ„ мң„н•ң м ңлҸ„мҷҖ м „лЎҖмқҳ к·ңлІ”нҷ”м—җ м§Ғм ‘м Ғмқё мҳҒн–Ҙмқ„ лҜём№ңлӢӨ. м ңкөӯмқҳ мң мӮ°мқҖ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 мӢ лҸ„л“Өмқҳ мқјмғҒ мӢңк°„ кө¬мЎ°м—җлҸ„ л°ҳмҳҒлҗҳм—ҲлӢӨ. м ңкөӯмқҳ кіөм Ғ 축мқјмқ„ кё°лҸ…көҗ м Ҳкё° мІҙкі„(л¶Җнҷңм Ҳ, м„ұнғ„м Ҳ л“ұ)лЎң мңөн•©н•ңлӢӨ. лЎңл§Ҳмқҳ м¶ҳ분, лҶҚкІҪм ң, нҷ©м ң 축мқј л“ұмқҖ көҗнҡҢ м Ҳкё°м—җм„ң ліҖмҡ©лҗң нҳ•нғңлЎң нқ”м Ғмқ„ лӮЁкёҙлӢӨ.
к·ёлҝҗ м•„лӢҲлқј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мў…көҗмқҳмӢқм—җм„ң мӮ¬мҡ©н–ҲлҚҳ м°¬к°Җ(Laudes, Hymni)мқҳ м „нҶөмқҖ лҜёмӮ¬мқҳ м°¬лҜёк°Җмқё к·ёл Ҳкі лҰ¬мҳӨ м„ұк°ҖлЎң л°ңм „н•ҳлҠ” лҚ° кІ°м •м Ғ мҡ”мқёмқҙ лҗҳм—ҲлӢӨ. нҠ№нһҲ нҷ©м ңлҘј 비лЎҜн•ң мӢңлҜј н–үл ¬м—җм„ң л¶ҖлҘҙлҠ” м°¬к°ҖмҷҖ кіөм Ғ мқҳлЎҖмқҳ н•©м°Ҫ кө¬мЎ°лҠ” к·ёл Ҳкі лҰ¬м•Ҳ м„ұк°Җ л°ңм „кіј м •м°©мқҳ кё°мӣҗмқҙ лҗңлӢӨ. н•ҳлӮҳмқҳ м„ мңЁ(л©ңлЎңл””)л§ҢмңјлЎң мқҙлЈЁм–ҙ진 мқҢм•… мҰү н•ҳлӮҳмқҳ мқҢлҶ’мқҙ(line)л§ҢмңјлЎң л¶ҖлҘҙлҠ” лӢЁм„ұ(лӘЁл…ёнҸ¬лӢҲ) м „лЎҖ м„ұк°Җмқё к·ёл Ҳкі лҰ¬м•Ҳ м„ұк°Җ(Gregorian Chant)лҠ” мЈјлЎң лқјнӢҙм–ҙлЎң л¶Ҳл ёмңјл©° мқҙлҠ” 6~8м„ёкё°кІҪ м—¬лҹ¬ м „нҶөл“Өмқҳ мңөн•©мқҙлӢӨ. к·ңм№ҷм Ғ л°•мһҗліҙлӢӨлҠ” л§җмқҳ мҡҙмңЁмқ„ к°•мЎ°н–ҲлҚҳ лЎңл§Ҳ мқҢм•…мқҖ к·ёлҰ¬мҠӨ м „нҶөмқ„ л”°лқј мһҗм—°мҠӨлҹ¬мҡҙ м–ём–ҙ мҡҙмңЁмқ„ мӨ‘мӢңн–ҲлӢӨ. мқҙлҹ¬н•ң м „нҶөмқҙ к·ёл Ҳкі лҰ¬м•Ҳ м„ұк°Җк°Җ л§җмқҳ м–өм–‘кіј мҡҙмңЁм—җ л”°лҘё м„ мңЁмқ„ кө¬м„ұн•ҳлҠ” лҚ° мҳҒн–Ҙмқ„ лҜём№ҳл©ҙм„ң лӢЁмҲңн•ң лӢЁм„ мңЁ мӨ‘мӢ¬кіј л¬ҙл°ҳмЈј м„ұк°ҖлЎң м •нҳ•нҷ”н•ңлӢӨ. к·ёлҰ¬мҠӨ мқҢм•… мқҙлЎ мқ„ кі„мҠ№н•ң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к·ёлҰ¬мҠӨмқҳ м„ лІ•(ж—Ӣжі•, лӘЁл“ң) мІҙкі„к°Җ к·ёл Ҳкі лҰ¬м•Ҳ м„ұк°Җм—җм„ңлҠ” 8к°ңмқҳ көҗнҡҢ м„ лІ•мңјлЎң м •м°©н•ңлӢӨ. мқҙмІҳлҹј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мў…көҗ мқҳлЎҖ н–үмӮ¬м—җм„ң мқҢм•…мқ„ мӮ¬мҡ©н•ң м „нҶө(көӯк°Җ м ңмӮ¬, нҷ©м ң мҲӯл°° мқҳмӢқ л“ұ)мқҖ кё°лҸ…көҗк°Җ көӯкөҗнҷ”лҗң мқҙнӣ„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 мқҳлЎҖм—җ мһҗм—°мҠӨлҹҪкІҢ мқҙмӢқлҗңлӢӨ. к·ёл Ҳкі лҰ¬м•Ҳ м„ұк°ҖлҠ” лӢЁмҲңнһҲ мў…көҗм Ғ мӮ°л¬јл§Ңмқҙ м•„лӢҲлқј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л¬ёнҷ”м ҒВ·н–үм •м ҒВ·мқҢм•…м Ғ м „нҶө мң„м—җ м„ёмӣҢ진 нҳјн•©л¬јмқҙлӢӨ.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нҶөмқјм„ұкіј лқјнӢҙ л¬ёнҷ”, к·ёлҰ¬кі кі лҢҖ мқҳлЎҖмҷҖ мқҢм•…мқҳ нҳ•мӢқмқҙ лӘЁл‘җ л…№м•„л“Өм–ҙ м„ңмң лҹҪ мӨ‘м„ё к°ҖнҶЁлҰӯкөҗнҡҢлҘј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кі„мҠ№мһҗлЎң л§Ңл“Өм–ҙ мЈјм—ҲлӢӨ.
<272нҳём—җм„ң кі„мҶҚ>
 м—ӯмӮ¬ м„ңмҲ мқҳ лҸҷл Ҙ, мҳҲмҲ м Ғ 충лҸҷ
м—ӯмӮ¬ м„ңмҲ мқҳ лҸҷл Ҙ, мҳҲмҲ м Ғ 충лҸҷ м—ӯмӮ¬ м„ңмҲ мқҳ лҸҷл Ҙ, мҳҲмҲ м Ғ 충лҸҷ
м—ӯмӮ¬ м„ңмҲ мқҳ лҸҷл Ҙ, мҳҲмҲ м Ғ 충лҸҷ