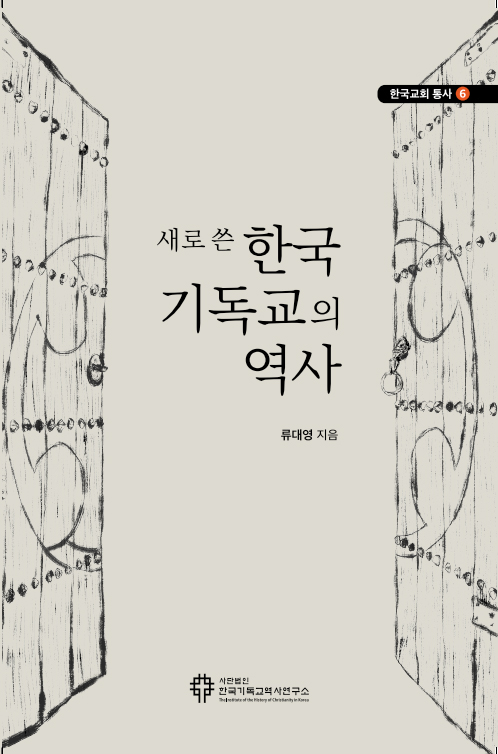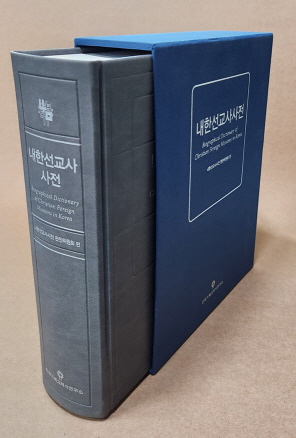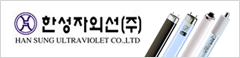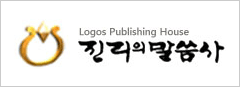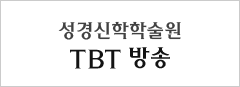мӢ н•ҷ
нғҗкө¬лЎңм„ңмқҳ көҗмқҳн•ҷ(1) мқёмӢқмқҳ к°ҖлҠҘм„ұмқ„ м„ёмӣҖ
мҡ°лҰ¬лҠ” м•һм—җм„ң көҗмқҳн•ҷ(Dogmatik)кіј көҗмқҳ(Dogma)м—җ лҢҖн•ң к°ңл…җмқ„ нҷ•лҰҪн•ҳлҠ” кіјм •мқ„ кұ°міӨлӢӨ. көҗмқҳ(Dogma)лҠ” вҖңкөҗмқҳн•ҷм Ғ кІҖнҶ лЎң нҷ•лҰҪлҗң мҳ¬л°”лҘё лӮҙмҡ©(Rechten Inhalt)вҖқмқҙлӢӨ. көҗмқҳн•ҷмқҖ вҖңн•ҳлӮҳлӢҳм—җ кҙҖн•ң көҗнҡҢмқҳ 진мҲ лӮҙмҡ©м—җ лҢҖн•ң к·ёлҰ¬мҠӨлҸ„көҗ көҗнҡҢмқҳ мһҗкё° кІҖмҰқмқҙлӢӨ(Dogmatik ist die Selbstprufung der christlichen Kirche hinsichtlich des Inhalts der ihr eigentumlichen Rede von Gott, GG., 37).вҖқ л°”лҘҙнҠёлҠ” көҗмқҳн•ҷм—җ лҢҖн•ң лҚ” кө¬мІҙм Ғмқё к°ңл…җмқҖ В§ 7м—җм„ң м„ӨлӘ…н• кІғмқҙлқјкі н–ҲлӢӨ. мҡ°лҰ¬лҸ„ л°”лҘҙнҠёлҘј л”°лқјм„ң В§ 7м—җм„ң көҗмқҳн•ҷм—җ лҢҖн•ң кө¬мІҙм Ғмқё 진мҲ мқ„ нғҗкө¬н• кІғмқҙлӢӨ.
мқёк°„мқҖ мқёмӢқ(Erkenntnis)мқ„ н•ҳлҠ” мЎҙмһ¬мқёлҚ°, мқёмӢқмқҖ нғҗкө¬лҘј нҶөн•ҙм„ң нҡҚл“қлҗң к°Җм№ҳмқҙлӢӨ. нғҗкө¬(Forschung)лҠ” лҢҖмғҒ(Gegenstand)мқҙ мһҲм–ҙм•ј н•ңлӢӨ. л°”лҘҙнҠёлҠ” көҗмқҳн•ҷмқҙ нғҗкө¬н•ҳлҠ” лҢҖмғҒм—җ лҢҖн•ҙм„ң лӘ…нҷ•н•ҳкІҢ м ңмӢңн•ңлӢӨ. мӢ н•ҷлҸ„лҠ” лҢҖмғҒм—җ лҢҖн•ҙм„ң лӘ…нҷ•н•ҳкІҢ мқёмӢқн•ҙм•ј н•ңлӢӨ. л°”лҘҙнҠёлҠ” нғҗкө¬к°Җ к°ҖлҠҘн•ң лҢҖмғҒмқ„ лӘ…нҷ•н•ҳкІҢ м ңмӢңн–ҲлӢӨ. мҰү нғҗкө¬лҗ мҲҳ м—ҶлҠ” лҢҖмғҒмқ„ м„Өм •н•ҳлҠ” кІғмқ„ кұ°л¶Җн–ҲлӢӨ. н•ҷл¬ёмқҙлқјлҠ” кІғмқҖ н•©лӢ№н•ң нғҗкө¬ лҢҖмғҒмқҙ мһҲм–ҙм•ј н•ңлӢӨ. л°”лҘҙнҠёлҠ” к·ё нғҗкө¬ лҢҖмғҒмқ„ м „м ң(setzt voraus, presupposes)лЎң м ңм•Ҳн–ҲлӢӨ.
1. Dogmatik als Forschung setzt voraus, daГҹ der rechte Inhalt christlicher Rede von Gott vom Menschen erkannt werden kann(KD., 10). can be known by men(мқёк°„м—җ мқҳн•ҙ лҗ мҲҳ мһҲлӢӨ).
2. Dogmatik als Forschung setzt voraus, daГҹ der rechte Inhalt christlicher Rede von Gott menschlich erkannt werden muГҹ(KD., 12). must be known by men(мқёк°„м—җ мқҳн•ҙм„ң лҗҳм–ҙм•ј н•ңлӢӨ).
мҡ°лҰ¬лҠ” л°ҳнӢё(Cornelius Van Til')мқҳ м „м ңмЈјмқҳ(presuppositionalism)лҘј м№ј л°”лҘҙнҠёмқҳ мӢ н•ҷмқ„ л°°кІ©н•ҳкё° мң„н•ң мӢ н•ҷ м–ҙнңҳлқјкі мғқк°Ғн•ңлӢӨ. м№ј л°”лҘҙнҠёлҠ” гҖҺкөҗнҡҢкөҗмқҳн•ҷгҖҸ I/1, мІ« л¶Җ분м—җм„ң вҖҳм „м ңвҖҷлЎң мӢңмһ‘н•ңлӢӨ. вҖңлҢҖмғҒмқ„ мқёмӢқн• мҲҳ мһҲлӢӨлҠ” м „м ңвҖқлЎң м„ёмҡ°кі мһҲлӢӨ. к·ёлҹ°лҚ° лҢҖмғҒмқҖ мЎҙмһ¬к°Җ м•„лӢҲлқј мқёк°„мқҙ мӢ м—җ кҙҖн•ҙм„ң л§җн•ҳлҠ”(Redens von Gott) н–үмң„м—җ л§җн•Ё(Rede)мқҙлӢӨ. л°”лҘҙнҠёлҠ” к·ё л§җн•Ём—җм„ң кё°лҸ…көҗм Ғ л°”лҘё лӮҙмҡ©мқ„ мқёмӢқн• мҲҳ мһҲлӢӨкі мЈјмһҘн•ҳкі , к·ёлһҳм•јл§Ң н•ңлӢӨкі мЈјмһҘн•ңлӢӨ.
мӢ н•ҷм—җм„ң н•ҳлӮҳлӢҳмқ„ м•„лҠ” кІғ, мқёмӢқн•ҳлҠ” кІғмқҖ л§Өмҡ° лҜјк°җн•ң л¬ём ңмқҙлӢӨ. мқјл°ҳм ҒмңјлЎң мқҙлҹ¬н•ң кө¬мІҙм Ғмқё л©”м»ӨлӢҲмҰҳмқ„ л°қнһҲм§Җ м•ҠлҠ”лӢӨ. к·ёлҹ°лҚ° м№ј л°”лҘҙнҠёлҠ” л§Өмҡ° лӘ…нҷ•н•ҳкІҢ кө¬мЎ°лҘј л°қнһҢлӢӨ. мҷң мӢ н•ҷмһҗл“ӨмқҖ мһҗкё° мӢ н•ҷм Ғ н”„л Ҳмһ„(a theological framework)мқ„ л°қнһҲм§Җ м•Ҡм•ҳмқ„к№Ң? м№ј л°”лҘҙнҠёлҸ„ мІңмһ¬мқҙм§Җл§Ң, м„ёкі„м Ғмқё мІңмһ¬лҠ” м–ҙкұ°мҠӨнӢҙмқҙкі л§ҲнӢҙ лЈЁн„°мқҙкі мЎҙ м№јл№ҲмқҙлӢӨ. н•„мһҗлҠ” мЎҙ м№јл№Ҳмқҙ к°ҖмһҘ нғҒмӣ”н•ң мІңмһ¬мҳҖмқ„ кІғмқҙлқј мғқк°Ғн•ңлӢӨ. м„ңмІ мӣҗмқҖ вҖңмІ н•ҷ л¬ёмһҘмқҖ м–ҙл өм§Җл§Ң мқҙн•ҙн•ҳл©ҙ мүҪкі , мӢ н•ҷ л¬ёмһҘмқҖ лӢЁмҲңн•ҳм§Җл§Ң мқҙн•ҙн• мҲҳ м—ҶлӢӨвҖқкі мҲ нҡҢн–ҲлӢӨ. л°”лҘҙнҠёлҠ” мқёл¬ён•ҷм Ғ мӢ н•ҷмқ„ 추кө¬н•ҳкё° л•Ңл¬ём—җ, к·ёмқҳ л¬ёмһҘмқҙ 비лЎқ м–ҙл өм§Җл§Ң л°ҳліөн•ҙм„ң нӣҲл Ён•ҳл©ҙ мүҪкІҢ мқҙн•ҙн• мҲҳ мһҲлӢӨ. к·ёлҹ¬лӮҳ л§ҲнӢҙ лЈЁн„°мқҳ кёҖмқҙлӮҳ, мЎҙ м№јл№Ҳмқҳ гҖҺкё°лҸ…көҗк°•мҡ”гҖҸлҠ” м–Үкі мүҪкІҢ лҠҗк»ҙм§Җм§Җл§Ң мқҪмңјл©ҙ мқҪмқ„мҲҳлЎқ мүҪм§Җ м•ҠлӢӨ. м •нҶөнҢҢл“ӨмқҖ мһҗкё° мӢ н•ҷ н”„л Ҳмһ„мқ„ м •нҷ•н•ҳкІҢ л°қнһҲм§Җ м•Ҡм•ҳкё° л•Ңл¬ёмқҙлӢӨ. к·ёлҹ¬лӮҳ л°”лҘҙнҠёлҠ” мӢ н•ҷ н”„л Ҳмһ„мқ„ м •нҷ•н•ҳкІҢ м ңмӢңн•ңлӢӨ.
л°”лҘҙнҠёлҠ” вҖҳк°ҖлҠҘм„ұ(kann, can)вҖҷмқ„ м „м ңлЎң мӮјмңјл©ҙм„ң вҖҳлӢ№мң„м„ұ(muГҹ, must)вҖҷмңјлЎң м „м ңлҘј нҷ•лҰҪмӢңмј°лӢӨ. AI(Gemini)лҠ” л°”лҘҙнҠёмқҳ ліҖмҰқлІ•м Ғ мӢ н•ҷ(The Logic of Barth's Dialectical Theology)мңјлЎң 분м„қн•ңлӢӨ. мӢңмһ‘мқҖ мқёк°„мқҖ н•ҳлӮҳлӢҳмқ„ мқёмӢқн• мҲҳ м—ҶлӢӨ. м „нҷҳмқҖ н•ҳлӮҳлӢҳмқҙ мҠӨмҠӨлЎң кі„мӢңн• к°ҖлҠҘм„ұмқҙ мһҲлӢӨ. кІ°лЎ мқҖ к·ёлһҳм„ң н•ҳлӮҳлӢҳмқҙ кі„мӢңн•ҳкё° л•Ңл¬ём—җ мқёк°„мқҖ л°ҳл“ңмӢң лҜҝмқҢмңјлЎң мқ‘лӢөн• лӢ№мң„м„ұмқҙ мһҲлӢӨ.
к°ңнҳҒмӢ н•ҷмһҗ мң лӢҲмҡ°мҠӨ(Franciscus Junius, 1545-1602)лҠ” мӢ н•ҷмқҳ лҢҖмғҒмқ„ мӣҗнҳ•мӢ н•ҷ(Archetypal Theology)кіј лӘЁнҳ•мӢ н•ҷ(Ectypal Theology)мңјлЎң кө¬л¶„н•ҙм„ң, лӘЁнҳ•мӢ н•ҷ, мҰү кі„мӢң(revelation)м—җ мқҳн•ҙм„ң мҲҳн–үн•ңлӢӨ. мҰү н•ҳлӮҳлӢҳмқ„ м§Ғм ‘ лҢҖмғҒмңјлЎң н•ҳм§Җ м•Ҡкі , нҠ№лі„кі„мӢңм—җ мқҳн•ҙм„ң н•ҳлӮҳлӢҳмқ„ м•„лҠ” м§ҖмӢқмқ„ мҲҳн–үн•ҳлҠ” кІғмқҙлӢӨ. к·ёлһҳлҸ„ к°„м ‘м§ҖмӢқмқҙ м•„лӢҢ м§Ғм ‘м§ҖмӢқмңјлЎң к°„мЈјн•ңлӢӨ. м •нҶө кё°лҸ…көҗлҠ” мҳҲмҲҳ к·ёлҰ¬мҠӨлҸ„лҘј лҜҝлҠ” лҜҝмқҢмқ„ 추кө¬н•ңлӢӨ. к·ёлҹ°лҚ° л°”лҘҙнҠёлҠ” н•ҳлӮҳлӢҳм—җ кҙҖн•ң л§җн•Ём—җм„ң мқёмӢқлҗҳм–ҙм§ҖлҠ” л°”лҘё лӮҙмҡ©мқ„ 추кө¬н•ңлӢӨ. вҖңлҒҠмһ„м—Ҷмқҙ лҜҝмқҢмқ„ 추кө¬н•ҳлҠ” лҜҝмқҢвҖқкіј вҖңлҜҝмқҢмқҳ кІ°лӢЁмңјлЎң мқёмӢқмқ„ 추кө¬н•ҳлҠ” лҒҠмһ„м—ҶлҠ” нғҗкө¬(л°”лҘҙнҠё)вҖқлЎң лӘ…л°ұн•ҳкІҢ лҢҖмЎ°лҗңлӢӨ.
мҡ°лҰ¬лҠ” мқҙ л¶Җ분м—җм„ң л°”лҘҙнҠёк°Җ вҖңлҜҝмқҢмқҳ лҢҖмғҒвҖқмқ„ 추кө¬н•ҳлҠ” кІғмқҙ м•„лӢҲлқј, вҖңк°ҖлҠҘм„ұвҖқмқ„ м „м ңлЎң н•ң нғҗкө¬м—җм„ң вҖңмҳ¬л°”лҘё лӮҙмҡ©вҖқмқ„ мқёмӢқн•ҳлҠ” кІғмңјлЎң м ңмӢңн•ңлӢӨ. к·ёлҰ¬кі вҖңлӢ№мң„м„ұвҖқмқ„ м „м ңлЎң мӮ¬лһҢмқҙ вҖңмҳ¬л°”лҘё лӮҙмҡ©вҖқмқ„ мқёмӢқн• мҲҳ мһҲлӢӨлҠ” нҷ•мҰқмңјлЎң м „к°ңн•ңлӢӨ. к°ҖлҠҘм„ұл§Ң мһҲлӢӨл©ҙ мЈјмһҘмқҳ м„Өл“қл Ҙмқҙ м•Ҫн•ҳлӢӨ. л°ҳл“ңмӢң кө¬мІҙм Ғмқё лӘ©н‘ңлҘј л§җн•ҙм•ј н• кІғмқёлҚ°, мӢӨмһ¬лЎң кө¬мІҙм Ғмқё лӘ©н‘ңм—җ лҸ„лӢ¬н•ң кІғмқҖ м•Ң мҲҳ м—ҶлӢӨ. н•ӯмғҒ к°ҖлҠҘм„ұмқ„ м „м ңлЎң 추кө¬, нғҗкө¬н•ҙм•ј н•ҳлҠ” л…ём •(и·ҜзЁӢ)м—җ мһҲлӢӨ.
мҡ°лҰ¬лҠ” м•һм—җм„ң л°”лҘҙнҠёк°Җ м ңмӢңн•ң көҗмқҳ(Dogma) к°ңл…җмқҖ м •нҶө көҗнҡҢк°Җ м ңмӢңн•ң көҗмқҳ(Dogma) к°ңл…җкіј к°ҷм§Җ м•ҠлӢӨкі л°қнҳ”лӢӨ. л°”лҘҙнҠёлҠ” вҖңмҳ¬л°”лҘё лӮҙмҡ©вҖқмқ„ көҗмқҳлқјкі н•ҳлҠ”лҚ°, м •нҶө көҗнҡҢм—җм„ң көҗмқҳлҠ” мӮјмң„мқјмІҙмҷҖ к·ёлҰ¬мҠӨлҸ„ м–‘м„ұкөҗлҰ¬(н•ң мң„кІ©м—җ л‘җ ліём„ұ)мқҙлӢӨ. мқҙлҹ° мҳҒн–Ҙмқ„ л°ӣмқҖ мЎ°м§Җ лҰ°л“ңлІЎ(George A. Lindbeck, 1923-2018)мқҖ гҖҺкөҗлҰ¬мқҳ ліём„ұ, The Nature of Doctrine: Religion and Theology in a Postliberal AgeгҖҸ(1984л…„)м—җм„ң, көҗлҰ¬лҘј вҖңмӢ м•ҷкіөлҸҷмІҙмқҳ мӮ¶кіј м–ём–ҙлҘј к·ңмңЁн•ҳлҠ” л¬ёлІ•мқҙмһҗ к·ңм№ҷмңјлЎң мў…көҗ мқҳлҜёлҘј м ңкіөн•ҳлҠ” мІҙкі„вҖқлЎң м ңмӢңн–ҲлӢӨ(к№ҖмҳҒмӣҗ лІҲм—ӯ, м„ңмҡё: 100, 2021). л°”лҘҙнҠё мқҙм „мқҖ мһҗмң мЈјмқҳмқҙкі , л°”лҘҙнҠёлҠ” 1м°Ё лҢҖм „мқ„ кё°м җмңјлЎң мӢңмһ‘лҗң нҳ„лҢҖмӢ н•ҷмңјлЎң н•ҳкі , лҰ°л“ңл°ұмқҖ 1960л…„ мқҙнӣ„м—җ нҳ•м„ұлҗң нӣ„кё°мһҗмң мЈјмқҳлқјкі н•ңлӢӨ. нӣ„кё°мһҗмң мЈјмқҳлҠ” нӣ„кё°мў…көҗмӮ¬н•ҷнҢҢ (Post-Religious Historical School), мғҲкҙҖм җн•ҷнҢҢ(New Perspective on Paul) л“ұмңјлЎң кө¬л¶„лҗҳм–ҙ нҷңлҸҷн•ҳкі мһҲлӢӨ. кё°ліём ҒмңјлЎң м№ј л°”лҘҙнҠё мқҙнӣ„мқҳ мӢ н•ҷмқҖ м№ј л°”лҘҙнҠёмқҳ к·ёлҠҳ м•„лһҳ мһҲлӢӨкі ліҙм•„м•ј н•ңлӢӨ. м„ңмІ мӣҗмқҖ м№ј л°”лҘҙнҠёлҸ„ мҠҗлқјмқҙм–ҙл§Ҳн—Ҳмқҳ к·ёлҠҳмқ„ лІ—м–ҙлӮҳм§Җ лӘ»н–ҲлӢӨкі мЈјмһҘн•ңлӢӨ. мҠҗлқјмқҙм–ҙл§Ҳн—ҲлҠ” м№ёнҠёмқҳ мқёмӢқлЎ лІ”мЈј м•„лһҳ мһҲлӢӨ. мһҗмң мЈјмқҳлҠ” мқҙмӢ лЎ м—җ к·јкұ°н•ң кі„лӘҪмІ н•ҷмқҳ мӢңл…ҖмқҙлӢӨ. кі„лӘҪмІ н•ҷмқҳ мҷ„м„ұмһҗлҠ” мһ„л§ҲлҲ„м—ҳ м№ёнҠёмқҙлӢӨ. м№ёнҠёмқҳ мҲңмҲҳмқҙм„ұ(pure reason)м—җм„ң мҠҗлқјмқҙм–ҙл§Ҳн—ҲлҠ” м ҲлҢҖмқҳмЎҙк°җм •(feeling of absolute dependence)мқ„ мЈјмһҘн–Ҳкі , н—ӨкІ”мқҖ м ҲлҢҖмқҙм„ұ(Absolute Spirit)мқ„ мЈјмһҘн–Ҳм§Җл§Ң м№ёнҠёмқҳ к·ёлҠҳм—җ мһҲлӢӨ. мқёмӢқмқ„ мЈјмһҘн•ҳл©ҙ м№ёнҠёлҘј лІ—м–ҙлӮ мҲҳ м—ҶлӢӨ. м№ёнҠёмІҳлҹј мҷ„лІҪн•ҳкІҢ мқҙм„ұ мІҙкі„лҘј 분м„қн•ң н•ҷмһҗлҠ” м—ҶлӢӨ. мЈјлӢҳмқҳ л§җм”ҖмқҖ м Ғм§Җ м•ҠкІҢ л‘җл өлӢӨ.
л§Ҳ 12:43-45 вҖңлҚ”лҹ¬мҡҙ к·ҖмӢ мқҙ мӮ¬лһҢм—җкІҢм„ң лӮҳк°”мқ„ л•Ңм—җ л¬ј м—ҶлҠ” кіімңјлЎң лӢӨлӢҲл©° мү¬кё°лҘј кө¬н•ҳлҗҳ мүҙ кіімқ„ м–»м§Җ лӘ»н•ҳкі мқҙм—җ мқҙлҘҙлҗҳ лӮҙк°Җ лӮҳмҳЁ лӮҙ 집мңјлЎң лҸҢм•„к°ҖлҰ¬лқј н•ҳкі мҷҖ ліҙлӢҲ к·ё 집мқҙ л№„кі мІӯмҶҢлҗҳкі мҲҳлҰ¬лҗҳм—Ҳкұ°лҠҳ мқҙм—җ к°Җм„ң м ҖліҙлӢӨ лҚ” м•…н•ң к·ҖмӢ мқјкіұмқ„ лҚ°лҰ¬кі л“Өм–ҙк°Җм„ң кұ°н•ҳлӢҲ к·ё мӮ¬лһҢмқҳ лӮҳмӨ‘ нҳ•нҺёмқҙ м „ліҙлӢӨ лҚ”мҡұ мӢ¬н•ҳкІҢ лҗҳлҠҗлӢҲлқј мқҙ м•…н•ң м„ёлҢҖк°Җ лҳҗн•ң мқҙл ҮкІҢ лҗҳлҰ¬лқјвҖқ
л°”лҘҙнҠёлҠ” мӢ мқ„ мқёмӢқн• мҲҳ мһҲлҠ” к°ҖлҠҘм„ұмқ„ м „м ңлЎң м„ёмӣ лӢӨ. к·ё м „м ңмқҳ к·јкұ°лҠ” м•„м§Ғ л°қнһҲм§Җ м•Ҡм•ҳм§Җл§Ң, мӢ мқҳ нҷңлҸҷмқҙлӢӨ. мҡ°лҰ¬лҠ” м„ұл №мқҳ мЎ°лӘ…мңјлЎң н•ҳлҠ”лҚ°, л°ҳл“ңмӢң вҖңм„ нҸ¬лҗң л§җм”Җкіј н•Ёк»ҳ(cum verbo)вҖқлҘј кІ¬м§Җн•ҳлҠ”лҚ°, л°”лҘҙнҠёлҠ” к·ёлҹ¬н•ң кө¬лҸ„лҘј мӢ мқ„ м ңм•Ҫн•ҳлҠ” кІғмңјлЎң нҸүк°Җн•ҙм„ң кұ°л¶Җн•ңлӢӨ.
нҳ„лҢҖмӢ н•ҷ мқҙнӣ„, нӣ„кё°мһҗмң мЈјмқҳмӢ н•ҷмқ„ м ‘н• л•Ңм—җлҸ„ мһҗкё° м „м ңлҘј 분лӘ…н•ҳкІҢ м„ёмӣҢм•ј н•ҳл©°, мһҗкё° м§Җн–Ҙм„ұмқ„ 분лӘ…н•ҳкІҢ м„ёмӣҢм•ј н•ңлӢӨ. к·ёл Үм§Җ м•ҠлҠ”лӢӨл©ҙ кұ°лҢҖн•ң л„“мқҖ кёёмқ„ лІ—м–ҙлӮ мҲҳ м—ҶлӢӨ. мҳҲмҲҳ ліөмқҢмқ„ м „лҸ„н•Ёкіј ліөмқҢмңјлЎң көҗнҡҢ м„ёмӣҖмқ„ лӘ…лЈҢн•ҳкІҢ м„ёмҡ°м§Җ м•ҠлҠ”лӢӨл©ҙ, мҳҲмҲҳлҠ” лҢҖмғҒм—җм„ң мӮ¬лқјм§Ҳ кІғмқҙкі , көҗнҡҢлҠ” мІҙн—ҳлҗң мў…көҗкІҪн—ҳмқ„ лӮҳлҲ„лҠ” кіөлҸҷмІҙк°Җ лҗ кІғмқҙлӢӨ. көҗнҡҢлҠ” мЈј н•ҳлӮҳлӢҳмқҳ н”јлЎң мӮ¬мӢ кұ°лЈ©н•ң кіөлҸҷмІҙлЎң көҗнҡҢмқҳ лЁёлҰ¬мқҙмӢ мЈј мҳҲмҲҳ к·ёлҰ¬мҠӨлҸ„л§Ңмқ„ лҶ’м—¬м•ј н•ңлӢӨ. л°”лҘҙнҠёмқҳ гҖҺкөҗнҡҢкөҗмқҳн•ҷгҖҸм—җм„ң к·ёл ҮкІҢ н’Қм„ұн•ҳкІҢ мҳҲмҲҳ к·ёлҰ¬мҠӨлҸ„лҘј м–ёкёүн•ҳм§Җл§Ң, л°”лҘҙнҠёлҠ” мҳҲмҲҳлҘј лҢҖмғҒмқҙ м•„лӢҢ лҸ„кө¬, к·јкұ°лЎң нҷңмҡ©н•ңлӢӨ. м „м ҒмңјлЎң мқёк°„ мҳҲмҲҳ к·ёлҰ¬мҠӨлҸ„лҘј н‘ңл°©н•ңлӢӨ.
|
кёҖм“ҙмқҙ н”„лЎңн•„ кёҖм“ҙмқҙ : кі кІҪнғң лӘ©мӮ¬ (мЈјлӢҳмқҳкөҗнҡҢ / нҳ•лһҢм„ңмӣҗ) мқҙл©”мқј : |
 л°”лҘҙнҠёмқҳ көҗмқҳн•ҷ, көҗмқҳ к°ңл…җ л°”лҘҙнҠёмқҳ көҗмқҳн•ҷ, көҗмқҳ к°ңл…җ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