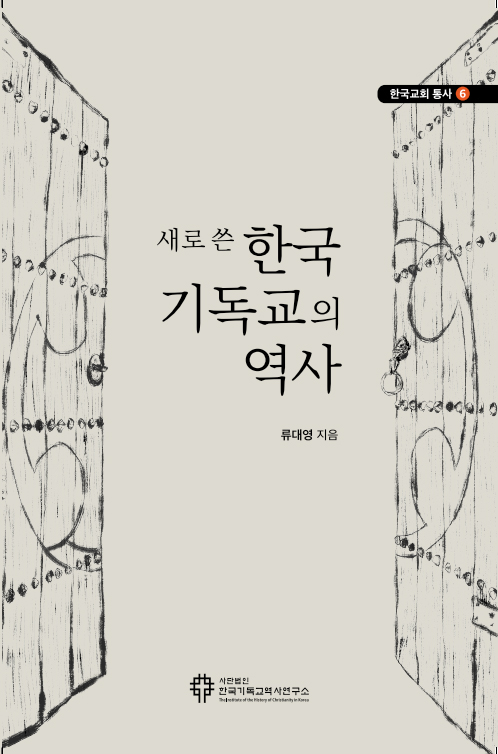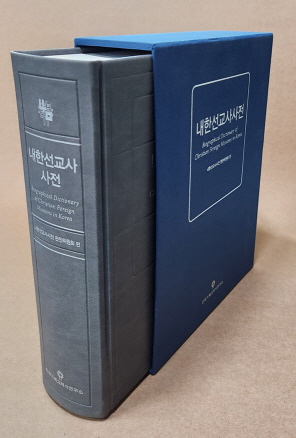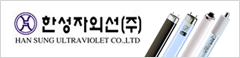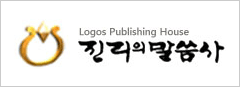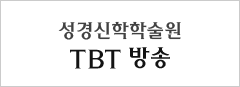мҳӨн”јлӢҲм–ё
м„ұкІҪмқҳ м ҲлҢҖ к¶Ңмң„мҷҖ м •кІҪ нҷ•м •мқҳ м„ӯлҰ¬ кіјм • (в…Ұ)
8. нҠ№лі„кі„мӢң мҷ„м„ұкіј лӘЁл“ л¬ён—Ңмқҳ л°©нҺёнҷ”
м„ұкІҪ кі„мӢң кё°лЎқмқҳ м •кІҪм„ұ нҷ•м •мқҖ м „м ҒмңјлЎң н•ҳлӮҳлӢҳмқҳ мЈјк¶Ңм Ғ мӮ¬м—ӯмқҙлӢӨ. м •кІҪмқҳ мӢ м Ғ к¶Ңмң„лҘј мҶҢнҷҖнһҲ н•ҳл©ҙ л°”лҘё мӢ н•ҷмқ„ мҲҳлҰҪн• мҲҳ м—ҶлӢӨ. м„ұкІҪмқҳ л¶Җ분 л¶Җ분мқ„ л°ңм·Ңн•ҳм—¬ м„ұкІҪм—җ к·јкұ°н•ң н•ҷл¬ёмІҳлҹј мӢ н•ҷмқ„ кө¬мЎ°нҷ”н•ҳлҚ”лқјлҸ„ м„ұкІҪ м „мІҙмқҳ лҸҷмқјн•ң мӢ м Ғ к¶Ңмң„лҘј мң м§Җн•ҳм§Җ лӘ»н•ңлӢӨл©ҙ к·ё мӢ н•ҷмқҖ мқҙлӮҙ мҳӨлҘҳлҘј л“ңлҹ¬лӮёлӢӨ. м§ҖлӮң нҳёк№Ңм§Җ мӮҙнҺҙліё л°”мҷҖ к°ҷмқҙ м„ұкІҪ кі„мӢң м „мІҙмқҳ мҷ„м „м„ұмқ„ л¶Җм •н•ҳл©ҙм„ң л§Ҳм№ҳ к¶Ңмң„ мһҲлҠ” мӢ н•ҷмІҳлҹј ліҙмҳҖлҚҳ мҳҲл“Өмқ„ мӮҙнҺҙліҙм•ҳлӢӨ. кұҙм „н•ҳкі к¶Ңмң„ мһҲлҠ” мӢ н•ҷ мқҙлЎ мІҳлҹј мЈјмһҘн•ҳм§Җл§Ң м„ұкІҪ 진лҰ¬м—җ к·јкұ°лҘј л‘” кІғмқҙ м•„лӢҲлқј мІ н•ҷ мӮ¬мғҒмқҙлӮҳ мһҗкё° мІҙн—ҳмқҳ кІ°кіјл¬јмқё кІҪмҡ°лҸ„ мӮҙнҺҙліҙм•ҳлӢӨ. мқҙлҹ° м җм—җм„ң м •кІҪ нҷ•мҰқмқҖ л°”лҘё мӢ н•ҷ м„ұлҰҪмқҳ кІ°м •м Ғ мҡ”кұҙмқҙл©° лҸҷмӢңм—җ м„ұкІҪ кі„мӢңмқҳ мҷ„кІ°м„ұ(Self-containedness, м–‘м Ғ 충мЎұм„ұ)кіј мҷ„м „м„ұ(Completeness, лӮҙмҡ©В·кө¬м„ұмқҳ л§Ҳл¬ҙлҰ¬)кіј мҷ„лІҪм„ұ(Perfection, м§Ҳм Ғ л¬ҙкІ°м„ұ) мҷ„비лҘј лң»н•ңлӢӨ. н•„мһҗлҠ” мқҙлҹ¬н•ң м •кІҪ нҷ•мҰқмқҳ м—ӯмӮ¬лҘј н•ҳлӮҳлӢҳмқҳ л§җм”Җмқҙ м ҲлҢҖмЈјк¶Ңм ҒмңјлЎң м„ӯлҰ¬н•ҳмӢ лӢӨлҠ” кІғмқ„ м—ӯмӮ¬м Ғ мӮ¬мӢӨкіј м„ұкІҪ ліёл¬ёмқ„ нҶөн•ҙ мҰқлӘ…н•ҳкі мһҲлӢӨ. мқҙн•ҳм—җм„ңлҸ„ вҖҳмӮҙм•ҳкі мҡҙлҸҷл Ҙ мһҲлҠ” н•ҳлӮҳлӢҳ л§җм”ҖвҖҷмқҙ м–ҙл–»кІҢ м •кІҪмқҳ к¶Ңмң„лҘј нҷ•лҰҪн•ҳмҳҖлҠ”м§Җ мҙҲлҢҖ көҗнҡҢ к·ёлҰҮлҗң мқҖмӮ¬мЈјмқҳм—җ мһ„н•ң н•ҳлӮҳлӢҳмқҳ мӢ¬нҢҗкіј н•Ёк»ҳ мӮҙн”јкі , лҳҗн•ң лӢӨм–‘н•ң л¬ён•ҷм Ғ мһҘлҘҙл“Өмқ„ м •кІҪ нҷ•мҰқмқҳ лҸ„кө¬лЎң мӮ¬мҡ©н–ҲлҠ”м§Җ мӮҙнҺҙліҙкі мһҗ н•ңлӢӨ.
н•ҳлӮҳлӢҳмқҳ нҠ№лі„ кі„мӢң кё°лЎқмқҖ 95л…„кІҪ мӮ¬лҸ„ мҡ”н•ңкіј н•Ёк»ҳ мў…кІ°лҗҳм—ҲмңјлҜҖлЎң м–ҙл– н•ң мғҲлЎңмҡҙ кі„мӢңлҸ„ мЈјм–ҙм§Җм§Җ м•ҠлҠ”лӢӨлҠ” м җ(кі„ 22:18-19)мқҙ мӮ¬лҸ„лЎңл¶Җн„° мҙҲлҢҖ көҗнҡҢм—җм„ң кұҙм „н•ҳкІҢ м „мҠ№лҗң м„ұкІҪкҙҖмқҙлӢӨ. к·ёлһҳм„ң мӢ м•Ҫ м„ұкІҪмқҳ м •кІҪ нҷ•м • мқҙнӣ„ мҳҲм–ё, нҷҳмғҒ, м§Ғм ‘ кі„мӢң л“ұмқ„ м„ұкІҪ кі„мӢңмҷҖ лҸҷл“ұн•ң к¶Ңмң„лЎң 비көҗн•ҳлҠ” кІғмқҖ мҡ©лӮ©н• мҲҳ м—ҶлӢӨ. мӮ¬лҸ„л“Өмқҳ м •кІҪ мҷ„м„ұ мқҙнӣ„м—җлҸ„ кі„мӢңмқҳ мў…кІ°кіј мҷ„кІ°мқ„ л¶Җм •н•ҳлҠ” лӘ¬нғҖлҲ„мҠӨмЈјмқҳмҷҖ мқҙлҘј л°ӣм•„л“Өмқё н„°нҲҙлҰ¬м•Ҳмқҳ мЈјмһҘмқҖ к·ё мһҗмІҙк°Җ мҡ”н•ңкі„мӢңлЎқ 22мһҘ 18-19м Ҳмқҳ мһ¬м•ҷкіј мӢ¬нҢҗмқҙ мһ„н•ң мҰқкұ°лӢӨ. вҖҳм„ұл №мқҙ м•„м§Ғ л§җм”Җн•ҳмӢ лӢӨвҖҷкі мЈјмһҘн•ң лӘ¬нғҖлҲ„мҠӨмЈјмқҳмқҳ вҖҳмғҲ мҳҲм–ё(Nova Prophetia)вҖҷ мЈјмһҘмқҖ мӮҙм•ҳкі мҡҙлҸҷл Ҙ мһҲлҠ” н•ҳлӮҳлӢҳ л§җм”Җмқҳ мӢ¬нҢҗмқҙлӢӨ! нҳ„лҢҖм—җлҸ„ м§Ғм ‘ кі„мӢңлҘј мЈјмһҘн•ҳлҠ” к·ёлҰҮлҗң мҳӨмҲңм ҲмЈјмқҳлӮҳ мқҖмӮ¬мЈјмқҳлҠ” м•һмқҳ кі„мӢңлЎқ л§җм”Җмқҳ мӢ¬нҢҗм—җм„ң лІ—м–ҙлӮ мҲҳ м—Ҷмқ„ кІғмқҙлӢӨ. м •кІҪ нҷ•м •кіј н•Ёк»ҳ л§җм”Җ м „мІҙлҘј м ҲлҢҖ 진лҰ¬лЎң нҷ•мҰқн•ҳм—¬ м „мҲҳн•ҳлҠҗлғҗк°Җ көҗнҡҢмқҳ ліём§ҲмқҙлӢӨ. ліөмқҢмЈјмқҳмқҳ м„ёкі„м Ғ нқҗлҰ„мқҙ м җм җ кі„мӢңмқҳ м§Ғм ‘ мІҙн—ҳмқ„ мЎ°мһҘн•ҳлҠ” мқҖмӮ¬мҡҙлҸҷмңјлЎң нқҳлҹ¬к°ҖлҠ” мқҙ мӢңм җм—җм„ң, мҙҲлҢҖ көҗнҡҢмқҳ м •кІҪ нҷ•м •мқҳ м—ӯмӮ¬лҠ” көҗнҡҢ м •мІҙм„ұмқ„ к·јліём ҒмңјлЎң лҗҳлҸҢм•„ліҙкІҢ н•ңлӢӨ.
к·ёлҹ°лҚ° 2-3м„ёкё° мӢ м•Ҫм„ұкІҪмқҳ м •кІҪ нҷ•м • л¬ём ңлҠ” мЈјлЎң м„ұкІҪ нӣ„л°ҳм—җ 집мӨ‘н•ҙ мһҲлӢӨ. к°Җл № нһҲлёҢлҰ¬м„ңм—җ лҢҖн•ҙ лҸҷл°©көҗнҡҢлҠ” м •кІҪмңјлЎң мқём •н–ҲмңјлӮҳ м„ңл°©көҗнҡҢлҠ” мқём •н•ҳм§Җ м•ҠлҠ”лӢӨ. мҡ”н•ңкі„мӢңлЎқмқҳ кІҪмҡ°лҠ” к·ё л°ҳлҢҖмҳҖлӢӨ. м„ңл°©көҗнҡҢлҠ” мІҳмқҢл¶Җн„° мҡ”н•ңкі„мӢңлЎқмқ„ м •кІҪмңјлЎң л°ӣм•„л“ӨмҳҖмңјлӮҳ лҸҷл°©көҗнҡҢлҠ” к·ёл Үм§Җ м•Ҡм•ҳлӢӨ. к°Җл № мҳӨлҰ¬кІҗмқҳ м ңмһҗмҳҖлҚҳ м•Ңл үмӮ°л“ңлҰ¬м•„ көҗнҡҢмқҳ мЈјкөҗ л””мҳӨлӢҲмӢңмҡ°мҠӨ(Dionysius of Alexandria, ?–264л…„кІҪ)лҠ” м•јкі ліҙм„ң, мҡ”н•ң 2м„ңмҷҖ 3м„ңлҘј м •кІҪмңјлЎң м§Җм§Җн–ҲмңјлӮҳ, лІ л“ңлЎңнӣ„м„ңмҷҖ мң лӢӨм„ңлҠ” мқём •н•ҳм§Җ м•Ҡм•ҳлӢӨ. лӢ№мӢң к°ҖмһҘ л…јлһҖмқҙ лҗҳм—ҲлҚҳ мұ…мқҖ лІ л“ңлЎңнӣ„м„ңмҳҖлӢӨ. мқҙлҹ¬н•ң л…јмҹҒмқҖ 4м„ёкё° л§җ м•Ңл үмӮ°л“ңлҰ¬м•„ к°җлҸ… м•„нғҖлӮҳмӢңмҡ°мҠӨ(Athanasius)к°Җ 367л…„ л¶Җнҷңм Ҳ 축мқј м„ңн•ңм—җм„ң мӢ м•Ҫмқҳ м •кІҪмқҖ нҳ„мһ¬мқҳ 27к¶Ңмһ„мқ„ мІҳмқҢмңјлЎң м„ м–ён•ҳл©ҙм„ң нҷ•м •лҗңлӢӨ. к·ёмқҳ л§җмқҙлӢӨ. вҖңм •кІҪм Ғмқё м„ұкІҪл“Ө мҷём—җлҠ” м•„л¬ҙкІғлҸ„ көҗнҡҢ м•Ҳм—җм„ң н•ҳлӮҳлӢҳмқҳ м„ұкІҪмқҙлқјлҠ” мқҙлҰ„мңјлЎң мқҪнҳҖм„ңлҠ” м•Ҳ лҗңлӢӨ.вҖқ л¬јлЎ мқҙлҹ¬н•ң м—ӯмӮ¬м Ғ мӮ¬мӢӨмқҖ ліҙнҳңмӮ¬ м„ұл № н•ҳлӮҳлӢҳмқҙ мқҖнҳңмҷҖ мЈјк¶ҢмңјлЎң м„ӯлҰ¬н•ҳмӢ лӢӨ! к°Җл №, кё°лҸ…көҗмқҳ лЎңл§Ҳ көӯкөҗнҷ”(380л…„)лҠ” м„ё лӘ…мқҳ нҷ©м ң[лҸҷлЎңл§Ҳ нҷ©м ң н…ҢмҳӨлҸ„мӢңмҡ°мҠӨ 1м„ё(347-395), м„ңлЎңл§Ҳ нҷ©м ң к·ёлқјнӢ°м•„лҲ„мҠӨ(359-383), м„ңлЎңл§Ҳ кіөлҸҷнҷ©м ң л°ңл ҢнӢ°лӢҲм•„лҲ„мҠӨ 2м„ё(371-392)]к°Җ вҖҳн…ҢмӮҙлЎңлӢҲм№ҙ м№ҷл №вҖҷ[вҖҳлЎңл§Ҳ м ңкөӯ лӮҙ лӘЁл“ л°ұм„ұмқҖ к°ҖнҶЁлҰӯ(ліҙнҺём Ғ) кё°лҸ…көҗ мӢ м•ҷмқ„ л”°лҘј кІғвҖҷ, вҖҳлӢҲмјҖм•„ мӢ мЎ°лҘј л”°лҘҙлҠ” кё°лҸ…көҗлҘј мң мқјн•ң н•©лІ• мў…көҗлЎң мқём •н•ЁвҖҷ]мқ„ нҶөн•ҙ нҷ•м •н–ҲлӢӨкі ліҙлҠ” кІғмқҖ н”јмғҒм Ғ нҸүк°ҖлӢӨ. мқҙлҠ” мЈј мҳҲмҲҳ к·ёлҰ¬мҠӨлҸ„к»ҳм„ң мҲҳлҰҪн•ҳмӢ м•ҪмҶҚ(н–ү 1:8 м°ёмЎ°)мқҳ м„ұм·Ёмқҙл©° к·ё мЈјкҙҖмһҗлҠ” мҳӨм§Ғ м—¬нҳёмҷҖ н•ҳлӮҳлӢҳмқҙмӢңлӢӨ.(лӢЁ 2:20-21; 4:17; лЎ¬ 13:1; мҡ” 19:10-11 м°ёмЎ°) вҖҳ진лҰ¬мқҳ кё°л‘Ҙкіј н„°мқё н•ҳлӮҳлӢҳмқҳ көҗнҡҢвҖҷ(л”Өм „ 3:15)лҠ” л°”лЎң м„ұкІҪмқҳ мӢ м Ғ к¶Ңмң„к°Җ кі„мӢңлҗҳлҠ” нҳ„мһҘмқҙлӢӨ.
м°Ҫм„ём „ к·ёлҰ¬мҠӨлҸ„ м•Ҳм—җм„ң н•ҳлӮҳлӢҳмқҳ мһҗл…ҖлЎң м„ нғқл°ӣкі мқҙ м§ҖмғҒм—җм„ң м„ұл №мқҳ мқём№ҳмӢ¬м—җ л”°лқј к·ёлҰ¬мҠӨлҸ„мқҳ м§ҖмІҙлЎң л¶ҖлҰ„ л°ӣмқҖ(м—Ў 1:3-14 м°ёмЎ°) м„ұлҸ„к°Җ лҗҳм—ҲлӢӨкі н• л•Ң, мқҙлҠ” м°Ҫм„ём „ мҳҒмӣҗн•ң м–ём•Ҫмқҳ л§җм”Җмқҙ н•ҳлӮҳлӢҳмқҳ мҳҒкҙ‘кіј лҠҘл ҘмңјлЎң м„ұм·ЁлҗҳлҠ” мӢ м Ғ кі„мӢң мӮ¬м—ӯмқҙлӢӨ. мҳҲмҲҳ к·ёлҰ¬мҠӨлҸ„к»ҳм„ң вҖҳм–ҙл–Ө мқҙлҠ” мӮ¬лҸ„лЎң м–ҙл–Ө мқҙлҠ” м„ м§ҖмһҗлЎң м–ҙл–Ө мқҙлҠ” ліөмқҢ м „н•ҳлҠ” мһҗлЎң к·ёлҰ¬кі лӘ©мӮ¬мқё көҗмӮ¬лЎңвҖҷ м„ёмҡ°м…ЁлӢӨлҠ” л§җм”ҖмқҖ көҗнҡҢк°Җ мҳӨм§Ғ н•ҳлӮҳлӢҳ л§җм”ҖмңјлЎңл§Ң мЎҙмҶҚн• мҲҳ мһҲлҠ” мғқлӘ…мқҳ м—°н•©мІҙ(н–ү 2:42; м—Ў 4:11-12)мһ„мқ„ 분лӘ…н•ҳкІҢ ліҙм—¬мӨҖлӢӨ. мҙҲлҢҖ көҗнҡҢ лӢ№мӢң мқјм–ҙлӮ¬лҚҳ кё°лҸ…көҗмқҳ көӯкөҗнҷ”, к·ёлҰ¬кі кө¬м•Ҫм„ұкІҪкіј мӢ м•Ҫм„ұкІҪмқҳ м •кІҪ нҷ•м •мқҖ м „м ҒмңјлЎң вҖҳмӮ¬лһҢмқҳ м§Җнҳңк°Җ к°ҖлҘҙм№ң л§җлЎң м•„лӢҲн•ҳкі мҳӨм§Ғ м„ұл №к»ҳм„ң к°ҖлҘҙм№ҳмӢ кІғвҖҷ(кі м „ 2:13)мңјлЎңл§Ң к°ҖлҠҘн•ң м—ӯмӮ¬мҳҖлӢӨ. мҳӨм§Ғ м„ұл №к»ҳм„ң(sola spiritus sanctus) к°ҖлҘҙміҗмЈјмӢңлҜҖлЎң мҳӨм§Ғ м„ұкІҪ(sola scriptura)л§ҢмңјлЎң м„ұкІҪ к¶Ңмң„к°Җ нҷ•м •лҗңлӢӨ. мҳҲмҲҳ к·ёлҰ¬мҠӨлҸ„мқҳ м•ҪмҶҚлҢҖлЎң к°•лҰјн•ҳмӢ ліҙнҳңмӮ¬ м„ұл №к»ҳм„ңлҠ”(мҡ” 14:26; 15:26) мӮ¬лҸ„л“Өмқ„ нҶөн•ҙ м •кІҪмқ„ мҷ„м„ұн•ҳмҳҖмңјл©° мҳҲлЈЁмӮҙл ҳл¶Җн„° м„ёмҡҙ көҗнҡҢ(н–ү 1:8 м°ёмЎ°)мқҳ мӢ мӢӨн•ң 진лҰ¬ к°җлҸ…мһҗлҘј м§ҖмҶҚм ҒмңјлЎң м–‘мңЎн•ҳм—¬ м ҲлҢҖ진лҰ¬мқҳ л§җм”Җмқ„ м „мҲҳн•ҳкІҢ н•ҳм…ЁлӢӨ. мқҙл ҮкІҢ л§җм”Җмқҳ м •кІҪнҷ”м—җ лӢҙкёҙ м°ёлҗң мқҳлҜёлҠ” ліҙнҳңмӮ¬ м„ұл №м—җ мқҳн•ң вҖҳмӮҙм•ҳкі мҡҙлҸҷл Ҙ мһҲлҠ” н•ҳлӮҳлӢҳ л§җм”ҖвҖҷмқҳ мӢ м Ғ кі„мӢң мӮ¬кұҙмқҙлқјлҠ” лҚ°м„ң м°ҫмқ„ мҲҳ мһҲлӢӨ.
к·ёлҹ°лҚ° кө¬м•Ҫмқҙл“ мӢ м•Ҫмқҙл“ ліҙнҳңмӮ¬ м„ұл № н•ҳлӮҳлӢҳмқҖ л§җм”Җ кё°лЎқ лӢ№мӢң лӢӨм–‘н•ң л¬ён•ҷмқҳ мһҘлҘҙмҷҖ л¬ёмІҙ к·ёлҰ¬кі лӢӨм–‘н•ң мҲҳмӮ¬н•ҷ(дҝ®иҫӯеӯё) кё°лІ•мқ„ мЈјк¶Ңм ҒмңјлЎң кҙҖлҰ¬н•ҳл©ҙм„ң кё°лЎқн•ҳкІҢ н•ҳмӢ лӢӨ. к°Җл № кө¬м•Ҫ мІ« лӢӨм„Ҝ к¶Ңмқ„ кё°лЎқн•ҳкІҢ н• л•Ң лӘЁм„ёк°Җ м• көҪ мӮ¬лһҢмқҳ н•ҷмҲ мқ„ лӢӨ л°°мӣҢ м–ён–үм—җм„ң лҠҘнҶөн•ҳкІҢ н•ҳм…ЁлӢӨ.(н–ү 7:22 м°ёмЎ°) вҖҳм–ём•Ҫн•ҳмӢ лҢҖлЎң м„ұм·Ён•ҳмӢ лӢӨвҖҷлҠ” н•ҳлӮҳлӢҳмқҳ нҳём№ӯ вҖҳм—¬нҳёмҷҖвҖҷ(м¶ң 6:2-5; мӢ 7:9 м°ёмЎ°)лҘј мӮ¬мҡ©н• л•Ң н•ҳлӮҳлӢҳмқҖ кі лҢҖ к·јлҸҷмқҳ вҖҳкі„м•ҪвҖҷмқҙ к°–лҠ” мӨ‘лҢҖн•ң мқҳлҜёлҘј лҸ„кө¬лЎң мӮ¬мҡ©н•ңлӢӨ. кі„м•Ҫм„ң кҙҖл Ё л§ҺмқҖ кёҖл“Өмқҙ м„ұкІҪ кё°лЎқ лӢ№мӢң ліҙнҺёнҷ”н•ҳкі мһҲкё°лҸ„ н–ҲлӢӨ. кіөм§Ғмһҗл“ӨмқҙлӮҳ м№ңкө¬ мғҒнҳё к°„ м„ңмӢ көҗнҷҳ л¬ён—Ңмқҳ нҠ№лі„н•ң мһҘлҘҙлҸ„ мһҲлӢӨ. (нҺём§Җ л°©мӢқмқҖ мқҙмҠӨлқјм—ҳ м—ӯмӮ¬ нӣ„лҢҖк№Ңм§Җ м „н•ҙ진лӢӨ. л ҳ 29:1; м—җ 9:20,29-32; лҢҖн•ҳ 30:1,6 м°ёмЎ°) к·ёлҰ¬кі мӢңлӮҙмӮ°м—җм„ң лӘЁм„ёк°Җ л°ӣмқҖ лІ•мІҳлҹј к¶ҒмӨ‘ лІ•м „ м–‘мӢқлҸ„ л¬ён—Ңн•ҷм ҒмңјлЎң л“ұмһҘн•ңлӢӨ. м •м№ҳм Ғ нҳ„м•Ҳл“Өм—җ лҢҖн•ң көӯк°Җ к°„ нҳ‘м •м„ңлҸ„ л“ұмһҘн•ҳлҠ”к°Җ н•ҳл©ҙ мҷ•мӢӨмқҳ м—°ліҙ(е№ҙиӯң)мҷҖ мӮ¬кұҙ кё°лЎқл“ӨлҸ„ мӢ м„ұн•ң кІғмңјлЎң ліҙкҙҖн•ңлӢӨлҠ” м •ліҙлҸ„ мһҲлӢӨ. м„ңмӮ¬м Ғ кё°лЎқлҝҗ м•„лӢҲлқј лҜёлһҳ м—ӯмӮ¬лҘј мҳҲкІ¬н•ҳлҠ” л¬ён—Ңл“ӨлҸ„ мһҲм—ҲлӢӨ. к·ёлҰ¬кі мў…көҗмҷҖ кҙҖл Ёлҗң мӢңм Ғ л¬ён•ҷ мһҘлҘҙлҠ” кҙ‘лІ”мң„н•ҳкІҢ лӮҳнғҖлӮҳкі мһҲлӢӨ. (н•Ёл¬ҙлқјл№„ лІ•м „мқҳ м„ңл¬ёкіј нӣ„кё°м—җлҠ” мӢңм Ғ н‘ңнҳ„л“Өмқҙ лӮҳнғҖлӮңлӢӨ.) лҳҗн•ң мў…көҗмҷҖ к°ҖмһҘ л°Җм ‘н•ҳкІҢ кҙҖл Ёлҗң вҖҳм§Җнҳң л¬ён•ҷвҖҷмқҙлӮҳ вҖҳмҳҲм–ём„ңвҖҷл“ӨлҸ„ кі лҢҖ л°”лІЁлЎ мқҙлӮҳ мқҙ집нҠё м ңкөӯ, к°ҖлӮҳм•Ҳкіј м•„лһҢ л¬ён—Ңм—җм„ң лӢӨм–‘н•ң л°©мӢқмңјлЎң л°ңкІ¬лҗңлӢӨ. м„ұкІҪ кё°лЎқ лӢ№мӢң мқҙл°© м җмҹҒмқҙлӮҳ м„ кІ¬мһҗ, л¬ҙлӢ№мқҖ л§Ҳм№ҳ мӢ мІҳлҹј нҷңлҸҷн•ҳкі мһҲлӢӨлҠ” м •ліҙл“ӨлҸ„ мһҲлӢӨ. (н•ҳлӮҳлӢҳмқҖ кұ°м§“ м„ м§ҖмһҗлҘј мӢ¬нҢҗмқҳ лҸ„кө¬лЎң вҖҳм Ғк·№вҖҷ мӮ¬мҡ©н•ҳмӢ лӢӨ. мҷ•мғҒ 22:22 м°ёмЎ°)
к·ёлҰ¬кі мҡҘкё°мҷҖ кҙҖл Ён•ҙм„ң, кі лҢҖ к·јлҸҷмқҳ м§Җнҳң л¬ён•ҷ мһҘлҘҙлҠ” мӢңл¬ён•ҷмқ„ вҖҳлҢҖнҷ”мІҙвҖҷ л°©мӢқмңјлЎң кө¬м„ұн–ҲлӢӨлҠ” мӮ¬мӢӨлҸ„ м°ёкі н• мҲҳ мһҲлӢӨ. мӢңнҺёкіј кҙҖл Ён•ҙм„ң нһҲлёҢлҰ¬мқёл“ӨмқҖ мӢңл¬ён•ҷмқ„ м „к°ңн• л•Ң нҸүн–үлІ•кіј м°¬м–‘мӢң, нғ„мӢқмӢңмҷҖ к°җмӮ¬мӢңмқҳ мҲҳмӮ¬н•ҷм Ғ кё°лІ•мқ„ мЈјмҡ”н•ң м°¬м–‘ л°©лІ•мңјлЎң мӮ¬мҡ©н–ҲлӢӨлҠ” мӮ¬мӢӨмқҙлӢӨ. мһ м–ёкіј кҙҖл Ён•ҙм„ңлҠ” кІ©м–ёкіј көҗнӣҲмқҙ кі лҢҖ к·јлҸҷмқҳ м§Җнҳңл¬ён•ҷмқҳ лҢҖн‘ңм Ғ нҳ•нғңмһ„мқ„ ліҙм—¬мӨҖлӢӨ. лҳҗн•ң м„ м§Җмһҗл“Өмқҳ мҳҲм–ёкіј кҙҖл Ён•ҙм„ңлҠ” лӢ№мӢң мЈјмҡ” л¬ён•ҷм Ғ мҲҳмӮ¬(дҝ®иҫӯ)мҳҖлҚҳ мҳӨлқјнҒҙ(мӢ нғҒ)мқҙлӮҳ м• к°Җ(е“ҖжӯҢ) нҳ№мқҖ 비мң мҷҖ м„ м§Җмһҗл“Өмқҳ нҠ№лі„н•ң лӘём§“мқҙлӮҳ н–үмң„[к°Җл №, л ҳ 13:1–11(лІ лқ ); 27:2–11(лӮҳл¬ҙ л©Қм—җмҷҖ мӨ„); кІ” 5:1–4(лЁёлҰ¬н„ёкіј мҲҳм—ј к№ҺмқҢ); нҳё 1:2(мқҢлһҖн•ң м—¬мқё кі л©ңкіј кІ°нҳј)]лҸ„ мһҲм—ҲлӢӨ. мқҙмІҳлҹј кө¬м•Ҫ кё°лЎқ мҙҲкё°л¶Җн„° кё°лЎқ мҷ„м„ұк№Ңм§Җ н•ҳлӮҳлӢҳмқҖ к·ё мӢңлҢҖмқҳ м§Җл°°м Ғ л¬ён•ҷ мһҘлҘҙлӮҳ л¬ёмІҙлҘј 비лЎҜн•ң мҲҳмӮ¬н•ҷк№Ңм§Җ вҖҳмІ м Җн•ҳкІҢ кҙҖлҰ¬н•ҳл©ҙм„ңвҖҷ л§җм”Җмқҳ мӢ м Ғ к¶Ңмң„лҘј мҷ„кІ°н•ҳмҳҖлӢӨ(кі„ 22:18-19)кі н• мҲҳ мһҲлӢӨ.
<лӢӨмқҢ нҳём—җ кі„мҶҚ>
<к°ҒмЈј>
1) Milton C. Fisher, вҖңмӢ м•Ҫмқҳ м •кІҪвҖқ, in The Origin of The Bible, ed. Philip W. Comfort, к№Җкҙ‘лӮЁ м—ӯ, гҖҺм„ұкІҪмқҳ кё°мӣҗгҖҸ, кі м–‘: м—”нҒ¬лҰ¬мҠӨлҸ„, 2010, 111 м°ёмЎ°.
2) Fisher, вҖңмӢ м•Ҫмқҳ м •кІҪвҖқ, 115.
3) Milton C. Fisher, вҖңм„ұкІҪ мӢңлҢҖмқҳ л¬ён—ҢвҖқ, in The Origin of The Bible, ed. Philip W. Comfort, к№Җкҙ‘лӮЁ м—ӯ, гҖҺм„ұкІҪмқҳ кё°мӣҗгҖҸ, кі м–‘: м—”нҒ¬лҰ¬мҠӨлҸ„, 2010, 156-159 м°ёмЎ°. Milton C. Fisher, вҖңм„ұкІҪ мӢңлҢҖмқҳ л¬ён—ҢвҖқ, in The Origin of The Bible, ed. Philip W. Comfort, к№Җкҙ‘лӮЁ м—ӯ, гҖҺм„ұкІҪмқҳ кё°мӣҗгҖҸ, кі м–‘: м—”нҒ¬лҰ¬мҠӨлҸ„, 2010, 156-159 м°ёмЎ°.
|
кёҖм“ҙмқҙ н”„лЎңн•„ кёҖм“ҙмқҙ : л°•нҷҚкё° л°•мӮ¬ (мЈјн•„ мІ н•ҷл°•мӮ¬ лҜёкөӯ мҳӨмқҙмҪ”мҠӨлҢҖн•ҷкөҗ көҗмҲҳ) мқҙл©”мқј : |
 м„ұкІҪмқҳ м ҲлҢҖ к¶Ңмң„мҷҖ м •кІҪ нҷ•м •мқҳ м„ӯлҰ¬ кіјм • (в…§) м„ұкІҪмқҳ м ҲлҢҖ к¶Ңмң„мҷҖ м •кІҪ нҷ•м •мқҳ м„ӯлҰ¬ кіјм • (в…§) |
 м„ұкІҪмқҳ м ҲлҢҖ к¶Ңмң„мҷҖ м •кІҪ нҷ•м •мқҳ м„ӯлҰ¬ кіјм • (в…Ҙ) м„ұкІҪмқҳ м ҲлҢҖ к¶Ңмң„мҷҖ м •кІҪ нҷ•м •мқҳ м„ӯлҰ¬ кіјм • (в…Ҙ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