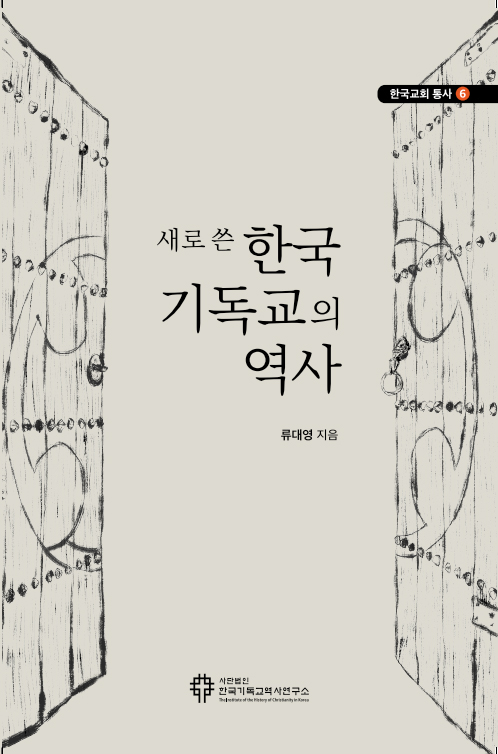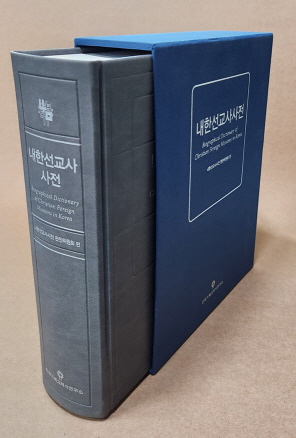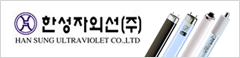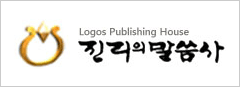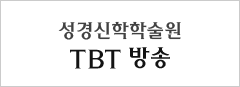мҳҲмҲңм—¬м„Ҝ: м„ң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л©ёл§қкіј к·ҖмЎұл“Өмқҳ көҗнҡҢ к¶Ңл Ҙнҷ”
м„ңлЎңл§Ҳ м ңкөӯмқҖ мЈјнӣ„ 408л…„ м„ңкі нҠёмЎұ(Visigoths)мқҳ мҷ• м•ҢлқјлҰ¬нҒ¬(Alaric, 370-410)м—җ мқҳн•ҙ м№ЁлһөлӢ№н•ңлӢӨ. лӢ№мӢң м ңкөӯмқҖ кё°к·јкіј м „м—јлі‘ к·ёлҰ¬кі лӮҙл¶Җ л°ҳлһҖкіј мҷ•көӯ л°°мӢ мһҗл“Өк№Ңм§Җ нҳјлҸҲ мғҒнҷ©мқҙм—ҲлӢӨ. мқҙ мҷҖмӨ‘м—җ м•ҢлқјлҰ¬нҒ¬лҠ” лЎңл§ҲлҘј кіөкІ©н•ҳмҳҖмңјл©° 410л…„ лЎңл§Ҳ м•ҪнғҲ(Sack of Rome)мқ„ мһҗн–үн•ҳкі к·ёлҰ¬кі л°©нҷ”н•ңлӢӨ. лІ л“ңлЎң лҢҖм„ұлӢ№кіј көҗнҡҢ мқјл¶Җл§Ң лӮЁм•ҳмңјл©° к·ҖмЎұл“Өмқҳ м Җнғқкіј кіөкіөкұҙл¬јл“ӨмқҖ м°ёнҳ№н•ҳкІҢ м•ҪнғҲлӢ№н–ҲлӢӨ. к·ёл•Ңк№Ңм§Җ лЎңл§ҲлҠ” 800л…„ лҸҷм•Ҳ мҷёл¶Җ м„ёл Ҙм—җкІҢ н•ЁлқҪлҗң м Ғмқҙ м—Ҷм—ҲлӢӨ. к·ёлһҳм„ң м„ңкі нҠёмЎұм—җ мқҳн•ң 410л…„ лЎңл§Ҳ м•ҪнғҲмқҖ вҖҳмҳҒмӣҗн•ң лЎңл§ҲвҖҷм—җ лҢҖн•ң нҷҳмғҒмқ„ л¬ҙл„ҲлңЁл ёмңјл©° мқҙлҠ”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лӘ°лқҪмқ„ к°ҖмҶҚнҷ”н•ңлӢӨ. к·ёлҹ°лҚ° мқҙл•Ң мӣҗлЎңмӣҗ нҡҢмӣҗмқ„ нҸ¬н•Ён•ң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л§ҺмқҖ к·ҖмЎұл“ӨмқҖ м•ҢлқјлҰ¬нҒ¬м—җкІҢ кіөл¬јмқ„ л°”м№ҳкё°лЎң м•ҪмҶҚн•ҳл©ҙм„ң кө° ліөл¬ҙлҘј л©ҙм ңл°ӣкі мғқлӘ…лҸ„ ліҙмһҘл°ӣлҠ”лӢӨ. к·ёлҹ°лҚ° мқҙ к·ҖмЎұл“Ө мғҒлӢ№мҲҳк°Җ к°ҖмһҘ м•Ҳм „н•ң мқҖмӢ мІҳлҘј м°ҫкІҢ лҗңлӢӨ. л°”лЎң мҲҳлҸ„мӣҗмқҙм—Ҳмңјл©° мқҙкіімқҖ мһҗмӢ л“Өмқҳ л¶ҖмҷҖ к¶Ңл Ҙмқ„ мң м§Җн•ҳкё°м—җ м•Ҳм„ұл§һм¶Өмқҙм—ҲлӢӨ. мқҙлҹ° мғҒнҷ©мқ„ л§ҘнҒҙлЎңнқҗлҠ” мқҙл ҮкІҢ м •лҰ¬н•ңлӢӨ. вҖңмқҙм „м—җ м ңкөӯмқҳ кіөл¬ҙлҘј лӢҙлӢ№н–Ҳкұ°лӮҳ к·ё м•Ҳм—җм„ң кіөл¶ҖлҘј мӢңмһ‘н–ҲлҚҳ лҠҘл Ҙ мһҲкі м •л Ҙм Ғмқё мӮ¬лһҢл“Өмқҙ мҠӨмҠӨлЎң м„ нғқн• мҲҳ мһҲлҠ” мқјмқҖ көҗнҡҢлЎң л“Өм–ҙк°ҖлҠ” кІғмқҙм—ҲлӢӨ.вҖқ мқҙлҹ¬н•ң л°°кІҪмқ„ кі л Өн• л•Ң лЎңл§Ҳ м ңкөӯ мҮ нҮҙкё°м—җ м Ғм–ҙлҸ„ лЎңл§Ҳ көҗнҡҢлҠ” вҖҳм„ұкІҪк¶Ңмң„вҖҷлҘј м§ҖнӮӨл©ҙм„ң м„ұкІҪ진лҰ¬мқҳ нҶ лҢҖ мң„м—җ м„ёмҡ°лҠ” мЈј мҳҲмҲҳ к·ёлҰ¬мҠӨлҸ„мқҳ лӘё лҗң мҲңмҲҳн•ң көҗнҡҢмҷҖлҠ” к·ё кұ°лҰ¬к°Җ мғҒлӢ№нһҲ л©ҖлӢӨкі н• мҲҳ мһҲлӢӨ.
к·ёлҹ°лҚ° мқҙлҹ¬н•ң 비м„ұкІҪм Ғ көҗнҡҢ нҷ•мһҘмқҖ м„ң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л©ёл§қ мқҙнӣ„м—җлҠ” лҚ” к°ҖмҶҚнҷ”н•ңлӢӨ. мЈјнӣ„ 476л…„ кІҢлҘҙл§Ң мҡ©лі‘ мҳӨнҶ м•„мјҖлҘҙ(433-493)лҠ” лЎңл§Ҳмқҳ л§Ҳм§Җл§ү нҷ©м ң лЎңл¬јлЈЁмҠӨ м•„мҡ°кө¬мҠӨнҲ¬мҠӨ(Romulus Augustulus, 475-476 мһ¬нӣ„)лҘј нҸҗмң„мӢңнӮӨкі м„ңлЎңл§Ҳ м ңкөӯмқ„ м—ӯмӮ¬ мҶҚмңјлЎң мӮ¬лқјм§ҖкІҢ н•ңлӢӨ. м„ң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л©ёл§қмқҖ кі лҢҖ к·ёлҰ¬мҠӨм—җ м—°мӣҗмқ„ л‘җкі мһҲлҠ” мң лҹҪ кі лҢҖмқҳ мў…л§җмқҙл©ҙм„ң лҳҗн•ң лҸҷмӢңм—җ мӨ‘м„ёмқҳ мӢңмһ‘мқҙлқјлҠ” м—ӯмӮ¬м Ғ мқҳлҜёлҘј к°–лҠ”лӢӨ. м„ң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л©ёл§қ нӣ„ м •м№ҳк¶Ңл Ҙмқ„ мғҒмӢӨн•ң л§ҺмқҖ к·ҖмЎұл“ӨмқҖ мһҗмӢ мқҳ м§Җмң„мҷҖ мһ¬мӮ°мқ„ мң м§Җн•ҳкё° мң„н•ҙ мҲҳлҸ„мӣҗмқ„ лҸ„н”јм„ұмңјлЎң нғқн•ңлӢӨ. лҸҷмӢңм—җ көҗнҡҢ к¶Ңл Ҙмқ„ мһҘм•…н•ҳл©ҙм„ң м„ң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мҳҒнҶ лҘј вҖҳмў…көҗм ҒмңјлЎңвҖҷ м§Җл°°н•ҳкё° мң„н•ң мғҲлЎңмҡҙ м§Җл°° кө¬мЎ°лҘј кұҙлҰҪн•ңлӢӨ. мҳҲлҘј л“Өл©ҙ мӣҗлЎңмӣҗ мқҳмӣҗмқҙм—ҲлҚҳ м№ҙмӢңмҳӨлҸ„лЈЁмҠӨ(Cassiodorus, 485-580)лҠ” м ңкөӯмқҳ л©ёл§қ нӣ„ мҲҳлҸ„мӣҗмңјлЎң л“Өм–ҙк°Җ н•ҷл¬ё нҷңлҸҷм—җ 집мӨ‘н•ҳл©ҙм„ң н–Ҙнӣ„ мӨ‘м„ё к°ҖнҶЁлҰӯ мӮ¬мғҒмқҳ нҶ лҢҖлҘј нҷ•лҰҪн•ңлӢӨ. к·ёлҠ” мһҗмӢ мқҳ мҳҒм§Җм—җ вҖҳ비바лҰ¬мӣҖ мҲҳлҸ„мӣҗ(Vivarium)вҖҷмқ„ м„ӨлҰҪн•ҳкі кі м „ л¬ён—Ңмқ„ м—°кө¬н•ҳкі н•„мӮ¬н•ҳлҠ” н•ҷл¬ём Ғ мӨ‘мӢ¬м§ҖлЎң л§Ңл“ лӢӨ. к·ёлҠ” м„ұкІҪ м—°кө¬мҷҖ кі м „ көҗмңЎмқ„ кІ°н•©н•ҳлҠ” н•ҷмҠө л°©мӢқмқ„ м ңмӢңн•ЁмңјлЎңмҚЁ мӨ‘м„ёмқҳ нҶ л§ҲмҠӨ м•„нҖҙлӮҳмҠӨмҷҖ к°ҷмқҖ н•ҷмһҗл“Өмқҳ мӮ¬мғҒм Ғ кё°л°ҳмқ„ л§Ҳл Ён•ҳкІҢ лҗңлӢӨ. к·ёлҠ” вҖҳмӢ н•ҷ мһ…л¬ём„ң(Institutiones Divinarum et Saecularium Litterarum)вҖҷлҘј м ҖмҲ н•ҳлҠ”лҚ° мқҙлҠ” мҲҳлҸ„мӮ¬л“Өмқ„ мң„н•ң н•ҷмҠөм„ңлЎң мӢ н•ҷкіј м„ёмҶҚ н•ҷл¬ёмқҳ мЎ°нҷ”лҘј к°•мЎ°н•ҳл©° м„ұкІҪ м—°кө¬мҷҖ кі м „ көҗмңЎмқҳ мӨ‘мҡ”м„ұмқ„ к°•мЎ°н–ҲлӢӨ. к·ёлҰ¬кі к·ём—җ мқҳн•ҙ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ҙ мҮ нҮҙн•ҳл©ҙм„ң мӮ¬лқјм§Ҳ мң„кё°м—җ мІҳн•ң л§ҺмқҖ кі м „ л¬ён—Ңмқ„ н•„мӮ¬н•ҳлҸ„лЎқ мһҘл Өн•ңлӢӨ. м—¬кё°м—җм„ңлҸ„ м•Ң мҲҳ мһҲл“Ҝмқҙ м„ңлЎңл§Ҳ м ңкөӯ л©ёл§қ мқҙнӣ„ м „к°ңлҗҳлҠ” м„ңмң лҹҪмқҳ кё°лҸ…көҗ мӮ¬мғҒ кі§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 мӮ¬мғҒмқҖ м•„лҰ¬мҠӨнҶ н…”л ҲмҠӨ, нӮӨмјҖлЎң л“ұмқҳ кі м „ мІ н•ҷкіј нҳјн•©лҗң мқёліёмЈјмқҳ мӮ¬мғҒмңјлЎң ліҖм§ҲлҗңлӢӨлҠ” м җмқҙлӢӨ. мқҙлҠ” мӨ‘м„ё мӢ н•ҷмқҙ мҷң м„ұкІҪк¶Ңмң„м—җм„ң м җм җ л©Җм–ҙм§ҖлҠ” м—ӯмӮ¬лҘј ліҙм—¬мЈјлҠ”м§Җ к·ё мӨ‘мҡ”н•ң мқҙмң лҘј мһҳ ліҙм—¬мӨҖлӢӨ. к·ёлҠ” м„ёмҶҚ нҶөм№ҳмһҗмҷҖ көҗнҡҢмқҳ мЎ°нҷ”лҘј к°•мЎ°н•ЁмңјлЎңмҚЁ нӣ„лҢҖ мӨ‘м„ё к°ҖнҶЁлҰӯ мӮ¬нҡҢмқҳ мҷ•к¶Ңкіј көҗк¶Ңмқҳ нҳ‘л Ҙ кҙҖкі„ лӘЁлҚёмқ„ нҳ•м„ұн•ҳлҠ” лҚ°лҸ„ нҒ¬кІҢ кё°м—¬н–ҲлӢӨ. мқҙлҠ” көҗнҡҢк°Җ 진лҰ¬мқҳ л§җм”ҖліҙлӢӨлҠ” м •м№ҳм Ғ к¶Ңл Ҙ мһҘм•…мқ„ лӘ©н‘ңлЎң мӮјлҠ” к·ём•јл§җлЎң м„ёмҶҚмЈјмқҳмқҳ м „нҳ•м Ғ лӘЁмҠөмқҙлӢӨ.
к·ёлҰ¬кі лЎңл§Ҳ к·ҖмЎұ к°Җл¬ё м¶ңмӢ мқё к·ёл Ҳкі лҰ¬мҡ°мҠӨ 1м„ё(Gregory I, 540-604)лҠ” мҲҳлҸ„мӣҗмһҘмқҙ лҗҳм—ҲлӢӨк°Җ нӣ„м—җ көҗнҷ©мңјлЎң мҰүмң„(590-604)н•ң мқёл¬јмқҙлӢӨ. к·ёлҠ” мӨ‘м„ё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қҳ кё°мҙҲлҘј лӢҰмқҖ көҗнҷ©мңјлЎң көҗнҷ©к¶Ң к°•нҷ”лҘј мЈјлҸ„н–ҲлӢӨлҠ” м№ӯмҶЎ(?)мқ„ л°ӣлҠ” мқёл¬јмқҙлӢӨ. нҷ©м ңлҘј м№ӯн•ҳлҠ” л°©мӢқмқё вҖҳк·ёл Ҳкі лҰ¬мҡ°мҠӨ лҢҖм ң(еӨ§еёқ, Gregory the Great)вҖҷлқјлҠ” м№ӯнҳёлҘј л°ӣмқҖ мөңмҙҲмқҳ көҗнҷ©мқҙл©° мӨ‘м„ё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қҳ н–үм •кіј м„ көҗ, мӢ н•ҷкіј мҳҲл°° л°©мӢқ л“ұм—җ кІ°м •м Ғ мҳҒн–Ҙмқ„ лҜём№ңлӢӨ. мқҙл ҮкІҢ м„ң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л©ёл§қкіј н•Ёк»ҳ лЎңл§Ҳ көҗнҡҢм—җм„ңлҠ” н•ҳлӮҳлӢҳ л§җм”Җмқҳ к¶Ңмң„к°Җ мӮ¬лқјм§Җл©ҙм„ң кё°лҸ…көҗлҘј к°ҖмһҘн•ң мқёк°„ к¶Ңл Ҙмқҙ м§Җл°°н•ҳлҠ” м•”нқ‘мқҳ мӢңлҢҖк°Җ мӨҖ비лҗҳкі мһҲм—ҲлӢӨкі н• мҲҳ мһҲлӢӨ. м„ұкІҪк¶Ңмң„лҘј көҗнҷ©к¶Ң(Papacy)мқҙ лҢҖмІҙн•ҳкі мһҲм—Ҳмңјл©°, вҖҳлЎңл§Ҳмқҳ мӢңмһҘ(Rector Romae)вҖҷмңјлЎң л¶ҲлҰҙ м •лҸ„лЎң м„ёмҶҚ к¶Ңл ҘлҸ„ л§үк°•н•ҙмЎҢлӢӨ. 6м„ёкё° л§җ м•„мҡ°кө¬мҠӨнӢ°лҲ„мҠӨ(Augustine of Canterbury)лҘј мҳҒкөӯм—җ нҢҢкІ¬н•ҙ м•өкёҖлЎңВ·мғүмҠЁмЎұмқ„ к°ҖнҶЁлҰӯмңјлЎң к°ңмў…мӢңнӮӨлҠ”к°Җ н•ҳл©ҙ, мј„нҠё мҷ•көӯмқҳ мҷ•кіј л°ұм„ұмқ„ к°ңмў…мӢңнӮӨкі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қҳ мҳҒкөӯ көӯкөҗнҷ”лҘј кҫҖн•ҳмҳҖлӢӨ. к·ёлҝҗ м•„лӢҲлқј м„ңмң лҹҪ кІҪкі„мқё м„ңкі нҠёмЎұ(Visigoths)кіј лЎ¬л°”лҘҙл“ңмЎұ(Lombards)мқҳ к°ңмў…мқ„ мҙү진н•ҳм—¬ көҗнҷ©мқҙ м§Җл°°н•ҳлҠ” м„ңмң лҹҪмқҳ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 мІҙм ңлҘј нҷ•лҰҪн•ңлӢӨ.
м„ұкІҪк¶Ңмң„м—җм„ңлҠ” м җм җ л©Җм–ҙм§Җл©ҙм„ң м„ң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мҲҳл§ҺмқҖ м •м№ҳ кҙҖлЈҢл“ӨмқҖ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қҙлқјлҠ” мў…көҗк¶Ңл Ҙмқ„ м ҲлҢҖнҷ”н•ЁмңјлЎңмҚЁ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м—ӯмӮ¬ліҙлӢӨ лҚ” кёҙ к¶Ңл Ҙмқҳ м—ӯмӮ¬лҘј л§Ңл“Өм–ҙк°Җкі мһҲм—ҲлӢӨ. м•һмқҳ көҗнҷ©мқҖ лЎңл§Ҳ к·ҖмЎұл“Өмқҳ мқҖмӢ мІҳмҳҖлҚҳ лІ л„Өл”•нҠё мҲҳлҸ„нҡҢ(Benedictine Order)мқҳ нҷ•мӮ°мқ„ м§Җмӣҗн•ҳл©ҙм„ң к·ёкіімқ„ н•ҷл¬ёкіј мӢ н•ҷ м—°кө¬мқҳ мӨ‘мӢ¬м§ҖлЎң л§Ңл“ лӢӨ. лҳҗн•ң к°ҖнҶЁлҰӯ мҳҲл°° мқҳмӢқмқ„ м •көҗнҷ”н•ҳкі к·ёл Ҳкі лҰ¬м•Ҳ м„ұк°Җ(Gregorian Chant)лҘј лҜёмӮ¬ мў…көҗ мқҢм•…мңјлЎң м •л№„н•ңлӢӨ. кё°к·јкіј м „м—јлі‘мқҙ л°ңмғқн–Ҳмқ„ л•Ң көҗнҷ©мқҖ лЎңл§Ҳ мӢңлҜјл“Өм—җкІҢ мӢқлҹүкіј мғқн•„н’Ҳмқ„ кіөкёүн•ҳлҠ” кө¬м ң мӮ¬м—…мқ„ 추진н•ҳлҠ”к°Җ н•ҳл©ҙ көҗнҡҢ мһ¬мӮ°мқ„ нҷңмҡ©н•ҳм—¬ л№ҲлҜјмқ„ лҸ•кі мӮ¬нҡҢм Ғ м•Ҳм •мқ„ кҫҖн•ҳмҳҖлӢӨ. гҖҺлӘ©нҡҢ к·ңлІ”(Regula Pastoralis)гҖҸмқ„ нҶөн•ҙ мӨ‘м„ё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 мӮ¬м ңл“Өмқҳ м§Ғл¬ҙмҷҖ м—ӯн• к·ёлҰ¬кі мңӨлҰ¬ к°•л №мқ„ м •лҰҪн•ҳм—¬ лӘ©нҡҢ м§Җм№Ём„ңлҘј л§Ңл“Өкі гҖҺлҢҖнҷ”집(DialoguesгҖҸм—җм„ңлҠ” м„ұмқё(иҒ–дәә)л“Өмқҳ кё°м Ғкіј мҳҒм Ғ кІҪн—ҳмқ„ кё°лЎқн•ҳм—¬ мӨ‘м„ё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қҳ мӢ 비주мқҳлҘј мЎ°мһҘ(еҠ©й•·)н•ҳкё°лҸ„ н–ҲлӢӨ.
к·ёлҹ°к°Җ н•ҳл©ҙ лЎңл§Ҳмқҳ к·ҖмЎұ м—¬м„ұл“ӨлҸ„ мҲҳлҸ„мӣҗм—җ мҳҒн–Ҙл Ҙмқ„ н–үмӮ¬н•ҳл©ҙм„ң мһҗмӢ л“Өмқҳ к¶Ңл Ҙмқ„ нҳ•м„ұн•ңлӢӨ. к·ҖмЎұ м¶ңмӢ мҲҳл…ҖмӣҗмһҘ(Abbess)л“ӨмқҖ мҲҳлҸ„мӣҗкіј мҲҳл…Җмӣҗмқ„ көҗмңЎкіј н–үм •мқҳ мӨ‘мӢ¬м§ҖлЎң кҙҖлҰ¬н•ҳл©ҙм„ң м§Җм—ӯ мӮ¬нҡҢм—җ мҳҒн–Ҙл Ҙмқ„ н–үмӮ¬н•ңлӢӨ. мқҙл ҮкІҢ көҗнҡҢмҷҖ мҲҳлҸ„мӣҗ, мҲҳл…ҖмӣҗмқҖ мӨ‘м„ё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 мӮ¬нҡҢм—җм„ң мғҲлЎңмҡҙ м •м№ҳВ·мӮ¬нҡҢм Ғ к¶Ңл ҘмңјлЎң м„ұмһҘн•ңлӢӨ. мқҙлҹ° м җм—җм„ң нҸҗл§қн•ң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Җ мқҙм ң вҖҳкөҗнҡҢвҖҷлқјлҠ” мІҙм ңлҘј нҶөн•ҙ лқјнӢҙ л¬ёнҷ”лҘј кі„мҠ№н•ҳкІҢ лҗңлӢӨ. к·ёлһҳм„ң көҗнҷ©кіј мЈјкөҗл“Ө к·ёлҰ¬кі мҲҳлҸ„мӣҗмһҘл“Өкіј мҲҳл…ҖмӣҗмһҘл“Өмқҙ лЎңл§Ҳмқҳ к·ҖмЎұ к°Җл¬ё м¶ңмӢ мқҙлқјлҠ” мӮ¬мӢӨмқҖ кІ°мҪ” мҡ°м—°мқҙ м•„лӢҲлӢӨ. 6м„ёкё° мқҙнӣ„ көҗнҷ©м§Ғ(Papacy)кіј мЈјкөҗм§Ғ(Bishopric)мқҖ к·ҖмЎұ к°Җл¬ёмқҙ лҸ…м җн•ңлӢӨ. л§ҘнҒҙлЎңнқҗлҠ” мқҙлҘј мқҙл ҮкІҢ м •лҰ¬н•ңлӢӨ. вҖңм„ңл°©мқҳ көҗнҡҢлІ•мқҖ 12м„ёкё°м—җ мІҙкі„нҷ”к°Җ лҗҳкё° мҳӨлһҳм „л¶Җн„° мқҙлҜё м„ңл°©мқҳ м§Җм Ғ м„ұм·Ёл¬јмқҳ н•ҳлӮҳмҳҖкі , м„ңл°© мӢ н•ҷмқҖ лқјнӢҙм–ҙмқҳ кҙҖлЈҢм Ғмқё м—„л°Җн•Ёмқ„ л°ҳмҳҒн•ҳлҠ” к№”лҒ”н•Ёмқ„ нҠ№м§•мңјлЎң н•ҳмҳҖ[лӢӨ.]вҖқ(494)
мқҙмІҳлҹј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қҖ м җм җ м„ұкІҪ진лҰ¬мҷҖлҠ” кұ°лҰ¬к°Җ лЁј мў…көҗ 집лӢЁмңјлЎң м „лқҪн•ңлӢӨ. көҗнҡҢлҠ” лӘ°лқҪн•ң лЎңл§Ҳ м ңкөӯ к·ҖмЎұл“Өмқҳ к¶Ңл Ҙ мң м§ҖлҘј мң„н•ң мў…көҗм Ғ вҖҳлҶҖмқҙн„°вҖҷк°Җ лҗҳм—ҲлӢӨкі н• мҲҳ мһҲлӢӨ. 476л…„ лЎңл§Ҳ л©ёл§қ мқҙнӣ„ мӣҗлЎңмӣҗ к°Җл¬ёмқҳ м Ҳл°ҳ мқҙмғҒмқҙ мҲҳлҸ„мӣҗкіј көҗнҡҢлЎң мқҙлҸҷн•ң кІғмңјлЎң м¶”м •н•ҳкё°лҸ„ н•ңлӢӨ. м—„кІ©н•ҳкІҢ л§җн•ҳл©ҙ л©ёл§қн•ң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ҙ мқҙм ңлҠ” мў…көҗ к¶Ңл Ҙмқ„ нҶөн•ҙ вҖҳн•ҳлҠҳлӮҳлқјвҖҷ кұҙм„ӨмқҙлқјлҠ” лӘ…лӘ©мқ„ л§Ңл“Өм–ҙ лҚ” к°•л Ҙн•ң м„ёмҶҚ м ңкөӯмқ„ л§Ңл“Өм–ҙ лҳҗлӢӨмӢң нғҖлқҪн•ң вҖҳмІңл…„мҷ•көӯвҖҷмқ„ мӨҖ비н•ҳкі мһҲм—ҲлӢӨ. мқҙлҹ° м җм—җм„ң мӨ‘м„ё кё°лҸ…көҗлҠ” ліём§Ҳм—җм„ң м„ұкІҪ진лҰ¬м—җ нҶ лҢҖлҘј л‘” кұҙм „н•ң көҗнҡҢк°Җ м•„лӢҲлқј к·ё нғңлҸҷл¶Җн„° кі лҢҖ к·ёлҰ¬мҠӨ л¬ёнҷ”мҷҖ лқјнӢҙ м „нҶөмқ„ кі„мҠ№н•ң мқҙл°© мў…көҗм—җ мӢ¬к°Ғн•ҳкІҢ мҳӨм—јлҗң мІҙм ңмҳҖлӢӨкі нҸүк°Җн• мҲҳ мһҲмқ„ кІғмқҙлӢӨ.
<270нҳём—җм„ң кі„мҶҚ>
 м—ӯмӮ¬ м„ңмҲ мқҳ лҸҷл Ҙ, мҳҲмҲ м Ғ 충лҸҷ
м—ӯмӮ¬ м„ңмҲ мқҳ лҸҷл Ҙ, мҳҲмҲ м Ғ 충лҸҷ м—ӯмӮ¬ н•ҙм„қмқҳ кіјмһүмңјлЎң мқён•ң м •мӢ м§Ҳнҷҳл“Өм—җ лҢҖн•ҙ
м—ӯмӮ¬ н•ҙм„қмқҳ кіјмһүмңјлЎң мқён•ң м •мӢ м§Ҳнҷҳл“Өм—җ лҢҖн•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