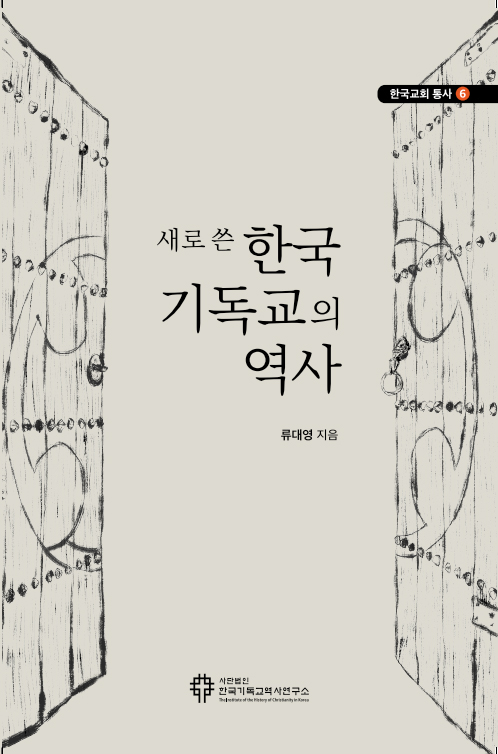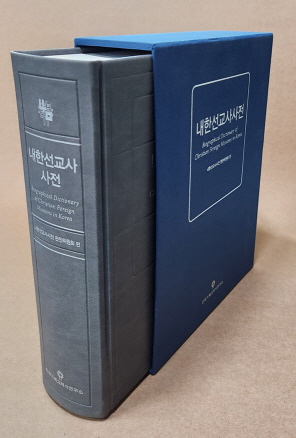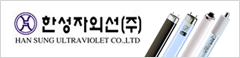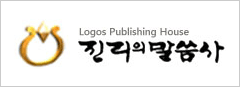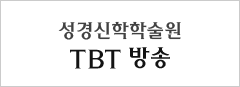мҳҲмҲңм•„нҷү:5-6м„ёкё° көҗлҰ¬мҷҖ мӢ мЎ°, к¶Ңл Ҙ мң м§Җмқҳ мҲҳлӢЁмңјлЎң м „лқҪ
м„ңл°© лқјнӢҙмӢ н•ҷ кі§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 мӮ¬мғҒмқҖ лЎңл§Ҳ м ңкөӯмЈјмқҳмқҳ мң мӮ°мқ„ л°”нғ•мңјлЎң мӮјкі мһҲмңјл©° к·ёлһҳм„ң вҖңлқјнӢҙм–ҙмқҳ кҙҖлЈҢм Ғмқё м—„л°Җн•Ёмқ„ л°ҳмҳҒвҖқн•ҳл©ҙм„ң лҸҷлЎңл§Ҳм ңкөӯкіј л§һм„ңлҠ” м—ӯмӮ¬лҘј м „к°ңн•ңлӢӨ. м„ңл°© лқјнӢҙ мӢ н•ҷмқҳ н•өмӢ¬мқҖ мӮјмң„мқјмІҙлЎ мқҙм—Ҳмңјл©° мқҙ мӢ н•ҷмқ„ нҶөн•ҙ м„ңлЎңл§Ҳм ңкөӯмқҳ мҳҒкҙ‘мқ„ мқҙм–ҙк°Җкі мһҗ н–ҲлӢӨ. м„ңл°© мӢ н•ҷмқҖ мҳҲмҲҳ к·ёлҰ¬мҠӨлҸ„лҠ” н•ҳлӮҳлӢҳмқҙ м°ҪмЎ°н•ң н”јмЎ°л¬јмқҙлқјкі мЈјмһҘн•ҳлҠ”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Ҙј мІ м ҖнһҲ л°°мІҷн•ҳл©ҙм„ң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Ҙј л”°лҘҙлҠ” м„ңкі нҠёмЎұ(мҠӨнҺҳмқё)кіј лҸҷкі нҠёмЎұ(лЎңл§Ҳ мҷёмқҳ мқҙнғҲлҰ¬м•„)мқ„ м„ңл°© лқјнӢҙмӢ н•ҷмңјлЎң к°ңмў…мӢңмј°мңјл©° мў…мҶҚкөӯмңјлЎң л§Ңл“Өм—ҲлӢӨ.
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Ҡ” кі нҠёмЎұмқҳ м •мІҙм„ұмқ„ к·ңм •н•ҳлҠ” мӮ¬мғҒмқҙм—ҲлӢӨ. кі нҠёмЎұмқ„ к°ңмў…мӢңнӮӨл©ҙм„ң м„ңл°©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қҖ мҪҳмҠӨнғ„нӢ°л…ён”Ңмқҳ лҸҷлЎңл§Ҳм ңкөӯм—җ л§һм„°лӢӨ.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Ҙј мІ м ҖнһҲ л°°кІ©н•ң кІғмқҖ мӢ н•ҷм Ғ м •мІҙм„ұмқ„ нҷ•м •н•ҳл ӨлҠ” кІғліҙлӢӨлҠ” 476л…„ л©ёл§қн•ң м„ңлЎңл§Ҳм ңкөӯмқҳ мҳҒкҙ‘мқ„ кё°лҸ…көҗлқјлҠ” мқҙлҰ„мңјлЎң лӢӨмӢң мһ¬нҳ„н•ҳкі мһҗ н•ҳлҠ” м •м№ҳм Ғ мқҳлҸ„к°Җ мһҗлҰ¬ мһЎкі мһҲм—ҲлӢӨ. м„ңлЎңл§Ҳм ңкөӯмқҳ нӣ„мҳҲл“ӨмқҖ м •м№ҳм Ғ м ңкөӯмЈјмқҳлқјлҠ” мҳ·мқ„ кё°лҸ…көҗ м ңкөӯмЈјмқҳлқјлҠ” мҳ·мңјлЎң л°”кҝ” мһ…м—ҲлҚҳ кІғмқҙлӢӨ. мӮјмң„мқјмІҙлЎ мқҖ 분лӘ… мӢ н•ҷ мқҙлЎ мІҳлҹј ліҙмқҙм§Җл§Ң к¶Ғк·№м ҒмңјлЎңлҠ” м„ңл°©мқ„ н•ҳлӮҳмқҳ мӮ¬мғҒмңјлЎң нҶөмқјн•ҳкё° мң„н•ң мҲҳлӢЁмңјлЎң нҷңмҡ©н•ңлӢӨ. 5-6м„ёкё° лҸҷлЎңл§Ҳм ңкөӯлҸ„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Ҙј л°°кІ©н•ң кІғмқҖ мӮ¬мӢӨмқҙм§Җл§Ң, мқҙкіімқҖ көҗлҰ¬мқҳ м •нҶөм„ұмқ„ нҷ©м ңк°Җ кіөмқҳнҡҢ(Ecumenical Council)лҘј к°ңмөңн•ҳм—¬ мһҗмӢ мқҙ кІ°м •н–ҲлӢӨлҠ” м җм—җм„ң мӢ н•ҷ мқҙлЎ мқҖ к·ё мһҗмІҙк°Җ мқҙлҜё м •м№ҳм Ғ к¶Ңл Ҙмқҳ лҸ„кө¬лЎң м „лқҪн•ҙ мһҲм—ҲлӢӨ. мқҙнӣ„ лІҢм–ҙм§ҖлҠ” лҸҷлЎңл§Ҳм ңкөӯмқҳ лҸҷл°©мӢ н•ҷкіј м„ңл°© лқјнӢҙмӢ н•ҷ(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)мқҳ лҢҖлҰҪкіј 분м—ҙмқҳ м—ӯмӮ¬лҠ” м„ұкІҪ 진лҰ¬мқҳ мҲңмҲҳн•Ёмқ„ нҷ•мқён•ҳкі кұҙм „н•ң мӢ н•ҷмқ„ мҲҳлҰҪн•ҳл ӨлҠ” кІғкіјлҠ” кұ°лҰ¬к°Җ лЁј кё°лҸ…көҗмқҳ м„ёмҶҚнҷ”мҷҖ нғҖлқҪмқҳ кіјм •мқҙм—ҲмқҢмқ„ м—ӯмӮ¬к°Җ мҰқм–ён•ҙ мӨҖлӢӨ.
м–ҙл–Ө мӢ мЎ°лҘј м„ұкІҪмқ„ нҶөн•ҙ нҷ•лҰҪн•ҳл ӨлҠ” кІғмқҖ м„ұкІҪмқ„ м ҲлҢҖ 진лҰ¬ н•ҳлӮҳлӢҳмқҳ л§җм”ҖмңјлЎң нҷ•м •н•ҳкі мһҗ н• л•Ң кұҙм „н•ң л°©н–Ҙмқҙ лҗңлӢӨ. н•ҳм§Җл§Ң м„ңл°©кіј лҸҷл°©мқҳ кё°лҸ…көҗлҠ” м •м№ҳм Ғ лӘ©м Ғмқ„ мң„н•ҙ м„ұкІҪ 진лҰ¬лҘј мҲҳлӢЁмңјлЎң мӮјлҠ”лӢӨ. к·ёлһҳм„ң мӢ н•ҷ мқҙлЎ м—җ лҢҖн•ҙ м„ұкІҪмқ„ к·јкұ°лЎң мқҙмқҳ м ңкё°лҘј н•ҳл©ҙ, мӢ н•ҷ мӮ¬мғҒмқҳ 진лҰ¬ м—¬л¶ҖлҘј л– лӮҳм„ң, м •м№ҳ м§ҖлҸ„мһҗ нҳ№мқҖ мў…көҗ м§ҖлҸ„мһҗмқҳ мқҙн•ҙкҙҖкі„м—җ л”°лқј вҖҳмқҙлӢЁвҖҷкіј вҖҳм •нҶөвҖҷмқҙ кІ°м •лҗңлӢӨ. мқҙлҘёл°” мӢ н•ҷм Ғ л…јмҹҒмқҙлһҖ кІғмқҖ м„ұкІҪ 진лҰ¬м—җ л°”нғ•мқ„ л‘” мҲңмҲҳн•ң 진лҰ¬к°Җ л¬ҙм—Үмқём§ҖлҘј нҷ•мқён•ҳл ӨлҠ” кІғмқҙ м•„лӢҲлқј к¶Ңл Ҙмһҗл“Өм—җкІҢ л¬ҙм—Үмқҙ мң лҰ¬н•ңм§ҖлҘј кіЁлқјлӮҙлҠ” кіјм •мңјлЎң нқҳлҹ¬к°„лӢӨ. к·ёлһҳм„ң вҖҳмў…көҗ мһ¬нҢҗвҖҷмқҖ 진лҰ¬лҘј л№ҷмһҗн•ҙ м •м Ғ(ж”ҝж•ө)мқ„ нғ„м••н•ҳкұ°лӮҳ м ңкұ°н•ҳлҠ” кІғмңјлЎң м•…лӘ…мқҙ лҶ’лӢӨ. мқҙлҹ¬н•ң нғҖлқҪн•ң кё°лҸ…көҗмқҳ к°ҖмһҘ кө¬мІҙм Ғ мғҒ징мқё мў…көҗ мһ¬нҢҗмқҳ м—ӯмӮ¬к°Җ лҸҷл°©мӢ н•ҷкіј м„ңл°©мӢ н•ҷмқҳ м—ӯмӮ¬мҷҖ н•Ёк»ҳ н–Ҳмңјл©° м§ҖкёҲлҸ„ мқҙм–ҙ진лӢӨ. мӢ н•ҷмқ„ л№ҷмһҗн•ҙ мһҗкё° к¶Ңл Ҙкіј мҳҒмҳҲмҷҖ л¶ҖлҘј мң м§Җн•ҳкі мһҗ н•ҳлҠ” к·ё м ңкөӯл“Өмқҳ мҲҳл§ҺмқҖ нӣ„мҳҲлҠ” м§ҖкёҲлҸ„ лҸҷмқјн•ң л¶ҲмқҳлҘј л°ҳліөн•ңлӢӨ.
лӢ№мӢң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Ҙј мӢ лҙүн•ң кі нҠёмЎұмқҖ лӢҲмјҖм•„ мӢ мЎ°лҘј л”°лҘҙлҠ” лЎңл§Ҳ м ңкөӯ көҗнҡҢмқҳ көҗлҰ¬мҷҖ мқҳлҸ„м ҒмңјлЎң м°Ёлі„нҷ”н•ҳл©ҙм„ң мў…көҗм Ғ м •мІҙм„ұмқ„ нҷ•ліҙн•ҳкі мһҗ н–ҲлӢӨ. мқҙлҠ”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мҳҒн–Ҙл Ҙ м•„лһҳ мў…мҶҚлҗҳм§Җ м•ҠкІ лӢӨлҠ” м •м№ҳм Ғ лӘ©м Ғмқ„ нҷ•кі н•ҳкІҢ н–ҲлӢӨ. лӮҳм•„к°Җ кІҢлҘҙл§Ң лҜјмЎұмқ„ лӮҙл¶Җм ҒмңјлЎң нҶөн•©н•ҳкё° мң„н•ң мҲҳлӢЁмқҙкё°лҸ„ н–Ҳмңјл©°,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Ҡ” мқҙлЎ м ҒмңјлЎң м„ӨлӘ…н•ҳкё° м–ҙл Өмҡҙ лЎңл§ҲмӢқ мӮјмң„мқјмІҙлЎ ліҙлӢӨ мүҪкі лӢЁмҲңн–Ҳмңјл©° к·ёлһҳм„ң лҚ” мүҪкІҢ көҗлҰ¬ м„ӨлӘ…мқ„ н•ЁмңјлЎңмҚЁ м„ көҗлҘј нҶөн•ҙ көӯк°Җм Ғ нҶөн•©мқ„ мқҙлЈ©н•ҳкё°м—җлҸ„ нӣЁм”¬ нҡЁкіјм Ғмқҙм—ҲлӢӨ. кі нҠёмЎұмқ„ нҸ¬н•Ён•ң м—¬лҹ¬ кІҢлҘҙл§Ң л¶ҖмЎұмқҙ кіөнҶөлҗң мӢ н•ҷ мӮ¬мғҒмңјлЎң нҶөмқјлҗң мў…көҗ мІҙкі„лҘј кё°л°ҳмңјлЎң көӯк°ҖлҘј мң м§Җн•ҳлҠ” мӢңлҸ„лҠ” мқҙнӣ„ м„ңл°©мқҳ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кіј лҸҷл°©мқҳ м ңкөӯкөҗнҡҢк°Җ мҷң к°Ғк°Ғмқҳ мӢ н•ҷ мқҙлЎ м—җ лӘ°л‘җн•ҳл Өкі н–ҲлҠ”м§Җ к·ё мқҙмң лҘј 분лӘ…н•ҳкІҢ м„ӨлӘ…н•ҙ мӨҖлӢӨ. мҲҳл§ҺмқҖ лӢӨмҲҳмқҳ л¶ҖмЎұмқ„ м •м№ҳм ҒмңјлЎң нҶөн•©н•ҳлҠ” кІғмқҖ кІ°мҪ” мүҪм§Җ м•ҠлӢӨ. лӢӨлҘё лҜјмЎұмқ„ м •ліөн•ҳкі мһҗ н”јлҘј нқҳл Өм•ј н• л•Ң нҸӯм••кіј мӮҙмғҒмқ„ мӢ мқҳ мқҙлҰ„мңјлЎң мһҗмӢ мқҳ м•…н–үмқ„ м •лӢ№нҷ”н•ңлӢӨ. мқҙл ҮкІҢ 380л…„ лЎңл§Ҳмқҳ көӯкөҗк°Җ кё°лҸ…көҗк°Җ лҗҳкі , 476л…„ м„ңлЎңл§Ҳм ңкөӯмқҙ л§қн•ң нӣ„,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мҳӣ мҳҒнҷ”лҘј лӢӨмӢң ліөкө¬н•ҳл ӨлҠ” к¶Ңл Ҙмһҗл“ӨмқҖ көӯкөҗк°Җ лҗң кё°лҸ…көҗлҘј мІ м ҖнһҲ м •ліөкіј м§Җл°°мқҳ мҲҳлӢЁмңјлЎң лӮЁмҡ©н•ҳкІҢ лҗҳм—ҲлӢӨ.
к°Җл № кІҢлҘҙл§Ң лҜјмЎұмқҳ мқјнҢҢмҳҖлҚҳ лЎ¬л°”лҘҙл“ңмЎұ(Lombards)мқҳ кІҪмҡ° мқҙл“ӨмқҖ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Ҙј нҶөн•ҙ көӯк°ҖлҘј кұҙлҰҪн•ҳкі мҡҙмҳҒн–ҲлҚҳ лҢҖн‘ңм Ғ мӮ¬лЎҖмқҙл©° кІ°көӯ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ңјлЎң к°ңмў…н•ҳм—¬ лҜјмЎұмқҳ лӘ…л§Ҙмқ„ мқҙм–ҙк°„ лҢҖн‘ңм Ғ мӮ¬лЎҖк°Җ лҗңлӢӨ. л¶Ғмң лҹҪ(мҠӨм№ёл””лӮҳ비아 лҳҗлҠ” м—ҳлІ к°• н•ҳлҘҳ) м§Җм—ӯм—җм„ң л°ңмӣҗн•ң кІғмңјлЎң ліҙмқҙлҠ” мқҙл“ӨмқҖ н—қк°ҖлҰ¬ м§Җм—ӯмқ„ кІҪмң н•ҳкі 6м„ёкё° л§җ мқҙнғҲлҰ¬м•„ л¶Ғл¶Җм—җ м •м°©н•ңлӢӨ.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Ҙј көӯк°Җ мІҙм ңлҘј мң м§Җн•ҳкё° мң„н•ң мӮ¬мғҒмңјлЎң мҲҳмҡ©н•ң мқҙл“ӨмқҖ 568л…„ л¶ҒмқҙнғҲлҰ¬м•„лҘј м№Ёмһ…н•ҳм—¬ к·ёкіім—җ м •м°©н•ҳл©ҙм„ң көӯк°ҖлҘј мҲҳлҰҪн•ңлӢӨ. лӢ№м—°нһҲ мӮјмң„мқјмІҙлЎ мқ„ мЈјмһҘн•ҳлҠ”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 м„ёл Ҙ(көҗнҷ©мІӯ)кіј лҢҖлҰҪн• мҲҳл°–м—җ м—Ҷм—ҲлӢӨ. н•ҳм§Җл§Ң 7м„ёкё° мӨ‘л°ҳ, лЎ¬л°”лҘҙл“ң мҷ• м•„лҰ¬нҺҳлҘҙнҠё 1м„ё(Aripert I)мҷҖ к·ё нӣ„кі„мһҗл“ӨмқҖ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Ҙј лІ„лҰ¬кі лӢҲмјҖм•„ мӢ мЎ°м—җ кё°л°ҳн•ң мӮјмң„мқјмІҙлЎ мқ„ мӢ лҙүн•ҳлҠ”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ңјлЎң к°ңмў…н•ңлӢӨ. л¶ҒмқҙнғҲлҰ¬м•„лҘј м җл №н–ҲлӢӨкі н•ҳм§Җл§Ң л¶ҒмқҙнғҲлҰ¬м•„ м§Җм—ӯмқҖ мқҙлҜё мҳӨлһҳм „л¶Җн„°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қ„ мӢ лҙүн•ҳкі мһҲм—Ҳкё° л•Ңл¬ём—җ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ЎңлҠ” нҶөм№ҳк°Җ мҡ©мқҙн•ҳм§Җ м•Ҡм•ҳлӢӨ. мў…көҗм Ғ мқҙл…җмқҳ 충лҸҢмқҖ көӯк°Җ нҶөмқјмқ„ м Җн•ҙн•ҳлҠ” мҡ”мқёмқҙ лҗҳм—Ҳмңјл©° м§Җл°° кі„мёөкіј н”јм§Җл°° кі„мёө к°„мқҳ мў…көҗм Ғ 분м—ҙмқҳ мӣҗмқёмқҙ лҗҳм—ҲлӢӨ. мқҙлҹ¬н•ң м •м№ҳм Ғ мқҙмң лЎң лӮҙл¶Җ лҜјмӢ¬мқ„ м•Ҳм •мӢңнӮӨкё° мң„н•ҙм„ң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Ҙј лІ„лҰ¬кі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қҳ мӮјмң„мқјмІҙлЎ мңјлЎң к°ңмў…н•ҳкІҢ лҗҳм—ҲлӢӨ. мқҙлҹ¬н•ң м •м№ҳм Ғ кіјм •м—җм„ң кё°лҸ…көҗ мӢ м•ҷмқҖ м„ёмҶҚм Ғ мҡ•л§қкіј к¶Ңл Ҙ м§Җл°°мқҳ мҲҳлӢЁмңјлЎң м „лқҪн•ҳкІҢ лҗңлӢӨ. лЎ¬л°”лҘҙл“ңмЎұ нҷҖлЎң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Ҙј кі м§‘н•ңлӢӨлҠ” кІғмқҙ мқҙнғҲлҰ¬м•„ м§Җм—ӯм—җм„ң мҠӨмҠӨлЎң кі лҰҪлҗ мң„н—ҳмқ„ мһҗмҙҲн•ҳлҠ” кІғмқҙм—ҲлӢӨ. м җм җ к·ё м„ёл Ҙмқ„ нҷ•мһҘн•ҳкі мһҲм—ҲлҚҳ көҗнҷ©кіј л¶Ҳнҷ”лҘј м•јкё°н•ҳлҠ” кІғмқҖ көӯк°Җмқҳ мһҘлһҳлҘј мң„нҳ‘н•ҳлҠ” кІғкіј л§Ҳм°¬к°Җм§ҖмҳҖлӢӨ. к·ёлһҳм„ң м„ңмң лҹҪ кіікіім—җм„ң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Ҙј л”°лҘҙлҚҳ лҜјмЎұл“ӨмқҖ кІ°көӯ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ңјлЎң к°ңмў…н•ңлӢӨ. лҸҷкі нҠёмЎұкіј м„ңкі нҠёмЎұ, лЎ¬л°”лҘҙл“ңмЎұкіј л¶ҖлҘҙкө°нҠёмЎұ к·ёлҰ¬кі л°ҳлӢ¬мЎұ л“ұлҸ„ лӘЁл‘җ к°ңмў…н–ҲлӢӨ. мқҙл ҮкІҢ м •м№ҳк¶Ңл Ҙмһҗл“Өмқҳ мқҙн•ҙкҙҖкі„м—җ л”°лқј мў…көҗм Ғ мқҙл…җмқҖ м„ёмҶҚм Ғ мҡ•л§қмқҳ лҸ„кө¬лЎң м „лқҪн•ҙ лІ„лҰ°лӢӨ. мӮјмң„мқјмІҙлЎ мқҙл“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“ лӘЁл‘җ к¶Ңл Ҙ мҹҒнғҲкіј нҢЁк¶Ң мң м§Җмқҳ мҲҳлӢЁмқј лҝҗмқҙм—ҲлӢӨ. көҗлҰ¬ мһҗмІҙмқҳ 진лҰ¬м„ұмқ„ м•„л¬ҙлҰ¬ к°•мЎ°н•ҳлҚ”лқјлҸ„ мқҙлҜё м Ғм–ҙлҸ„ 5-6м„ёкё° мқҙнӣ„ лҸҷл°©мқҙл“ м„ңл°©мқҙл“ м„ұкІҪ 진лҰ¬м—җ кё°л°ҳмқ„ л‘” мҲңмҲҳн•ң 진лҰ¬лҠ” кұ°мқҳ мӮ¬лқјм§Җл©ҙм„ң мӨ‘м„ёлҠ” м җм җ вҖҳм•”нқ‘кё°(the Dark Ages)вҖҷк°Җ лҗҳм–ҙ к°”лӢӨ. м„ұкІҪмқҳ мҲңмҲҳн•ң 진лҰ¬лҘј л§ҢлӮ мҲҳ м—ҶлҠ” м•”нқ‘кё°, нҳ„мһ¬ н•ңкөӯ көҗнҡҢмҷҖ м„ёкі„ көҗнҡҢм—җм„ң м җм җ м–ҙл‘җмӣҖмқҖ нҷ•мӮ°н•ҳкі мһҲлӢӨ.
<276нҳём—җм„ң кі„мҶҚ>
 к·јлҢҖ м—ӯмӮ¬н•ҷмқҖ мӨ‘м„ё мӢ н•ҷмқҳ мһ¬нҸ¬мһҘмқҙлӢӨ!
к·јлҢҖ м—ӯмӮ¬н•ҷмқҖ мӨ‘м„ё мӢ н•ҷмқҳ мһ¬нҸ¬мһҘмқҙлӢӨ! м—ӯмӮ¬мЈјмқҳлҠ” мҷң нҮҙнҸҗм Ғмқёк°Җ?
м—ӯмӮ¬мЈјмқҳлҠ” мҷң нҮҙнҸҗм Ғмқёк°Җ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