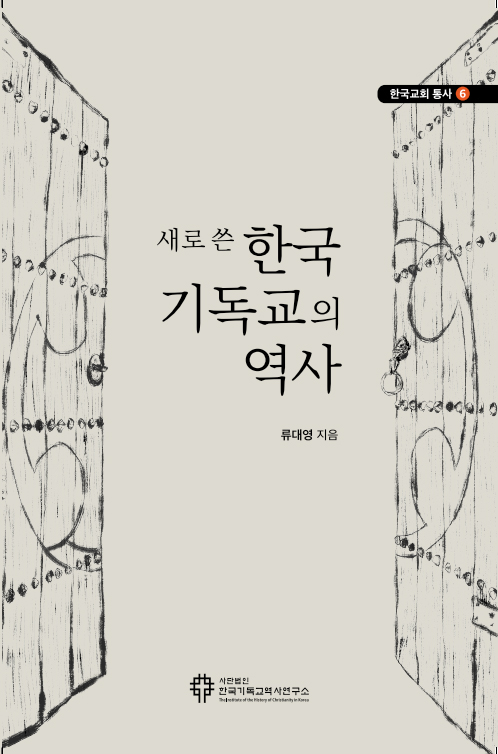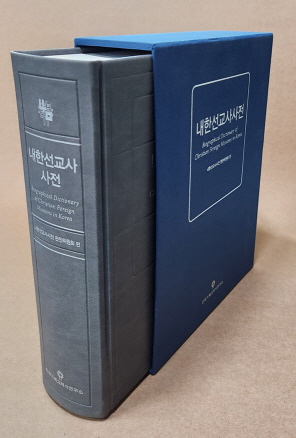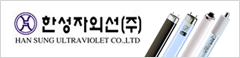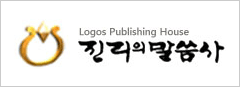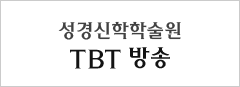мӢ н•ҷ
WirklichkeitлҠ” вҖҳнҳ„мӢӨ(зҸҫеҜҰ)вҖҷлЎң лІҲм—ӯ
м№ј л°”лҘҙнҠё м–ҙнңҳ нҢҢм•…н•ҳкё°(1)
м№ј л°”лҘҙнҠё(Karl Barth, 1886-1968)лҘј кіөл¶Җн• л•Ңм—җ вҖңкІҢмү¬нһҲн…Ң(Geschichte)мҷҖ нһҲмҠӨнҶ лҰ¬м—җ(Historie)вҖқм—җ л§ҺмқҖ 비мӨ‘мқ„ л‘җм—ҲлӢӨ. л°ҳнӢё л°•мӮ¬(Cornelius Van Til)мҷҖ л°”лҘҙнҠёмқҳ лҢҖнҷ”м—җм„ң кІҢмү¬нһҲн…Ңм—җ лҢҖн•ҙм„ң мҶҢнҶөмқҙ лҗҳм§Җ м•Ҡм•„ лӢЁм Ҳлҗҳкё°лҸ„ н–ҲлӢӨ. мқҙ л¶Җ분м—җм„ң кІҢмү¬нһҲн…ҢлҘј м§Ҳл¬ён•ҳлҠ” л°ҳнӢё л°•мӮ¬лҘј, л°”лҘҙнҠёк°Җ л¬ҙмӢңн–ҲлӢӨкі мғқк°Ғн•ңлӢӨ. кІ°көӯ л°ҳнӢё л°•мӮ¬лҠ” вҖҳм „м ңмЈјмқҳвҖҷлҘј кө¬м„ұн•ҳм—¬ л°”лҘҙнҠёмЈјмқҳм—җ лҢҖн•ҙм„ң 진мқ„ нҺјміӨлӢӨ. л°ҳнӢёмқҖ к°қкҙҖм Ғмқё 진лҰ¬м—җ кё°л°ҳмқ„ л‘җкі м§Ҳл¬ён–Ҳкі , л°”лҘҙнҠёлҠ” н•ҳлӮҳлӢҳмқҳ мһҗмң лЎңмҡҙ кі„мӢң мҷём—җлҠ” м–ҙл–Ө мқёк°„м Ғ кё°л°ҳлҸ„ мқём •н•ҳм§Җ м•Ҡм•ҳлӢӨ. л°ҳнӢё л°•мӮ¬мҷҖ л°”лҘҙнҠёлҠ” м „нҳҖ лӢӨлҘё кё°л°ҳм—җм„ң м„ңлЎң нҶ лЎ мқ„ нҺјміӨкё° л•Ңл¬ём—җ мқјм№ҳлҗ мҲҳ м—Ҷм—ҲлӢӨ. к·јлҢҖ мӢңлҢҖм—җлҠ” мң мӮ¬н•ң кё°л°ҳ мІҙкі„м—җ мһҲм—Ҳм§Җл§Ң, нҳ„лҢҖ мӢңлҢҖ(1900л…„лҢҖ)м—җлҠ” м „нҳҖ лӢӨлҘё кё°л°ҳ мң„м—җм„ң мӮ¬мң к°Җ 진н–үлҗҳлҠ” кө¬мЎ°к°Җ лҗҳм—ҲлӢӨ. к·ё нҳ„лҢҖ мӢңлҢҖмқҳ кё°лҸ…көҗ мӮ¬мң мІҙкі„мқҳ кё°мҙҲлҘј м„ёмҡҙ мң„мқёмқҙ м№ј л°”лҘҙнҠёмқҙлӢӨ. мІ н•ҷкі„м—җлҠ” н—ӨкІ”мқҳ вҖҳліҖмҰқлІ•вҖҷмқ„ л°”кҫј вҖңкі„лӘҪмқҳ ліҖмҰқлІ•(Dialektik der Aufklarung)вҖқмқҙ мӢңмһ‘лҗҳм—ҲлӢӨ. гҖҺкі„лӘҪмқҳ ліҖмҰқлІ•гҖҸмқҖ л§үмҠӨ нҳёлҘҙнҒ¬н•ҳмқҙлЁё(Max Horkheimer)мҷҖ н…ҢмҳӨлҸ„м–ҙ м•„лҸ„лҘҙл…ё(Theodor W. Adorno)к°Җ кіөлҸҷ 집필н–Ҳмңјл©°, м ң2м°Ё м„ёкі„лҢҖм „ мӨ‘мқё 1944л…„м—җ м¶ңнҢҗн–ҲлӢӨ. мқҙ мӮ¬мғҒм—җ лҢҖн•ҙм„ң мҶЎлӢӨлӢҲм—ҳмқҙ гҖҺнҳёнҒ¬н•ҳмқҙлЁёмҷҖ м•„лҸ„лҘҙл…ёмқҳ кі„лӘҪмқҳ ліҖмҰқлІ• н•ҙм„ӨгҖҸ(нҶ лёҢл¶ҒмҠӨ, 2022)мңјлЎң 비нҸүн–Ҳм§Җл§Ң лҢҖмӨ‘м—җкІҢ мүҪкІҢ нҢҢм•…лҗҳм§Җ лӘ»н•ңлӢӨ. лЁјм Җ вҖңкі„лӘҪмқҳ ліҖмҰқлІ•вҖқм—җ лҢҖн•ң мқёмӢқмқҙ л¶ҖмЎұн•ҳкё° л•Ңл¬ёмқҙлӢӨ. л„ӨмҳӨ л§ҲлҘҙнҒ¬мӢңмҰҳм—җ лҢҖн•ң кұ°л¶ҖмқҳмӢқмқҖ л§ҺмқҖлҚ°, л„ӨмҳӨ л§ҲлҘҙнҒ¬мӢңмҰҳмқҳ н•өмӢ¬ мҡ”мІҙ мӮ¬мғҒмқҙ вҖңкі„лӘҪмқҳ ліҖмҰқлІ•вҖқмқҙлқјлҠ” кІғмқ„ мһҳ м•Ңм§Җ лӘ»н•ҳкё° л•Ңл¬ёмқҙлӢӨ.
л°ҳнӢё л°•мӮ¬лҠ” м„ұкІҪ кі„мӢңлҘј лӘ…нҷ•н•ң 진лҰ¬лЎң ліҙм•ҳм§Җл§Ң, л°”лҘҙнҠёлҠ” м„ұкІҪм—җ л©”мқҙм§Җ м•ҠлҠ” мӢ н•ҷмқ„ кө¬мӮ¬н–ҲлӢӨ. л°ҳнӢёмқҳ м „м ңмЈјмқҳ ліҖмҰқн•ҷмқҖ м„ұкІҪмқ„ вҖҳн•ҳлӮҳлӢҳмқҳ лӘ…нҷ•н•ң 진мҲ (Propositional Revelation: м „м ңмЈјмқҳ)вҖҷлЎң ліҙм•ҳлӢӨ. мҰү, м„ұкІҪм—җ кё°лЎқлҗң лӘЁл“ лӮҙмҡ©мқҖ(м—ӯмӮ¬м Ғ мӮ¬мӢӨмқҙл“ көҗлҰ¬м Ғ 진лҰ¬л“ ) мҳӨлҘҳк°Җ м—Ҷмңјл©°, к°қкҙҖм Ғмқё 진лҰ¬мқҳ кё°л°ҳмқҙмһҗ м „м ңк°Җ лҗҳм–ҙм•ј н•ңлӢӨкі мЈјмһҘн–ҲлӢӨ. л°”лҘҙнҠёлҠ” м„ұкІҪмқ„ вҖҳкі„мӢңмқҳ мҰқмқё(Witness to Revelation)вҖҷмңјлЎң ліҙм•ҳлӢӨ. л°”лҘҙнҠём—җкІҢ н•ҳлӮҳлӢҳмқҳ л§җм”ҖмқҖ м„ұкІҪмұ… к·ё мһҗмІҙк°Җ м•„лӢҲлқј, м„ұкІҪмқ„ нҶөн•ҙ мқёк°„м—җкІҢ мЈјмІҙм ҒмңјлЎң мһ„н•ҳлҠ” мӮ¬кұҙмңјлЎң ліҙм•ҳлӢӨ. к·ё мӮ¬кұҙмқ„ 진лҰ¬(көҗлҰ¬)лЎң ліҙм•ҳлӢӨ. л°”лҘҙнҠёлҠ” көҗлҰ¬лҠ” л“Өл ӨмҳӨлҠ” мҶҢлҰ¬лҘј н•©лӢ№н•ҳкІҢ мқёмӢқн•ҳлҠ” кІғмңјлЎң к·ңм •н–ҲлӢӨ. л°”лҘҙнҠёлҠ” көҗмқҳн•ҷмқ„ мӢ м—җ кҙҖн•ң көҗнҡҢмқҳ л§җн•Ё(Rede von Gott, talk about God)м—җ лҢҖн•ң кё°лҸ… көҗнҡҢмқҳ мһҗкё° кІҖмҰқмңјлЎң к°ңл…җнҷ”н–ҲлӢӨ. мқҙлҹ¬н•ң л§җн•Ё(Rede, word)м—җм„ң 추кө¬лҗң мҳ¬л°”лҘё лӮҙмҡ©мқ„ көҗмқҳ(Dogma)лқјкі м№ӯн•ңлӢӨкі н–ҲлӢӨ(GG., 37). л°”лҘҙнҠём—җкІҢ көҗлҰ¬(Dogma)лҠ” кё°лЎқлҗң л§җм”Җм—җ мһҲлҠ” кІғмқҙ м•„лӢҲлқј, л§җн•Ё(Rede)м—җм„ң л°ңмғқн•ң мҳ¬л°”лҘё лӮҙмҡ©мқҙ лҗңлӢӨ. мҳ¬л°”лҘё к·ңлІ”мқҖ кё°лЎқмқҙлӮҳ к°қкҙҖмқҙ м•„лӢҢ к°ңмқёмқҳ мЈјкҙҖмңјлЎң л°°м •лҗҳкІҢ лҗңлӢӨ. мЈјкҙҖмқҙ м ҲлҢҖнҷ”лҗ мҲҳ м—Ҷкі , к°қкҙҖмқҖ мЎҙмһ¬н•ҳм§Җ м•ҠлҠ” мғҒнғңк°Җ лҗҳкё° л•Ңл¬ём—җ мғҒлҢҖмЈјмқҳмҷҖ м ҲлҢҖкҙҖмҡ© мӢңлҢҖк°Җ лҗңлӢӨ. к°қкҙҖмқ„ л§җн•ҳлҠ” кІғмқҖ м–өм••кіј нҳҗмҳӨк°Җ лҗңлӢӨ. м•„л¬ҙлҰ¬ м ҒмқҖ мҲ«мһҗмқјм§ҖлқјлҸ„ к°қкҙҖмқ„ л§җн•ҳл©ҙ нҸӯл Ҙмқҙ лҗңлӢӨ.
м°Ҫм„ёкё° м—җлҚҙлҸҷмӮ°м—җ лҢҖн•ң мқҙн•ҙлҠ” к·№м ҒмңјлЎң м°Ёмқҙк°Җ л°ңмғқн•ңлӢӨ. л°ҳнӢёмқҳ м—җлҚҙлҸҷмӮ° мқҙн•ҙлҠ” к°қкҙҖм Ғмқё м—ӯмӮ¬м Ғ мӮ¬мӢӨ(Historie)мқҙм§Җл§Ң, л°”лҘҙнҠём—җкІҢ м—җлҚҙлҸҷмӮ°мқҖ кө¬мӣҗлЎ м Ғ мӮ¬кұҙ(Geschichte)кіј мӢ нҷ”м Ғ м„ңмӮ¬(Saga, мӮ¬к°Җ)мқҙлӢӨ. вҖҳмӮ¬к°ҖвҖҷлһҖ мӢ нҷ”(Myth)мІҳлҹј лӢЁмҲңн•ң н—Ҳкө¬к°Җ м•„лӢҲлқј, м—ӯмӮ¬м Ғ нғҗкө¬(Historie)мқҳ мҳҒм—ӯмқ„ мҙҲмӣ”н•ҳм§Җл§Ң 진лҰ¬лҘј лӢҙкі мһҲлҠ” лҸ…нҠ№н•ң м„ңмӮ¬ нҳ•мӢқмқ„ мқҳлҜён•ңлӢӨ.
<м°ёкі > н•ңмў…нқ¬ л°•мӮ¬(92м„ё, 1931-2022)лҠ” м•Ҫ 45л…„к°„ м№ј л°”лҘҙнҠёмқҳ мӢ н•ҷмқ„ м—°кө¬н•ҳл©° м •нҶөмЈјмқҳ мӢ н•ҷмқҳ мһ…мһҘм—җм„ң мІ м Җн•ҳкІҢ 비нҢҗн•ҳкі л¶„м„қн–ҲлӢӨ. н•ңмў…нқ¬, гҖҺм •нҶөмЈјмқҳ мӢ н•ҷм—җм„ң ліё м№ј л°”лҘҙнҠё мӢ н•ҷгҖҸ(м„ңмҡё: лҢҖн•ңмҳҲмҲҳкөҗмһҘлЎңнҡҢмҙқнҡҢ, 2002).
вҖңкІҢмү¬нһҲн…Ң(Geschichte)мҷҖ нһҲмҠӨнҶ лҰ¬м—җ(Historie)вҖқлҘј мӮ¬мҡ©н•ҳлҠ” л°”лҘҙнҠёмқҳ мқҳлҸ„лҘј л°ҳнӢё л°•мӮ¬лҠ” лӘ…нҷ•н•ҳкІҢ нҢҢм•…н•ҳм§Җ лӘ»н–ҲлӢӨкі ліј мҲҳ мһҲлӢӨ. мҡ°лҰ¬ мӢ н•ҷкөҗм—җм„ңлҸ„ вҖңкІҢмү¬нһҲн…Ң(Geschichte)мҷҖ нһҲмҠӨнҶ лҰ¬м—җ(Historie)вҖқлҘј м–ёкёүн–Ҳмқ„ лҝҗ лӘ…лЈҢн•ҳкІҢ м„ӨлӘ…н•ҙмЈјм§Җ м•Ҡм•ҳлӢӨкі мғқк°Ғн•ңлӢӨ. мҡ°лҰ¬к°Җ кІҢмү¬нһҲн…Ңмқҳ м–ёлҚ•мқ„ л„ҳм§Җ лӘ»н•ҳкё° л•Ңл¬ём—җ, нҳ„лҢҖмӢ н•ҷмқҳ мӢңк°„кіј мӮ¬кұҙ мқҙн•ҙлҘј лӘ…лЈҢн•ҳкІҢ н•ҳм§Җ лӘ»н–ҲлӢӨ. мҡ°лҰ¬лҠ” 18-19м„ёкё° лҸ…мқј мІ н•ҷмһҗл“Өмқҳ мӮ¬мң мІҙкі„лҘј мүҪкІҢ л„ҳм§Җ лӘ»н•ҳкі мһҲлӢӨ. 80м—¬ л…„мқҳ лҢҖн•ңлҜјкөӯ мІ н•ҷкі„м—җм„ң мғҒлӢ№н•ң мқҙн•ҙк°Җ к°ң진лҗҳм–ҙ м—°кө¬л“Өмқҙ 진н–үлҗҳкі мһҲлӢӨкі мғқк°Ғн•ңлӢӨ. мқјліём–ҙ лІҲм—ӯмқ„ лӢөмҠөн•ҳлҚҳ мҲҳмӨҖм—җм„ң мғҒлӢ№нһҲ л°ңм „н•ҙм„ң мҡ°лҰ¬ мӮ¬мң мІҙкі„лЎң к·ёл“Өмқҳ мқҙн•ҙм—җ лҜём№ҳлҠ” мҲҳмӨҖмқҖ лҗҳм—ҲлӢӨкі мғқк°Ғн•ңлӢӨ. к·ёлҹ¬лӮҳ мӢ н•ҷкі„м—җм„ңлҠ” лӢөмҠөн•ҳлҠ” мҲҳмӨҖм—җ мһҲлӢӨ. к·ёкІғмқҖ к·ёл“Өмқҙ мӮ¬мҡ©н•ң м–ҙнңҳлҘј лӘ…нҷ•н•ҳкІҢ мқҙн•ҙн•ҳл ӨлҠ” нӣҲл Ёмқҙ м•Ҫн•ҳкё° л•Ңл¬ёмқҙлӢӨ. мІ н•ҷкі„лҠ” м–ҙнңҳ к°ңл…җмқ„ лӘ…нҷ•н•ҳкІҢ нҢҢм•…н•ҳл ӨлҠ” м—°кө¬мһҗл“Өмқҙ мһҲкі , к·ёл“Өмқҙ мЎҙмӨ‘л°ӣлҠ”лӢӨ. AIлҠ” вҖңHistorie(нһҲмҠӨнҶ лҰ¬м—җ), мһҗм—° кіјн•ҷм Ғ, кІҪн—ҳм Ғ, к°қкҙҖм Ғмқё мӢңк°„-кіөк°„ мҶҚмқҳ мӮ¬мӢӨмқ„ м—°кө¬н•ҳлҠ” м—ӯмӮ¬н•ҷм Ғ мҳҒм—ӯ. к·ёлҰ¬кі Geschichte(кІҢмү¬нһҲн…Ң), мӢ м•ҷмқ„ нҶөн•ҙ л°ӣм•„л“Өм—¬м§ҖлҠ” кө¬мҶҚмӮ¬м Ғ мӮ¬кұҙ, мҰү н•ҳлӮҳлӢҳмқҙ мқёк°„м—җкІҢ мЈјмІҙм ҒмңјлЎң н–үн•ҳмӢ мқҳлҜё мһҲлҠ” мӮ¬кұҙмқҳ мҳҒм—ӯвҖқмңјлЎң м ңмӢңн–ҲлӢӨ.
л°”лҘҙнҠёк°Җ вҖңкІҢмү¬нһҲн…Ң(Geschichte)мҷҖ нһҲмҠӨнҶ лҰ¬м—җ(Historie)вҖқлҘј мӮ¬мҡ©н•ҙм„ң мҡ°лҰ¬лҘј лӢ№нҷ©н•ҳкІҢ н–ҲлӢӨ. к·ёлҹ°лҚ° к·ёліҙлӢӨ лҚ” м–ҙл өкі мӨ‘мҡ”н•ң м–ҙнңҳк°Җ Wirklichkeit(비м–ҙнҒҙлҰ¬нһҲм№ҙнһҲнҠё)мқҙлӢӨ. мқҙ м–ҙнңҳлҘј мҳҒм–ҙлІҲм—ӯмһҗк°Җ RealityлЎң лІҲм—ӯн–ҲлҠ”лҚ°, Realityм—җ лҢҖмқ‘лҗҳлҠ” лҸ…мқјм–ҙлҠ” Realitat(лқјнӢҙм–ҙ Res)к°Җ мһҲлӢӨ. л°”лҘҙнҠёлҘј м—°кө¬н•ң м§Җ 20м—¬ л…„мқҙ лҗҳм–ҙк°Җкі мһҲлҠ”лҚ°, мқҙ н•ң лӢЁм–ҙ л•Ңл¬ём—җ кі мғқн–ҲлӢӨ. 분лӘ…н•ң кІғмқҖ RealityлЎң мҳҒм—ӯн•ң кІғмқҙ л§һм§Җ м•ҠлӢӨкі мғқк°Ғлҗң кІғмқҙм—ҲлӢӨ. мҡ°лҰ¬ лІҲм—ӯм—җлҠ” нҳ„мӢӨкіј нҳ„мӢӨм„ұмңјлЎң лІҲм—ӯн•ҳкі мһҲлҠ”лҚ°, нҳ„мӢӨ(зҸҫеҜҰ)мқҙлқјлҠ” к°ңл…җмқҙ лӘЁнҳён–ҲлӢӨ. Wirklichkeitк°Җ ActualityлЎң лІҲм—ӯлҗҳлҠ” кІғмқҙ мўӢкІҢ мғқк°Ғлҗҳм—ҲлӢӨ. RealityлҠ” мӢӨмһ¬(еҜҰеңЁ)мқҙкі , ActualityлҠ” мӢӨм ң(еҜҰйҡӣ)лЎң лІҲм—ӯлҗҳкё° л•Ңл¬ём—җ, н•„мһҗлҠ” WirklichkeitлҘј мӢӨм ң(еҜҰйҡӣ)лЎң лІҲм—ӯлҗҳм–ҙм•ј н•ңлӢӨкі мғқк°Ғн•ҳкі мһҲм—ҲлӢӨ. к·ёлҹ°лҚ° AIмқҳ кё°лҠҘмқҙ нҷңм„ұнҷ”лҗҳмһҗ Wirklichkeitм—җ лҢҖн•ҙм„ң AIмҷҖ лҢҖнҷ”лҘј мӢңлҸ„н–ҲлӢӨ.
к·ёлҹ°лҚ° Actualityм—җ лҢҖмқ‘лҗҳлҠ” лҸ…мқјм–ҙк°Җ Aktualitat(лқјнӢҙм–ҙ Actus)к°Җ мһҲм—ҲлӢӨ. Realityм—җ лҢҖмқ‘лҗҳлҠ” лҸ…мқјм–ҙлҠ” Realitat(лқјнӢҙм–ҙ Res)мқҙлӢӨ. к·ёлҹј WirklichkeitлҘј м–ҙл–»кІҢ мҳҒм–ҙлЎң лІҲм—ӯн•ҙм•ј н• к№Ң? вҖңлҸ…мқјм–ҙ **вҖңWirklichkeitвҖқ**лҘј мҳҒм–ҙлЎң лІҲм—ӯн• л•Ң к°ҖмһҘ мқјл°ҳм Ғмқё лІҲм—ӯмқҖ **вҖңrealityвҖқ**мһ…лӢҲлӢӨ. н•ҳм§Җл§Ң, мІ н•ҷм Ғ л§ҘлқҪмқҙлӮҳ лҜёл¬ҳн•ң мқҳлҜё м°ЁмқҙлҘј к°•мЎ°н•ҙм•ј н• л•ҢлҠ” **вҖңactualityвҖқ**к°Җ лҚ” м Ғм Ҳн• мҲҳ мһҲмҠөлӢҲлӢӨвҖқ(AI Gemini). AIлҠ” мӢӨмһ¬мҷҖ мӢӨм ңлҘј нҸ¬кҙ„н•ҳлҠ” м–ҙнңҳк°Җ вҖҳнҳ„мӢӨ(зҸҫеҜҰ)вҖҷмқҙлқјкі н•ңлӢӨ. 现实(мӨ‘), зҸҫ実(мқј)лҸ„ к°ҷмқҖ м–ҙнңҳлЎң лІҲм—ӯн•ҳлӢҲ, WirklichkeitлҠ” вҖҳнҳ„мӢӨ(зҸҫеҜҰ)вҖҷлЎң мқјм№ҳлҗң лІҲм—ӯн•ҳлҠ” кІғмқҙ мўӢкІ лӢӨ. мҡ°лҰ¬л§җ <көҗнҡҢкөҗмқҳн•ҷ> лІҲм—ӯмһҗл“ӨмқҖ вҖңнҳ„мӢӨ(зҸҫеҜҰ)кіј нҳ„мӢӨм„ұ(зҸҫеҜҰжҖ§)вҖқмңјлЎң лІҲм—ӯн•ҳкі мһҲлӢӨ.
вҖҳмӢӨмһ¬(еҜҰеңЁ)вҖҷмҷҖ вҖҳмӢӨм ң(еҜҰйҡӣ)вҖҷлҠ” к°қкҙҖм Ғ к°Җм№ҳ(Reality, Being)мҷҖ мЈјкҙҖм Ғ к°Җм№ҳ(Actuality, Experience)лЎң 분лҘҳн•ҳкі мӢ¶лӢӨ. мӢӨм ңлҠ” мқёмӢқн•ҳлҠ” мЈјмІҙк°Җ мқёмӢқн•ҳлҠ” кІғмқҙлӢӨ. к·ё мқёмӢқмқҙ мӢӨмһ¬мҷҖ мқјм№ҳн•ҳлҠ” кІғмқём§Җм—җ лҢҖн•ң л…јлһҖмқҖ кі лҢҖм—җм„ң нҳ„лҢҖк№Ңм§Җ лҒҠмһ„м—Ҷмқҙ мң м§Җлҗҳм—Ҳкі , нҳ„лҢҖм—җм„ңлҠ” кұ°мқҳ мқјм№ҳн•ҳм§Җ м•ҠлҠ”лӢӨкі н•©мқҳлҗҳкё° л•Ңл¬ём—җ, мЈјкҙҖнҷ”, мғҒлҢҖнҷ”к°Җ лҗҳм—ҲлӢӨ.
к·ёлҹ°лҚ° WirklichkeitлҠ” мӢӨмһ¬мҷҖ мӢӨм ңлҘј нҸ¬кҙ„н•ҳлҠ” м–ҙнңҳмқҙкё°м—җ кІ°мҪ” мүҪм§Җ м•ҠмқҖ к°ңл…җмқҙлӢӨ. WirklichkeitлҠ” лӢЁмҲңнһҲ мЎҙмһ¬н•ҳлҠ” кІғ(Realitat, мӢӨмһ¬)мқ„ л„ҳм–ҙм„ң мқҙл…җ(Idea)мқҙ мһ‘мҡ©(Wirken)н•ҳм—¬ мӢӨнҳ„лҗң мғҒнғңлҘј мқҳлҜён•ңлӢӨ. вҖҳнҳ„мӢӨвҖҷмқҙлқјлҠ” лІҲм—ӯм–ҙлҠ” мӢӨмһ¬мҷҖ мӢӨм ңмқҳ м—ӯлҸҷм Ғмқё нҶөн•©мқҙлӢӨ. мқҙ к°ңл…җмқ„ н—ӨкІ”мқҙ мІҙкі„нҷ”н–Ҳкі , л°”лҘҙнҠёк°Җ мұ„мҡ©н•ҳкі мһҲлҠ” кІғмқҙлӢӨ. к·ёлҹ°лҚ° л¬ём ңм җмқҖ м—ӯлҸҷм ҒмңјлЎң нҶөн•©лҗҳм—ҲлӢӨкі нҸүк°ҖлҘј н• мЈјмІҙк°Җ м—ҶлӢӨлҠ” кІғмқҙлӢӨ. н—ӨкІ”мқҖ вҖҳм ҲлҢҖм •мӢ вҖҷ, л°”лҘҙнҠёлҠ” вҖҳн•ҳлӮҳлӢҳвҖҷмқҙлқјкі н•ҳлҠ”лҚ°, кІ°көӯ нҢҗлӢЁн•ҳм§Җ л§җлқјлҠ” кІғмқҙ м •лӢөмқҙ лҗ кІғмқҙлӢӨ.
мҡ°лҰ¬лҠ” нҢҗлӢЁмқ„ к·ңлІ”м Ғ л¬ём„ңлҘј к·јкұ°н•ҙм„ң мҲҳн–үн•ҙм•ј н•ңлӢӨкі м ңм–ён•ңлӢӨ. мқҙмғҒм Ғмқҙкұ°лӮҳ н”јмғҒм Ғмқё к°ңл…җмқҖ мһҗкё° мЈјкҙҖмқ„ к°қкҙҖнҷ”мӢңнӮЁ лҸ…лӢЁмқҙлӢӨ. к·ё лҸ…лӢЁмқ„ кҙҖмҡ©н•ҳлҠ” кІғмқҖ мҳҲмғҒм№ҳ лӘ»н•ң нҸӯл Ҙм—җлҸ„ н•©лІ•м„ұмқ„ л¶Җм—¬н•ҳкІҢ лҗ кІғмқҙлӢӨ.
н•„мһҗлҠ” WirklichkeitлҘј лҜёкөӯм—җм„ң лІҲм—ӯн•ң Realityм—җ лҢҖн•ҙм„ң Actualityк°Җ мўӢкІ лӢӨлҠ” мғқк°Ғм—җ вҖҳмӢӨм ңвҖҷлЎң м ңм–ён–ҲлӢӨ. мһ‘мҡ©(Wirken)н•ҳм—¬ мӢӨнҳ„лҗң мғҒнғңмқҙкё° л•Ңл¬ём—җ к°ҖліҖм Ғмқҙкі мғқм„ұлҗҳлҠ” Actuality(мӢӨм ң)к°Җ мўӢкІ лӢӨкі мғқк°Ғн–ҲлӢӨ. к·ёлҹ°лҚ° WirklichkeitлҠ” мўҖ лҚ” ліөмһЎн•ҳкІҢ мӢӨмһ¬мҷҖ мӢӨм ңлҘј нҸ¬кҙ„н•ҳлҠ” к°ңл…җмқҙм—ҲлӢӨ. к·ёлһҳм„ң к·ё к°ңл…җм—җ н•©лӢ№н•ң м–ҙнңҳк°Җ вҖҳнҳ„мӢӨвҖҷмқҙлқјкі н•ҳлӢҲ, к·ё м–ҙнңҳлЎң мҲҳн–үлҗҳл©ҙ мўӢкІ лӢӨлҠ” мғқк°ҒмқҙлӢӨ. вҖҳнҳ„мӢӨ(зҸҫеҜҰ)вҖҷмқҖ вҖҳнҳ„мһ¬(зҸҫеңЁ)вҖҷмҷҖ лӢӨлҘё вҖңмӢӨм ң(еҜҰйҡӣ)к°Җ кө¬нҳ„лҗҳлҠ” мғҒнғң нҳ№мқҖ мғҒнҷ©вҖқмқҙлқјкі мқҙн•ҙн• мҲҳ мһҲкІ лӢӨ.
мӢӨмІҙ(мӢӨмһ¬)мҷҖ кІҪн—ҳлҗң мЈјкҙҖ(мӢӨм ң)мқ„ лӘЁл‘җ мқём •н•ҳлҠ” кІғмқҙм§Җл§Ң, мҲңм„ңлҸ„ мӨ‘мҡ”н•ҳлӢӨ. мҲңм„ңлҠ” мЈјкҙҖм Ғ кІҪн—ҳм—җ мқҳн•ҙм„ң мӢӨмІҙм—җ лҢҖн•ң мқёмӢқмқҙ к°ҖлҠҘн•ң кІғмқҙ нҳ„лҢҖмЈјмқҳмқҙлӢӨ. к·ёлҹ¬лӮҳ көҗнҡҢ м •нҶөнҢҢлҠ” 진лҰ¬мқҳ мӢӨмІҙм—җм„ң мЈјкҙҖм Ғ кІҪн—ҳмқҙ н—Ҳмҡ©лҗҳлҠ” кө¬лҸ„к°Җ лҗңлӢӨ. мқҙ мҲңм„ңлҠ” кІ°мҪ” к°ҖліҚм§Җ м•ҠлӢӨ. вҖңл§җкіј л§Ҳм°Ёмқҳ мҲңм„ңвҖқмқҙкё° л•Ңл¬ёмқҙлӢӨ.
|
кёҖм“ҙмқҙ н”„лЎңн•„ кёҖм“ҙмқҙ : кі кІҪнғң лӘ©мӮ¬ (мЈјлӢҳмқҳкөҗнҡҢ / нҳ•лһҢм„ңмӣҗ) мқҙл©”мқј : |
 нғҗкө¬лЎңм„ңмқҳ көҗмқҳн•ҷ(1) мқёмӢқмқҳ к°ҖлҠҘм„ұмқ„ м„ёмӣҖ нғҗкө¬лЎңм„ңмқҳ көҗмқҳн•ҷ(1) мқёмӢқмқҳ к°ҖлҠҘм„ұмқ„ м„ёмӣҖ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