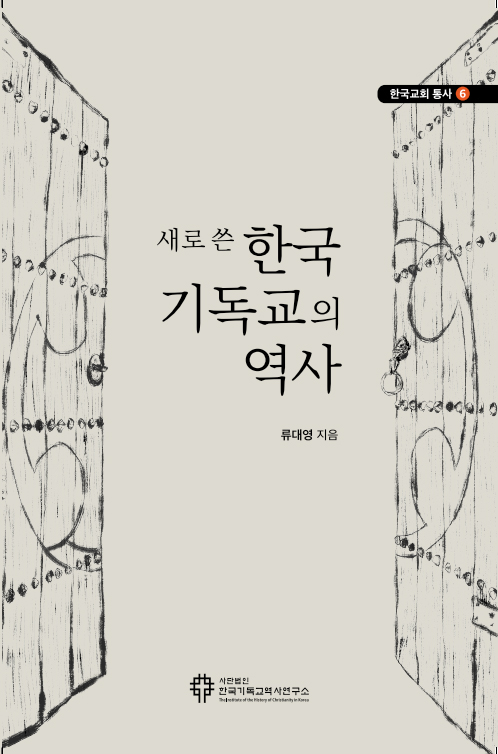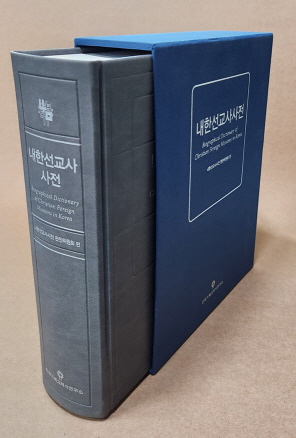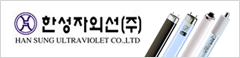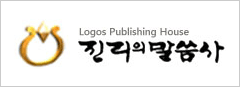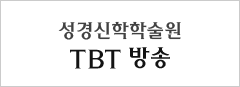мҳӨн”јлӢҲм–ё
м„ұкІҪмқҳ м ҲлҢҖ к¶Ңмң„мҷҖ ліёл¬ё нҺём§‘мқҳ м„ӯлҰ¬ кіјм • (в…Ө)
<м§ҖлӮң нҳём—җ мқҙм–ҙм„ң>
3. 70мқём—ӯкіј л¶Ҳк°ҖнғҖ, к°ңм—ӯм„ұкІҪмқҳ кө¬мЎ°мҷҖ м°Ёмқҙм җ
кө¬м•Ҫм„ұкІҪ н—¬лқјм–ҙ лІҲм—ӯ 70мқём—ӯ(Septuagint, LXX)мқҖ м ңлЎ¬(нһҲм—җлЎңлӢҲл¬ҙмҠӨ)мқҙ лқјнӢҙм–ҙлЎң лІҲм—ӯн–ҲлӢӨ. м ңлЎ¬мқҖ(м—җмҡ°м„ёл№„мҡ°мҠӨ мҶҢн”„лЎңлӢҲмҡ°мҠӨ нһҲм—җлЎңлӢҲл¬ҙмҠӨ, Eusebius Sophronius Hieronymus, м•Ҫ 347л…„-420л…„) нҳ„мһ¬ нҒ¬лЎңм•„нӢ°м•„мҷҖ мҠ¬лЎңлІ лӢҲм•„ көӯкІҪ л¶Җк·ј мҠӨнҠёлҰ¬лҸҲ(Stridon)м—җм„ң м¶ңмғқн–Ҳмңјл©° лЎңл§Ҳ, мҲҳлҰ¬м•„ м•Ҳл””мҳҘ, лІ л“Өл Ҳн—ҙ л“ұм—җм„ң нҷңлҸҷн–Ҳмңјл©° лІ л“Өл Ҳн—ҙм—җм„ң мӮ¬л§қн•ңлӢӨ. к·ёлҠ” мқҙм „ лқјнӢҙм–ҙ м„ұкІҪл“Өмқҙ 70мқём—ӯ(LXX)мқ„ кё°л°ҳмңјлЎң н•ң кІғкіј лӢ¬лҰ¬ нһҲлёҢлҰ¬м–ҙ мӣҗм „м—җм„ң м§Ғм ‘ лІҲм—ӯн–Ҳмңјл©° мӢ м•Ҫм„ұкІҪмқҖ кө¬(иҲҠ) лқјнӢҙм–ҙ м„ұкІҪ(Vetus Latina)мқ„ к°ңм •н•ҳлҠ” л°©мӢқмңјлЎң лІҲм—ӯн–ҲлӢӨ. к·ёлҰ¬кі вҖҳм ң2м •кІҪ(мҷёкІҪ)вҖҷмқҖ 70мқём—ӯм—җ 추к°Җн•ң мұ…л“ӨмқҖ мқём •н•ҳм§Җ м•Ҡм•ҳлӢӨ. н•ҳм§Җл§Ң көҗнҷ©кіј көҗнҡҢмқҳ мҡ”кө¬м—җ л”°лқј л¶Ҳк°ҖнғҖм—җ нҸ¬н•ЁмӢңмј°лӢӨ. к·ёлҠ” лҢҖлһө 23л…„(382~405л…„)м—җ кұёміҗ л¶Ҳк°ҖнғҖ м„ұкІҪмқ„ лІҲм—ӯн•ңлӢӨ. л¶Ҳк°ҖнғҖ лІҲм—ӯ м„ұкІҪмқҖ мқҙнӣ„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қҳ кіөмӢқ м„ұкІҪмқҙ лҗҳм—Ҳмңјл©° мў…көҗк°ңнҳҒ мқҙм „к№Ңм§Җ м„ңл°© көҗнҡҢмқҳ н‘ңмӨҖ м„ұкІҪ м—ӯн• мқ„ н–ҲлӢӨ. к·ёлҠ” 382л…„ көҗнҷ© лӢӨл§ҲмҲҳмҠӨ 1м„ё(Pope Damasus I)мқҳ мҡ”мІӯмңјлЎң лқјнӢҙм–ҙ м„ұкІҪ лІҲм—ӯмқ„ мӢңмһ‘н–ҲлӢӨ. лЁјм Җ кё°мЎҙ кө¬(иҲҠ) лқјнӢҙм–ҙ м„ұкІҪ(Vetus Latina)мқҳ мӮ¬ліёмқ„ мҲҳм •н•ҳлҠ” мһ‘м—…л¶Җн„° м°©мҲҳн–Ҳмңјл©° 385-389л…„м—җлҠ” лІ л“Өл Ҳн—ҙмңјлЎң мқҙмЈјн•ҙ нһҲлёҢлҰ¬м–ҙ мӣҗм „м—җм„ң м§Ғм ‘ кө¬м•Ҫмқ„ лІҲм—ӯн•ҳкё° мӢңмһ‘н•ңлӢӨ. 390-405л…„м—җ кө¬м•Ҫм„ұкІҪмқ„ нһҲлёҢлҰ¬м–ҙ мӣҗл¬ём—җм„ң лІҲм—ӯн•ҳм—¬ кё°мЎҙ 70мқём—ӯ(LXX) лІҲм—ӯкіј кө¬лі„лҗҳлҠ” лқјнӢҙм–ҙ м„ұкІҪ вҖҳл¶Ҳк°ҖнғҖ м„ұкІҪвҖҷмқ„ лӮҙлҶ“лҠ”лӢӨ.
вҖҳл¶Ҳк°ҖнғҖ(Vulgata)вҖҷлһҖ лқјнӢҙм–ҙлҠ” вҖҳл¶Ҳк°ҖнғҖ м—җл””м№ҳмҳӨ(Vulgata EditioвҖҷ)вҖҷлқјлҠ” н‘ңнҳ„м—җм„ң лӮҳмҷ”лӢӨ. л¶Ҳк°ҖнғҖ м–ҙмӣҗмқҖ нҳ•мҡ©мӮ¬ вҖҳvulgatusвҖҷмқҙл©° вҖҳлҢҖмӨ‘м Ғмқё, мқјл°ҳм ҒмңјлЎң мӮ¬мҡ©н•ҳлҠ”, нҶөмҡ©н•ҳлҠ”(common, popular)вҖҷмқҙлқјлҠ” лң»мқҙл©°, вҖҳEditioвҖҷлҠ” вҖҳнҢҗ, м¶ңнҢҗлҗң мұ…(edition)вҖҷмқ„ лң»н•ңлӢӨ. к·ёлһҳм„ң вҖҳVulgata EditioвҖҷлҠ” вҖҳнҶөмҡ©лҗҳлҠ” нҢҗ(common edition)вҖҷмқҙлһҖ лң»мқҙл©° мӨ„м—¬м„ң вҖҳл¶Ҳк°ҖнғҖ(Vulgata)вҖҷлқјкі н•ңлӢӨ. лқјнӢҙм–ҙ мӮ¬мҡ©мқҳ м„ңл°© көҗнҡҢм—җм„ң кіөмӢқм ҒмңјлЎң мӮ¬мҡ©н•ң м„ұкІҪмқҙл©° мў…көҗк°ңнҳҒ лӢ№мӢң 16м„ёкё° нҠёлҰ¬м—”нҠё кіөмқҳнҡҢ(1546л…„)м—җм„ң к°ҖнҶЁлҰӯмқҳ кіөмӢқ м„ұкІҪмңјлЎң м„ м–ён•ңлӢӨ. к·ёлҹ°лҚ° м ңлЎ¬мқҖ л¶Ҳк°ҖнғҖ лІҲм—ӯм—җм„ң 70мқём—ӯмқҳ мӢңк°Җм„ң к·ёлЈ№м—җм„ң вҖҳмҡҘкё°вҖҷлҘј мӢңнҺё м•һмңјлЎң л°°м№ҳн•ңлӢӨ. мқҙлҹ¬н•ң нҺём§‘ кө¬мЎ°лҠ” 16м„ёкё° мў…көҗк°ңнҳҒ мқҙнӣ„ л§ҲлҘҙнӢҙ лЈЁн„°лҘј нҸ¬н•Ён•ң к°ңмӢ көҗ мӢ н•ҷмһҗл“Өмқҙ л¶Ҳк°ҖнғҖмқҳ мҡҘкё°лҘј мӢңк°Җм„ң л§Ё м•һм—җ л‘җлҠ” л°©мӢқмқ„ л”°лһҗмңјл©°, лЈЁн„° м„ұкІҪкіј м ңл„Өл°” м„ұкІҪ л“ұ н–Ҙнӣ„ мқёмҮ„лҗҳлҠ” м„ұкІҪм—җм„ңлҸ„ мҡҘкё° л°°м№ҳ л°©мӢқмқҖ к·ёлҢҖлЎң м •м°©лҗңлӢӨ.
л¶Ҳк°ҖнғҖм—җм„ң м ңлЎ¬мқҖ мҡҘкё°лҘј мӢңк°Җм„ң к°ҖмһҘ м•һм—җ л°°м№ҳн•ҳлҠ”лҚ°, мқҙлҠ” к·ёк°Җ кө¬м•Ҫм„ұкІҪмқҳ лқјнӢҙм–ҙ лІҲм—ӯмқ„ 70мқём—ӯмқҙ м•„лӢҲлқј нһҲлёҢлҰ¬м–ҙ мӣҗл¬ёмқ„ мӮ¬мҡ©н•ң кІғкіј лҸҷмӢңм—җ 70мқём—ӯмқҳ ліёл¬ё л°°м№ҳ кө¬мЎ°лҘј лҸҷмӢңм—җ кі л Өн•ң кІ°кіјлӢӨ. к·ёлҠ” нһҲлёҢлҰ¬м–ҙ кө¬м•Ҫ ліёл¬ёкіј к·ё кө¬мЎ°м—җ л°”нғ•мқ„ л‘җкі лқјнӢҙм–ҙ лІҲм—ӯм—җ мһ„н–ҲлӢӨ. н•ҳм§Җл§Ң 70мқём—ӯмқҳ кө¬м•Ҫ м„ұкІҪ ліёл¬ё л°°м№ҳм—җлҸ„ мӨ‘мҡ”н•ң мқҳмқҳлҘј л‘җкі мһҲм—ҲлӢӨ. к·ёлһҳм„ң к·ёлҠ” кө¬м•Ҫм„ұкІҪ (м—ӯмӮ¬м Ғ, мӢ н•ҷм Ғ, л¬ён•ҷм Ғ) м „мІҙ мғҒнҷ©мқ„ кі л Өн•ҙ мҡҘкё°лҘј л§Ҳм№ҳ м„ңлЎ мІҳлҹј мӢңк°Җм„ң м ңмқј м•һм—җ л‘”лӢӨ. м ңлЎ¬мқҖ л¬ён—ҢмғҒ мҡҘкё°к°Җ к°ҖмһҘ мҳӨлһҳлҗң л¬ён—Ң мӨ‘ н•ҳлӮҳлЎң ліҙм•ҳлӢӨ. м Ғм–ҙлҸ„ мЎұмһҘмқё мҡҘмқҳ кІҪмҡ°лҠ” мЎұмһҘ мӢңлҢҖ(м•„лёҢлқјн•Ё мӢңлҢҖ) мқёл¬јмқј к°ҖлҠҘм„ұмңјлЎң нҸүк°Җн–ҲлӢӨ. к·ёлҰ¬кі мқҙлҠ” нһҲлёҢлҰ¬м–ҙ м„ұкІҪ(нғҖлӮҳнҒ¬)мқҳ мӢңк°Җм„ң(мјҖнҲ¬л№”)мқҳ мӢңнҺё м•һм—җ мҡҘкё°лҘј л°°м№ҳн•ЁмңјлЎңмҚЁ вҖҳмӢ н•ҷм Ғ мӨ‘мҡ”м„ұвҖҷмқ„ кі л Өн•ңлӢӨлҠ” мқҳлҸ„лҸ„ мһҲлӢӨ. к·ёмқҳ нҢҗлӢЁм—җ л”°лҘҙл©ҙ, мҡҘкё°лҠ” мқёк°„мқҳ кі лӮңкіј н•ҳлӮҳлӢҳмқҳ мқҳлЎңмҡ°мӢ¬м—җ лҢҖн•ң 진лҰ¬лҘј лӢӨлЈЁлҠ” м§Җнҳң л¬ён—Ңмһ„мқ„ к°•мЎ°н•ҳкі мҡҘкё°лҘј мӢңк°Җм„ңмқҳ мӢңмһ‘мңјлЎң л°°м№ҳн•ңлӢӨ. мқҙлҹ¬н•ң л°°м№ҳмқҳ ліҖнҷ”м—җм„ң м ңлЎ¬мқҖ нһҲлёҢлҰ¬м–ҙ мӣҗл¬ёмқҳ к¶Ңмң„мҷҖ к°Җм№ҳлҘј кі мҲҳн•ҳл ӨлҠ” мқҳм§Җ, лҸҷл°© көҗнҡҢмқҳ 70мқём—ӯкіј мқҳлҸ„м ҒмңјлЎң м°Ёлі„нҷ”н•ҳм—¬ м„ңл°© кё°лҸ…көҗ м „нҶө мҲҳлҰҪмқ„ кҫҖн–ҲлӢӨкі н• мҲҳ мһҲлӢӨ. вҖҳмӮҙм•ҳкі мҡҙлҸҷл Ҙ мһҲлҠ” н•ҳлӮҳлӢҳмқҳ л§җм”ҖвҖҷ(нһҲ 4:12)мқҳ к¶Ңмң„к°Җ лқјнӢҙм–ҙ лІҲм—ӯ м„ұкІҪ л¶Ҳк°ҖнғҖлҘј мЈјкҙҖн•ҳм…ЁлӢӨ!
лӮҳм•„к°Җ м ңлЎ¬мқҖ л¶Ҳк°ҖнғҖм—җм„ңлҠ” 70мқём—ӯкіј лӢӨлҘё лӘҮ к°Җм§Җ м°Ёмқҙм җмқ„ ліҙм—¬мЈјм—ҲлӢӨ. лЁјм Җ вҖҳмҷёкІҪ(еӨ–經, deute-rocanonica)вҖҷ м •лҰ¬ л°©мӢқм—җм„ң м°ЁмқҙлҘј ліҙмқёлӢӨ. м ңлЎ¬мқҖ вҖҳмҷёкІҪвҖҷмқ„ вҖҳкөҗнҡҢмқҳ мқҪмқ„кұ°лҰ¬вҖҷлЎң мқём •н•ҳм§Җл§Ң м •кІҪ(жӯЈз¶“)мқҖ м•„лӢҲлқјкі ліҙм•ҳлӢӨ. к·ёлҠ” нҶ л№—м„ң(мӣҗлһҳ нһҲлёҢлҰ¬м–ҙлЎң мһ‘м„ұн–Ҳм§Җл§Ң мӣҗліёмқҙ мӮ¬лқјм§җ), мң 딧м„ң, л§Ҳм№ҙ비 мғҒ, л§Ҳм№ҙ비 н•ҳ, м§Җнҳңм„ң, 집нҡҢм„ң, л°”лЈ©м„ң(мҳҲл ҲлҜём•јмқҳ нҺём§Җ нҸ¬н•Ё) 7к°ңлҘј мҷёкІҪмңјлЎң ліҙм•ҳлӢӨ. (лҸҷл°© м •көҗнҡҢлҠ” лҚ” л§ҺмқҖ м ң2м •кІҪмқ„ нҸ¬н•Ён•ңлӢӨ. м—җмҠӨл“ңлқј 1м„ң, л§Ҳм№ҙ비 3,4м„ң, мӢңнҺё 151нҺё) мқҙлҠ” лӘЁл‘җ 70мқём—ӯ лІҲм—ӯм—җ мӮ¬мҡ©н•ң н—¬лқјм–ҙ мұ…л“ӨмқҙлӢӨ. л¬јлЎ мң лҢҖмқё нһҲлёҢлҰ¬м–ҙ м„ұкІҪ лӘ©лЎқ(мңЁлІ•м„ң, мҳҲм–ём„ң, м„ұл¬ём„ң)м—җлҠ” нҸ¬н•Ёлҗҳм§Җ м•ҠлҠ”лӢӨ. м—ӯмӮ¬м ҒмңјлЎң ліҙл©ҙ көҗл¶Җ м•„мҡ°кө¬мҠӨнӢ°лҲ„мҠӨ(St. Augustine, 354~430)лҘј нҸ¬н•Ён•ң лӢ№мӢң көҗнҡҢмқҳ мЈјлҘҳ мӢ н•ҷмһҗл“ӨмқҖ 70мқём—ӯмқҳ м •кІҪ к¶Ңмң„лҘј мЈјмһҘн–ҲлӢӨ. 비лЎқ н—¬лқјм–ҙм—җ лҠҘнҶөн•ҳм§ҖлҠ” лӘ»н–Ҳм§Җл§Ң м•„мҡ°кө¬мҠӨнӢ°лҲ„мҠӨлҠ” 70мқём—ӯмқҖ лӢЁмҲңн•ң лІҲм—ӯмқҙ м•„лӢҲлқј н•ҳлӮҳлӢҳмқҳ м„ӯлҰ¬лҘј л”°лқј мқҙлЈЁм–ҙ진 мҳҒк°җ л°ӣмқҖ лІҲм—ӯмңјлЎң ліҙм•ҳмңјл©°, 70мқём—ӯмқҙ нһҲлёҢлҰ¬м–ҙ мӣҗліёкіј м°Ёмқҙк°Җ мһҲлҚ”лқјлҸ„, н•ҳлӮҳлӢҳмқҙ н—¬лқјм–ҙ лІҲм—ӯмһҗл“Өмқ„ нҶөн•ҙ мғҲлЎңмҡҙ кі„мӢңлҘј мЈјм…ЁлӢӨкі ліҙм•ҳлӢӨ. к·ёлҰ¬кі 70мқём—ӯмқҖ көҗнҡҢк°Җ мӮ¬мҡ©н• кіөмӢқ м •кІҪмқҙ лҗҳм–ҙм•ј н•ңлӢӨкі мЈјмһҘн–ҲлӢӨ. лӢ№мӢң м„ңл°© көҗнҡҢлҠ” м •кІҪмңјлЎң нһҲлёҢлҰ¬м–ҙ м„ұкІҪ(л§ҲмҶҢлқј ліёл¬ё)кіј 70мқём—ӯ м–ҙлҠҗ кІғмқ„ л”°лҘјм§Җ л…јмҹҒм—җ мһҲм—ҲлҠ”лҚ° м•„мҡ°кө¬мҠӨнӢ°лҲ„мҠӨлҠ” 70мқём—ӯмқ„ л”°лҘё лқјнӢҙм–ҙ м„ұкІҪмқҙ көҗнҡҢмқҳ кіөмӢқ м„ұкІҪмқҙ лҗҳм–ҙм•ј н•ңлӢӨкі мЈјмһҘн•ңлӢӨ. мқҙлҹ¬н•ң м•„мҡ°кө¬мҠӨнӢ°лҲ„мҠӨмқҳ м •кІҪкҙҖ(жӯЈз¶“и§Җ)мқҖ мҲҳкёҚн• мҲҳ м—ҶлӢӨ. мҷёкІҪмқ„ нҸ¬н•Ён•ң 70мқём—ӯм—җ лҢҖн•ҙ м •кІҪ кё°лЎқм—җ мһ„н•ң н•ҳлӮҳлӢҳмқҳ мҳҒк°җмқ„ лҸҷл“ұн•ң мҳҒк°җмңјлЎң м Ғмҡ©н•ң кІғмқҖ мҡ©лӮ©н• мҲҳ м—ҶлӢӨ. к·ёлҰ¬кі к·ё мҷёкІҪ нҸ¬н•Ёмқҳ 70мқём—ӯмқ„ көҗнҡҢк°Җ мӮ¬мҡ©н• кіөмӢқ м •кІҪмңјлЎң мЈјмһҘн•ң кІғмқҖ м„ұкІҪ к¶Ңмң„м—җ лҢҖн•ң лӘ…л°ұн•ң нӣјмҶҗмқҙлӢӨ. н•ҳм§Җл§Ң н•„мһҗлҠ” мқҙлҹ¬н•ң м •кІҪ нҷ•м •мқҳ кіјм •мқҙ нҠ№лі„кі„мӢң кё°лЎқмқё м„ұкІҪмқҳ мӣҗм ҖмһҗмқҙмӢ м—¬нҳёмҷҖ н•ҳлӮҳлӢҳмқҳ м—„кІ©н•ң м„ӯлҰ¬ м—ӯмӮ¬мһ„мқ„ ліҙм—¬мӨҖлӢӨкі ліёлӢӨ. лӢӨмӢң л§җн•ҙ м„ұкІҪ к¶Ңмң„мқҳ м—ӯмӮ¬лҠ” мӣҗм ҖмһҗмқҙмӢ н•ҳлӮҳлӢҳмқҳ мЈјк¶Ңм Ғ мӮ¬м—ӯмңјлЎң м „к°ңлҗңлӢӨлҠ” м җмқ„ лӢӨмӢң к°•мЎ°н•ңлӢӨ. мқҙлҹ¬н•ң мӮ¬лЎҖл“Өмқ„ кё°лҸ…көҗ м—ӯмӮ¬лҘј нҶөн•ҙ мӮҙнҺҙліҙкі мһҗ н•ңлӢӨ.
л¶Ҳк°ҖнғҖ лІҲм—ӯмһҗ м ңлЎ¬мқҖ ліёлһҳ м •кІҪм—җм„ң мҷёкІҪмқ„ л°°м ңн•ң мһҗмӢ мқҳ лІҲм—ӯмқҙ көҗнҡҢ м •кІҪмңјлЎң мұ„нғқлҗҳкё°лҘј мӣҗн–ҲлӢӨ. н•ҳм§Җл§Ң, л§Ңм•Ҫ мһҗмӢ мқҙ мҷёкІҪмқ„ нҸ¬н•Ён•ң 70мқём—ӯмқ„ м •кІҪмқҙ м•„лӢҲлқјкі л¶Җм •н•ңлӢӨл©ҙ лЎңл§Ҳ көҗнҡҢк°Җ мһҗмӢ мқҳ л¶Ҳк°ҖнғҖ лІҲм—ӯ мһҗмІҙлҘј л°ӣм•„л“Өмқҙм§Җ м•Ҡмқ„ кІғмңјлЎң нҢҗлӢЁн•ҙ кІ°көӯ мһҗмӢ мқҳ мқҳлҸ„мҷҖ лӢӨлҘҙкІҢ л¶Ҳк°ҖнғҖ лІҲм—ӯм—җ мҷёкІҪмқ„ нҸ¬н•Ён•ҳкІҢ лҗңлӢӨ. мҷёкІҪм—җ көҗлҰ¬м Ғ к¶Ңмң„лҘј л¶Җм—¬н• мҲҳ м—ҶлӢӨлҠ” м ңлЎ¬мқҳ м •кІҪкіј мҷёкІҪ 분лҰ¬мқҳ л°ҳліөлҗң мЈјмһҘм—җлҸ„ л¶Ҳкө¬н•ҳкі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қҖ мҷёкІҪлҸ„ м •кІҪмңјлЎң лҚ”мҡұ нҷ•кі нһҲ н•ңлӢӨ. мқҙнӣ„ 8-9м„ёкё°кІҪ мғӨлҘјл§Ҳлүҙ лҢҖм ңм—җ мқҳн•ң вҖҳм№ҙлЎӨл§Ғкұ° лҘҙл„ӨмғҒмҠӨ(8-9м„ёкё°)вҖҷмҷҖ н•Ёк»ҳ к°ҖнҶЁлҰӯкөҗнҡҢлҠ” мһҗкё° к°ңнҳҒмқ„ лӢЁн–үн•ңлӢӨ. нҠ№нһҲ к°ҖнҶЁлҰӯмқҳ к°ңнҳҒмқ„ 추진н•ҳл©ҙм„ң м •кІҪ м—°кө¬мҷҖ мӮ¬ліё м •лҰ¬лҘј к°•мЎ°н•ңлӢӨ. к·ё мқјнҷҳмңјлЎң мЈјнӣ„ 789л…„ м•„н—Ё(Aachen) кіөмқҳнҡҢлҠ” мҷёкІҪмқ„ нҸ¬н•Ён•ң л¶Ҳк°ҖнғҖ м„ұкІҪмқ„ м„ңл°© көҗнҡҢмқҳ кіөмӢқ м„ұкІҪмңјлЎң нҷ•м •н–ҲлӢӨ. нҠ№нһҲ лҰ¬мҡ©(Lyon)мқ„ мӨ‘мӢ¬мңјлЎң к°ҖнҶЁлҰӯмқҖ мҳҲл°°мҷҖ мӢ н•ҷ көҗмңЎм—җм„ң мҷёкІҪмқ„ нҸ¬н•Ён•ҳлҠ” л¶Ҳк°ҖнғҖлҘј м •кІҪмңјлЎң нҷ•м •н•ңлӢӨ.
70мқём—ӯм—җ нҸ¬н•Ёлҗң мҷёкІҪмқ„ лӢӨмӢң м •кІҪмңјлЎң мұ„нғқн•ҳлҠ” мӮ¬кұҙмқҙ л°ңмғқн•ңлӢӨ. к°ҖнҶЁлҰӯкөҗнҡҢ к¶Ңл Ҙмқҙ мҷёкІҪмқ„ м •кІҪмңјлЎң кІ°м •н•ҳлҠ” мӮ¬кұҙмқҙ л°ңмғқн•ң кІғмқҙлӢӨ. н‘ңл©ҙм ҒмңјлЎң ліҙл©ҙ мқҙ мӮ¬кұҙмқҖ мӮҙм•ҳкі мҡҙлҸҷл Ҙ мһҲлҠ” н•ҳлӮҳлӢҳ л§җм”Җмқҳ к¶Ңмң„к°Җ 추лқҪн•ҳлҠ” кІғмІҳлҹј ліҙмқҙм§Җл§Ң, м—ӯмӮ¬ м„ӯлҰ¬мқҳ мЈјкҙҖмһҗлҘј мҳҒмЎҙ(ж°ёеӯҳ)н•ҳмӢңлҠ” м—¬нҳёмҷҖ н•ҳлӮҳлӢҳмңјлЎң ліёлӢӨл©ҙ,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—җ мқҳн•ң мҷёкІҪ нҸ¬н•Ёмқҳ м •кІҪ нҷ•м • кіөмқҳнҡҢлҠ” м ҲлҢҖ진лҰ¬мқё н•ҳлӮҳлӢҳ л§җм”Җмқҳ к¶Ңмң„м—җ мқҳн•ң мӢ¬нҢҗ мӮ¬кұҙмқҙ к·ё ліём§ҲмқҙлӢӨ.
<лӢӨмқҢ нҳём—җ кі„мҶҚ>
|
кёҖм“ҙмқҙ н”„лЎңн•„ кёҖм“ҙмқҙ : л°•нҷҚкё° л°•мӮ¬ (мЈјн•„ мІ н•ҷл°•мӮ¬ лҜёкөӯ мҳӨмқҙмҪ”мҠӨлҢҖн•ҷкөҗ көҗмҲҳ) мқҙл©”мқј : |
 м„ұкІҪмқҳ м ҲлҢҖ к¶Ңмң„мҷҖ м„ұкІҪ ліёл¬ёмқҳ нҺём§‘(в…Ј) м„ұкІҪмқҳ м ҲлҢҖ к¶Ңмң„мҷҖ м„ұкІҪ ліёл¬ёмқҳ нҺём§‘(в…Ј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