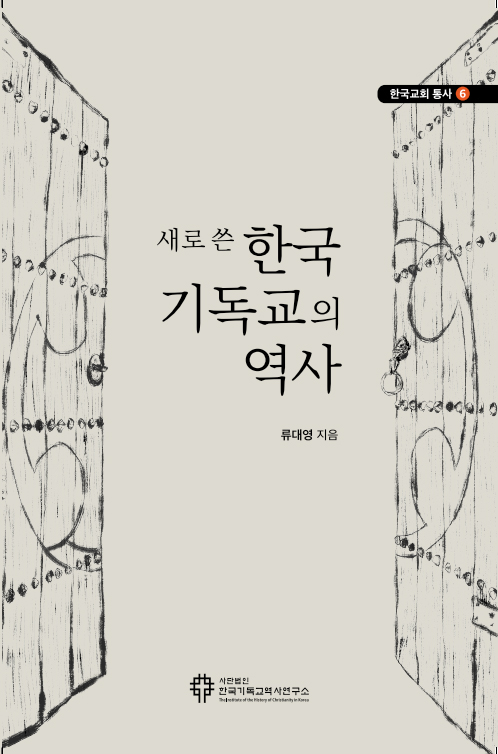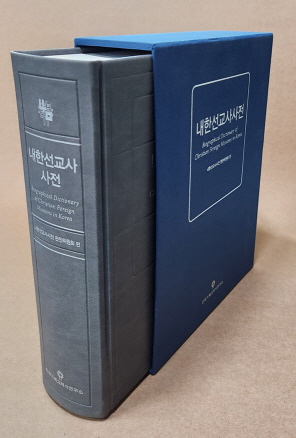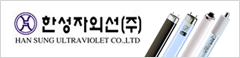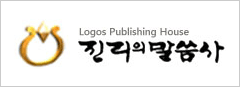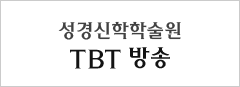мҳҲмҲңм—¬лҚҹ:кі нҠёмЎұмқҳ лӘ°лқҪ, мӨ‘м„ё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қҳ л°ңнқҘ
вҖҳмӨ‘м„ёвҖҷлқјкі н• л•Ң к·ё кё°мӨҖмқҖ 476л…„ м„ң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л©ёл§қ мӢңм җл¶Җн„° 1000л…„кІҪк№Ңм§Җмқҳ мң лҹҪ м—ӯмӮ¬лЎң мӨ‘м„ё кі м „ л¬ёнҷ”к°Җ нҳ•м„ұлҗҳлҠ” мӢңкё°лҘј мқјм»«лҠ”лӢӨ. мӨ‘м„ё мҙҲкё°лҠ” м •м№ҳм ҒмңјлЎң 분м—ҙмқҳ мӢңкё°мҳҖлӢӨ. м„ңлЎңл§Ҳ м ңкөӯ 붕кҙҙ мқҙнӣ„ мң лҹҪмқҖ н”„лһ‘нҒ¬ мҷ•көӯ, кі нҠёмЎұ мҷ•көӯ л“ұмңјлЎң 분м—ҙн•ңлӢӨ. к·ёлҹ¬л©ҙм„ң мў…көҗм ҒмңјлЎңлҠ”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қҙ нҷ•мӮ°н•ҳл©ҙм„ң көҗнҡҢмқҳ к¶Ңмң„лҘј к°•нҷ”н•ҳлҠ” мӢңк°„мқҙм—ҲлӢӨ.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қҙ мң лҹҪ мӮ¬нҡҢлҘј мў…көҗм ҒмңјлЎң м§Җл°°н•ҳл©ҙм„ң м җм°Ё м •м№ҳм Ғ м§Җл°°л ҘлҸ„ нҷ•мһҘн•ңлӢӨ. кі лҢҖ лЎңл§Ҳмқҳ л¬ёнҷ”лҠ” мғҒлӢ№ л¶Җ분 мҮ нҮҙн•ҳкі лҶҚм—… мӨ‘мӢ¬мқҳ лҙүкұҙ мӮ¬нҡҢк°Җ ліёкІ©нҷ”н•ңлӢӨ. к·ёлҝҗ м•„лӢҲлқј мқҙмҠ¬лһҢмқҙ л¶ҖмғҒн•ҳм—¬ мӨ‘лҸҷ, л¶Ғм•„н”„лҰ¬м№ҙ, мқҙлІ лҰ¬м•„л°ҳлҸ„к№Ңм§Җ к·ё м„ёл Ҙмқ„ нҷ•мһҘн•ҳл©ҙм„ң мң лҹҪкіј 충лҸҢн•ҳлҠ”к°Җ н•ҳл©ҙ л¬ёнҷ”м ҒмңјлЎң нҒ° көҗлҘҳлҸ„ мӢңмһ‘н•ңлӢӨ.
к·ёлҹ°лҚ° 5м„ёкё° л§җ мӨ‘м„ё мҙҲкё° м„ңмң лҹҪмқҖ м•„лҰ¬мҡ°мҠӨнҢҢ кі нҠёмЎұ(Arian Goths)мқҙ м§Җл°°л Ҙмқ„ н–үмӮ¬н•ҳкі мһҲм—ҲлӢӨ. кІҢлҘҙл§Ңкі„мқҳ кі нҠёмЎұмқҖ мЈјнӣ„ 4-6м„ёкё°кІҪ лӢҲмјҖм•„ кіөмқҳнҡҢмқҳ мӢ мЎ°мқё вҖҳмӮјмң„мқјмІҙлЎ вҖҷмқ„ л¶Җм •н•ҳлҠ”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(Arianism)лҘј л°ӣм•„л“ӨмҳҖлӢӨ. мқҙл“ӨмқҖ мҠӨнҺҳмқёкіј лӮЁн”„лһ‘мҠӨлҘј мӨ‘мӢ¬мңјлЎң м„ңкі нҠёмЎұ(Visigoths)мқ„, мқҙнғҲлҰ¬м•„лҘј мӨ‘мӢ¬мңјлЎң лҸҷкі нҠёмЎұ(Ostrogoths)мқ„ кұҙлҰҪн•ңлӢӨ.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мқҳ н•өмӢ¬ мЈјмһҘмқҖ мӮјмң„мқјмІҙмқҳ л¶Җм •кіј н•Ёк»ҳ мҳҲмҲҳ к·ёлҰ¬мҠӨлҸ„лҠ” н”јмЎ°л¬јмқҙл©° м„ұл¶Җ н•ҳлӮҳлӢҳліҙлӢӨ м—ҙл“ұн•ҳлӢӨлҠ” мӢ мЎ°м—җ лӢҙкІЁмһҲлӢӨ. мқҙл“Өмқҙ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Ҙј л”°лҘҙкІҢ лҗң кІғмқҖ 4м„ёкё° кі нҠёмЎұм—җ кё°лҸ…көҗлҘј м „н•ң мҡён•„лқјмҠӨ(Ulfilas, м•Ҫ311–383)к°Җ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мһҗмҳҖкё° л•Ңл¬ёмқҙлӢӨ. к·ёлҠ” нҠ№нһҲ м„ңкі нҠёмЎұм—җкІҢ ліөмқҢмқ„ м „н•ң мЈјкөҗмқҙл©° м„ көҗмӮ¬лЎң кі нҠём–ҙ м•ҢнҢҢлІімқ„ м°Ҫм ңн•ҳкі мӢ м•Ҫм„ұкІҪ лҢҖл¶Җ분мқ„ кі нҠём–ҙлЎң лІҲм—ӯн–ҲлӢӨ. мқҙлҠ” кІҢлҘҙл§Ңм–ҙ к¶Ңм—ӯмқҳ мөңмҙҲмқҳ м„ұкІҪ лІҲм—ӯмқҙм—ҲлӢӨ. к·ёлҹ°лҚ° к·ёлҠ” кө¬м•Ҫ м„ұкІҪмқ„ мқјл¶Җл§Ң лІҲм—ӯн•ҳлҠ”лҚ°, м—ӯмӮ¬м„ң нҠ№нһҲ м—ҙмҷ•кё° л“ұмқ„ мқҳлҸ„м ҒмңјлЎң лІҲм—ӯн•ҳм§Җ м•Ҡм•ҳлӢӨ. мҷңлғҗн•ҳл©ҙ кі нҠёмЎұмқҳ м„ұн–Ҙмқҙ л§Өмҡ° м „нҲ¬м Ғмқҙм–ҙм„ң м„ұкІҪм—җ лӮҳмҳӨлҠ” м „мҹҒ м„ңмҲ мқҙ к·ё лҜјмЎұл“Өмқҳ м „нҲ¬м„ұмқ„ мһҗк·№н• м§Җ лӘЁлҘёлӢӨкі мҡ°л Өн–Ҳкё° л•Ңл¬ёмқҙлқјкі н•ңлӢӨ. мқҙлҹ¬н•ң л°°кІҪ н•ҳм—җ кі нҠёмЎұмқҖ мһҗм—°мҠӨлҹҪкІҢ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Ҙј мҲҳмҡ©н• мҲҳл°–м—җ м—Ҷм—Ҳмңјл©°, мқҙлҠ” мӮјмң„мқјмІҙ мӢ м•ҷмқ„ кё°ліё мӢ мЎ°лЎң н•ҳлҠ” лЎңл§Ҳ м ңкөӯмңјлЎңл¶Җн„° мһҗмӢ л“Өмқҳ м •мІҙм„ұмқ„ нҷ•лҰҪн•ҳлҠ” лҚ°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Ҙј м •м№ҳм ҒмңјлЎң м Ғк·№ нҷңмҡ©н•ҳкі мһҗ н•Ёмқҙм—ҲлӢӨ. мҠӨнҺҳмқёмқ„ мӨ‘мӢ¬мңјлЎң мҲҳлҰҪлҗң м„ңкі нҠё мҷ•көӯмқҖ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Ҙј м•һм„ёмӣҢ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кіј лҢҖлҰҪн•ҳмҳҖмңјл©°, мқҙнғҲлҰ¬м•„мқҳ лҸҷкі нҠё мҷ•көӯмқҖ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Ҙј нҶөн•ҙ 비мһ”нӢҙ м ңкөӯм—җ л§һм„ңкІҢ лҗҳм—ҲлӢӨ.
к·ёлҹ°лҚ° 587л…„ м„ңкі нҠё мҷ•көӯмқҳ мҷ• л Ҳм№ҙл Ҳл“ң 1м„ё(Reccared I, мһ¬мң„ 586–601л…„)лҠ”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Ҙј лІ„лҰ¬кі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ңјлЎң к°ңмў…н•ңлӢӨ. мқҙмң лҠ”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кіј м •м№ҳм ҒВ·көҗнҡҢм Ғ нҶөн•©мқҙ м ҲмӢӨн–Ҳкё° л•Ңл¬ёмқҙлӢӨ. к·ёлһҳм„ң 589л…„ м ң3м°Ё вҖҳнҶЁл ҲлҸ„ кіөмқҳнҡҢвҖҷ(Third Council of Toledo)лҘј нҶөн•ҙ л Ҳм№ҙл Ҳл“ң 1м„ёлҠ” вҖҳлӮҳлҠ” мӮјмң„мқјмІҙлҘј лҜҝлҠ”лӢӨвҖҷлҠ” мӢ м•ҷкі л°ұкіј н•Ёк»ҳ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Ҙј кіөмӢқм ҒмңјлЎң нҸ¬кё°н•ңлӢӨ. к·ёлҰ¬кі мқҙнғҲлҰ¬м•„ мӨ‘мӢ¬мқҳ лҸҷкі нҠёмЎұмқҳ кІҪмҡ°, м•„лҰ¬мҡ°мҠӨнҢҢмҳҖлҚҳ н…ҢмҳӨлҸ„лҰӯ лҢҖмҷ•(Theodoric the Great, м•Ҫ 454–526л…„)мқҙ нҶөм№ҳ мҙҲкё°м—җлҠ”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—җ лҢҖн•ҙм„ңлҸ„ кҙҖмҡ© м •мұ…мқ„ нҺјм№ңлӢӨ. к·ёлҠ” м„ңлЎңл§Ҳ м ңкөӯ л©ёл§қ мқҙнӣ„ мқҙнғҲлҰ¬м•„лҘј нҶөм№ҳн•ң к°ҖмһҘ мӨ‘мҡ”н•ң кІҢлҘҙл§Ңкі„ кө°мЈј мӨ‘ н•ҳлӮҳмҳҖмңјл©° лЎңл§Ҳмқҳ н–үм • мІҙкі„мҷҖ л¬ёнҷ” к·ёлҰ¬кі кІҢлҘҙл§Ң кі нҠёмЎұ м „нҶөмқ„ мңөн•©н•ҳм—¬ кі лҢҖмҷҖ мӨ‘м„ёлҘј мһҮлҠ” м „нҷҳкё°мқҳ к°Җкөҗ м—ӯн• мқ„ н•ң н•өмӢ¬ мқёл¬јмқҙкё°лҸ„ н•ҳлӢӨ. к·ёлҹ¬лӮҳ л§җл…„м—җ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 м„ёл Ҙкіјмқҳ к°Ҳл“ұмқҙ кІ©нҷ”н•ҳл©ҙм„ң н…ҢмҳӨлҸ„лҰӯ лҢҖмҷ•мқҖ вҖҳмІ н•ҷмқҳ мң„м•ҲвҖҷмңјлЎң мң лӘ…н•ң мІ н•ҷмһҗ ліҙм—җнӢ°мҡ°мҠӨ(Boethius, c. 480л…„-c. 524л…„ лҳҗлҠ” 525л…„)лҘј л°ҳм—ӯ нҳҗмқҳлЎң нҲ¬мҳҘВ·мІҳнҳ•н•ҳкі , көҗнҷ© мҡ”н•ң 1м„ёлҸ„ м •м№ҳм Ғ к°Ҳл“ұмңјлЎң мІҳнҳ•н•ңлӢӨ. н…ҢмҳӨлҸ„лҰӯ мӮ¬нӣ„ нӣ„кі„мһҗ м•„нғҲлқјлҰӯмқҖ м–ҙл ёкі к·ё м ңмң„лҠ” л§Өмҡ° л¶Ҳм•Ҳм •н–ҲлӢӨ. мқҙ л¬ҙл ө 비мһ”нӢҙ м ңкөӯмқҳ мң мҠӨнӢ°лӢҲм•„лҲ„мҠӨ 1м„ёлҠ” мқҙнғҲлҰ¬м•„лҘј нҡҢліөн•ҳкі мһҗ вҖҳкі нҠё м „мҹҒвҖҷ(535–554л…„)мқ„ мқјмңјнӮӨкі лҸҷкі нҠё мҷ•көӯмқҖ кІ°көӯ м•Ҫ 30л…„ л§Ңм—җ мҶҢл©ён•ңлӢӨ.
к·ё нӣ„ лҸҷкі нҠёмЎұмқҖ 2м„ёкё° лҸҷм•Ҳ лҸҷ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м§Ғм ‘ м§Җл°°лҘј л°ӣлҠ”лӢӨ. к·ёлҹ°лҚ° лҸҷкі нҠёмЎұмқҳ көҗнҡҢ нҶөм№ҳк¶ҢмқҖ лЎңл§Ҳ көҗнҷ©мІӯ м§Җл°° м•„лһҳ мһҲм—Ҳмңјл©° м •м№ҳм ҒмңјлЎңлҠ” 비мһ”нӢҙ нҷ©м ңмҷҖ лқјлІӨлӮҳ мҙқлҸ…мқҳ нҶөм ңлҘј л°ӣм•ҳлӢӨ. мў…көҗм ҒмңјлЎң ліҙл©ҙ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Ҡ” мӮ¬лқјм§Җкі мӮјмң„мқјмІҙ мӢ мЎ°к°Җ мӢ м•ҷмқҳ кё°мҙҲк°Җ лҗҳм—ҲлӢӨ. к·ёлҹ°лҚ° 751л…„ лЎ¬л°”лҘҙл“ңмЎұмқҳ м№Ёмһ…мңјлЎң лқјлІӨлӮҳк°Җ н•ЁлқҪлӢ№н•ҳл©ҙм„ң 비мһ”нӢҙ м„ёл ҘмқҖ кёүмҶҚнһҲ м•Ҫнҷ”н•ҳмҳҖлӢӨ. лӢ№мӢң көҗнҷ©мқҙм—ҲлҚҳ мҠӨн…ҢнҢҢл…ё 2м„ё(Stephen II)лҠ” н”„лһ‘нҒ¬ мҷ• н”јн•Җ(Pepin the Short)м—җкІҢ лҸ„мӣҖмқ„ мҡ”мІӯн•ҳмҳҖмңјл©° н”јн•ҖмқҖ 756л…„ мқҙнғҲлҰ¬м•„ мӨ‘л¶Җ(лқјлІӨлӮҳ нҸ¬н•Ё)лҘј лӢӨмӢң нғҲнҷҳн•ҳкі к·ё мҳҒнҶ лҘј лЎңл§Ҳ көҗнҷ©м—җкІҢ кё°мҰқн•ңлӢӨ. мқҙ мӮ¬кұҙмқ„ кі„кё°лЎң лЎңл§Ҳ көҗнҷ©мқҖ мў…көҗ м§ҖлҸ„мһҗмқј лҝҗ м•„лӢҲлқј вҖҳм„ёмҶҚ кө°мЈјвҖҷмқҳ м§Җмң„к№Ңм§Җ нҷ•ліҙн•ҳл©ҙм„ң мқҙлҘёл°” м—ӯмӮ¬м—җм„ң вҖҳкөҗнҷ©л №(Papal States)вҖҷмқҙлқјлҠ” к°•л Ҙн•ң м •м№ҳ-мў…көҗм Ғ к¶Ңл Ҙмқ„ к°ңмӢңн•ҳкІҢ лҗңлӢӨ. мқҙ көҗнҷ©л №мқҖ мӨ‘м„ё көҗнҷ©к¶Ңмқҳ мӢ нҳёнғ„мқҙ лҗҳм—Ҳмңјл©° мқҙнӣ„ 800л…„м—җ көҗнҷ© л ҲмҳӨ 3м„ёк°Җ мғӨлҘјл§Ҳлүҙ(Charlemagne)м—җкІҢ лЎңл§Ҳ нҷ©м ңлЎң лҢҖкҙҖмӢқмқ„ мӢңн–үн•ҳл©ҙм„ң мӨ‘м„ё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қҙ к¶Ңл Ҙмқҳ м •м җм—җ мҳӨлҘҙлҠ” мӮ¬кұҙмңјлЎң мқҙм–ҙ진лӢӨ. лҸҷмӢңм—җ лЎңл§Ҳ көҗнҷ©кіј н”„лһ‘нҒ¬ м ңкөӯмқҖ лҸҷ맹 кҙҖкі„лҘј нҷ•м •н•ҳл©ҙм„ң 비мһ”нӢҙ м ңкөӯм—җ лҢҖн•ң лҸ…лҰҪмқ„ м„ м–ён•ҳкІҢ лҗңлӢӨ.
к·ёлҹ°лҚ° кі нҠёмЎұл“Өмқҙ мӮјмң„мқјмІҙ мӢ м•ҷмқё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қ„ л°ӣм•„л“Өмқё л°°кІҪм—җлҠ” лЁјм Җ м •м№ҳм Ғ нҶөн•©мқҳ н•„мҡ”м„ұмқҙ нҳ„мғҒм Ғмқё нҒ° мқҙмң к°Җ лҗҳм—ҲлӢӨ. лЎңл§Ҳм ңкөӯ лӮҙм—җм„ң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Ҡ” көӯк°Җ 분лҰ¬мЈјмқҳм Ғ м„ұн–ҘмңјлЎң ліҙмҳҖкё° л•Ңл¬ём—җ лЎңл§Ҳ м ңкөӯкіј нҶөн•© м—¬л¶ҖлҠ” кІ°көӯ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қҳ мӮјмң„мқјмІҙ мӢ м•ҷмқ„ мҲҳмҡ©н•ҳлҠ” кІғкіј м§Ғм ‘ кҙҖл Ёлҗҳм—ҲлӢӨ. к·ёлҰ¬кі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қҳ мӮјмң„мқјмІҙ мӢ м•ҷмқҙ вҖҳм •нҶөвҖҷмқҙлқјлҠ” мЈјмһҘм—җ кі нҠёмЎұ м§ҖлҸ„мһҗл“Өкіј м„ұм§Ғмһҗл“ӨмқҖ к·ё көҗлҰ¬мқҳ л…јлҰ¬м„ұкіј мӢ н•ҷм Ғ мҡ°мӣ”м„ұм—җ м„Өл“қмқ„ лӢ№н•ңлӢӨ. мқҙл ҮкІҢ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мһҗл“ӨмқҖ кІ°көӯ м•„нғҖлӮҳмӢңмҡ°мҠӨ(Athanasius of Alexandria, c. 296 лҳҗлҠ” 298-373л…„), нһҗлқјлҰ¬мҡ°мҠӨ(Hilary of Poitiers, c. 310–367л…„), м•”лёҢлЎңмӢңмҡ°мҠӨ(Aurelius Ambrosius, c. 339–397)к°Җ мЈјлҸ„н•ҳлҠ” м„ңл°© мӢ н•ҷм—җ нҢЁл°°лӢ№н•ң кІғмқҙлӢӨ.
<274нҳём—җм„ң кі„мҶҚ>
 м—ӯмӮ¬ м„ңмҲ мқҳ лҸҷл Ҙ, мҳҲмҲ м Ғ 충лҸҷ
м—ӯмӮ¬ м„ңмҲ мқҳ лҸҷл Ҙ, мҳҲмҲ м Ғ 충лҸҷ