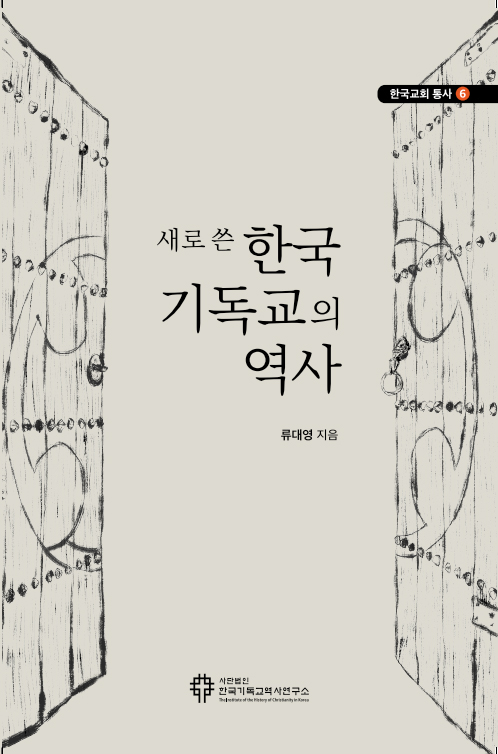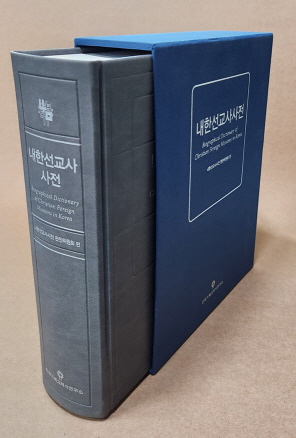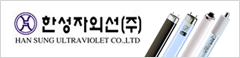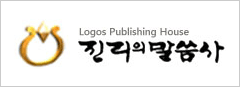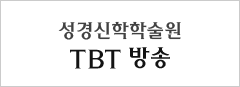мқјнқ”:лЎңл§Ҳм ңкөӯмқҳ мҡ°мғҒ мҲӯл°°мҷҖ мІ н•ҷ,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ңјлЎң л‘”к°‘ (1)
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қҖ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м •м№ҳмҷҖ мў…көҗмқҳ м—°мҶҚмқҙлқјкі н•ҙлҸ„ л¬ҙл°©н•ҳлӢӨ. м•һм„ң лӢӨлЈЁм—Ҳл“Ҝмқҙ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қҳ мҲҳл§ҺмқҖ мў…көҗ мқҳмӢқл“Өмқҙ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мҷ•мӢӨкіј лҜјк°„м—җ мқҙлҜё мҲҳл°ұ л…„ лҸҷм•Ҳ кІ¬кі н•ң л¬ёнҷ”лЎң мһҗлҰ¬ мһЎм•ҳлҚҳ мқҳмӢқл“ӨмқҙлӢӨ. м—¬кё°м—җ кё°лҸ…көҗк°Җ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көӯкөҗк°Җ лҗң мқҙнӣ„ мқҙл°© мў…көҗмқҳ мқҳмӢқмқҖ к·ёлҢҖлЎң мқҙм–ҙм§Җл©ҙм„ң лӘ…м№ӯл§Ң кё°лҸ…көҗ кҙҖл Ё к°ңл…җмңјлЎң л°”лҖҢм—ҲлӢӨ. к°Җл №, нҷ©м ңмқҳ вҖҳлҢҖм ңмӮ¬мһҘ(Pontifex Maximus)вҖҷ м№ӯнҳёлҠ” көҗнҷ©мқҳ кіөмӢқ м№ӯнҳёлЎң кі„мҠ№лҗҳм—Ҳмңјл©°, нҷ©м ңмқҳ мӢ м Ғ к¶Ңмң„лҘј ліҙм—¬мЈјлҚҳ нҷ©м ң н–үл ¬ л°Ҹ к¶Ғм • мқҳм „мқҖ көҗнҷ© н–үл ¬кіј көҗнҷ©мқ„ нҳёмң„н•ҳкё° мң„н•ҙ мҳҲліөВ·кҙҖлӘЁлҘј м°©мҡ©н•ҳлҠ” мқҳмӢқмңјлЎң нғҲл°”кҝҲн–ҲлӢӨ. мӮ¬нҲ¬лҘҙлӮ лҰ¬м•„(Saturnalia)мҷҖ нғңм–‘мӢ 축мқј(12мӣ” 25мқј)мқҖ вҖҳмҳҲмҲҳ нғ„мғқ 축мқјвҖҷ(нҒ¬лҰ¬мҠӨл§ҲмҠӨ)лЎң мһҗлҰ¬лҘј мһЎм•ҳлӢӨ. мқҙкөҗ мӢ м „м—җ л“ңлҰ¬лҚҳ м ңлӢЁВ·н–ҘВ·мҙӣл¶ҲмқҖ м„ұлӢ№мқҳ м ңлӢЁВ·н–ҘВ·мҙӣл¶ҲлЎң мһҗлҰ¬лҘј мҳ®кІјлӢӨ. мң лӘ… мқёл¬ј 추лӘЁм ңлҠ” м„ұмқё 축мқјкіј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қҙ м„ лі„н•ң мҲңкөҗмһҗ кё°л…җмқјлЎң л°”лҖҗлӢӨ. мқҙл°©мӢ мҲӯл°°лҘј мң„н•ң м„ұмғҒВ·мӢ мғҒ н–үл ¬мқҖ л§ҲлҰ¬м•„мғҒВ·м„ұмқё мң кіЁ н–үл ¬лЎң лҢҖмІҙн–Ҳмңјл©°, лЎңл§Ҳ лӢ¬л Ҙмқҳ 축мқјм ңлҠ” м„ұмқё 축мқјВ·көҗнҡҢл ҘмңјлЎң, мӢ мғҒ м•һм—җ н–Ҙмқ„ н”јмҡ°лҚҳ н–Ҙм ң(йҰҷзҘӯ)лҠ” лҜёмӮ¬мқҳ н–ҘлЎң мӮ¬мҡ©мңјлЎң мһҗлҰ¬лҘј мһЎкІҢ лҗңлӢӨ.
м•һм„ң л§җн•ң мӮ¬нҲ¬лҘҙлӮ лҰ¬м•„мҷҖ нғңм–‘мӢ 축мқјмқҖ лЎңл§Ҳмқҳ кІЁмҡё м—°л§җ 축м ңмҳҖлӢӨ. мӮ¬нҲ¬лҘҙлҲ„мҠӨ(Saturn)лҠ” лЎңл§Ҳмқҳ лҶҚкІҪмӢ мңјлЎң лЎңл§Ҳмқёл“ӨмқҖ 12мӣ” 17мқјл¶Җн„° 12мӣ” 23мқјк№Ңм§Җ м•Ҫ 1мЈјмқј лҸҷм•Ҳ лҢҖ축м ңлҘј лІҢмқёлӢӨ. лҶҚмӮ¬мқҳ мӢ мқ„ м°¬м–‘н•ҳлҠ” н’Қмҡ”В·мһҗмң В·нҸүл“ұмқҳ 축м ңмҳҖлӢӨ. мқҙ кё°к°„м—җлҠ” мЈјмқёкіј л…ёмҳҲк°Җ к·ё м—ӯн• мқ„ л°”кҫёлҠ” н’ҚмҠөлҸ„ мһҲм—ҲлӢӨ. мһҗмң мҷҖ нҸүл“ұмқҳ мІҙн—ҳмңјлЎң л…ёмҳҲк°Җ мЈјмқёмІҳлҹј лҢҖмҡ°л°ӣкі , мЈјмқёмқҖ мӢңмӨ‘мқ„ л“Өкё°лҸ„ н–ҲлӢӨ. к·ёлҰ¬кі мҙӣл¶ҲмқҙлӮҳ мқёнҳ•мқ„ к°Җм§Җкі м„ л¬јмқ„ көҗнҷҳн•ҳлҠ”к°Җ н•ҳл©ҙ мҙҲлЎқ мӢқл¬јкіј нҷ”нҷҳмңјлЎң мҳЁ 집м•Ҳмқ„ мһҘмӢқн–ҲлӢӨ. нҳ„мһ¬ нҒ¬лҰ¬мҠӨл§ҲмҠӨмқҙлёҢмқҳ м„ л¬јкөҗнҷҳмқҙлӮҳ нҒ¬лҰ¬мҠӨл§ҲмҠӨнҠёлҰ¬ мһҘмӢқ н’ҚмҠөмқҖ л°”лЎң мқҙлҹ¬н•ң лЎңл§Ҳмқҳ лҶҚкІҪмӢ мҲӯл°° 축м ңмқҳ мһ”мһ¬лқјкі н• мҲҳ мһҲлӢӨ. к·ёлҹ°к°Җ н•ҳл©ҙ мқҙ мӮ¬нҲ¬лҘҙлӮ лҰ¬м•„ 축м ңм—җм„ңлҠ” м—°мқј мқҙм–ҙм§ҖлҠ” нҒ° м—°нҡҢмҷҖ л…ёлһҳмҷҖ к°Җл¬ҙ, лҸ„л°•лҸ„ н—Ҳмҡ©н•ҳлҠ” к·ём•јл§җлЎң м—°л§җ лҢҖ축м ңмҳҖлӢӨ. лЎңл§Ҳмқёл“ӨмқҖ мқҙлҹ¬н•ң м—°л§җ 축м ңлҘј мҰҗкё°л©ҙм„ң лҶҚкІҪмӢ мӮ¬нҲ¬лҘҙлҲ„мҠӨк°Җ лӢӨмҠӨл ёлӢӨкі м „н•ҙм§ҖлҠ” н’Қмҡ”мҷҖ мһҗмң мқҳ вҖҳнҷ©кёҲмӢңлҢҖвҖҷлҘј лҸҷкІҪн–ҲлӢӨ. мқҙл ҮкІҢ ліҙл©ҙ нҳ„мһ¬ м„ңм–‘м—җм„ң мң лһҳн•ң м„ұнғ„м Ҳ л¬ёнҷ”лҠ” кё°лҸ…көҗмқҳ ліём§ҲмқҙлӮҳ м„ұкІҪ 진лҰ¬мҷҖлҠ” кұ°лҰ¬к°Җ лЁј мқҙл°©мӢ мҲӯл°°м—җ к·ё кё°мӣҗмқ„ л‘җкі мһҲлӢӨлҠ” м җмқ„ 분лӘ…нһҲ мқҳмӢқн•ҙм•ј н•ңлӢӨ.
к·ёлҹ°лҚ° л¬ёнҷ”м Ғ кҙҖмҠөмқҙлӮҳ н’ҚмҠөлҝҗ м•„лӢҲлқј н—¬л ҲлӢҲмҰҳмқҳ мІ н•ҷ мӮ¬мғҒ лҳҗн•ң л§Ҳм№ҳ кё°лҸ…көҗ 진лҰ¬мІҳлҹј л‘”к°‘н–ҲлӢӨ. м„ұкІҪ 진лҰ¬м—җ к·јкұ°лҘј л‘” кё°лҸ…көҗ мӢ м•ҷмқҙ м•„лӢҲлқј н”ҢлқјнҶӨкіј м•„лҰ¬мҠӨнҶ н…”л ҲмҠӨмқҳ мІ н•ҷмқҙ кё°лҸ…көҗмқҳ мҳ·мқ„ мһ…кі л“ұмһҘн•ң кІғмқҙ н—ҲлӢӨн•ҳлӢӨлҠ” л§җмқҙлӢӨ. лЎңл§Ҳ нҷ©м ң мҲӯл°°мқҳ к°–к°Җм§Җ мқҙкөҗлҸ„ н’ҚмҠөл“Өмқҙ л§Ҳм№ҳ кё°лҸ…көҗ м „нҶөмІҳлҹј мң„мһҘн•ҳл©ҙм„ң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қҳ көҗнҷ© мІҙм ңлҘј л– л°ӣл“Өкі мһҲлҚҳ 6м„ёкё° мҙҲ, к·ёлҰ¬мҠӨ мІ н•ҷ м•ҲмңјлЎң кё°лҸ…көҗмқҳ ліём§Ҳмқ„ мӢ н•ҷм ҒмңјлЎң нҷ”н•ҙмӢңмј°лҚҳ мң лӘ…н•ң мІ н•ҷмһҗк°Җ мһҲлӢӨ. ліҙм—җнӢ°мҡ°мҠӨлӢӨ. лЎңл§Ҳ к·ҖмЎұ м¶ңмӢ н•ҷмһҗ ліҙм—җнӢ°мҡ°мҠӨ(Anicius Manlius Severinus Boethius, м•Ҫ 480-524)лҠ” кё°лҸ…көҗмқёмқҙм—Ҳмңјл©° м •нҶө(лӢҲмјҖм•„) мӢ м•ҷмқ„ м§Җм§Җн•ң мқёл¬јмқҙлӢӨ. к·ёлҠ”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Ҙј мӢ лҙүн•ҳлҚҳ лҸҷкі нҠё мҷ•көӯмқҳ мһ¬мғҒ(е®°зӣё)мқҙкё°лҸ„ н–ҲлӢӨ. лӢ№мӢң көӯмҷ•мқҖ мҳҲмҲҳмқҳ мӢ м„ұмқ„ л¶Җм •н•ҳлҠ” м•„лҰ¬мҡ°мҠӨнҢҢмқҳ мӢ лҙүмһҗмҳҖлҚҳ н…ҢмҳӨлҸ„лҰӯ лҢҖмҷ•мқҙлӢӨ. ліҙм—җнӢ°мҡ°мҠӨлҠ” лЎңл§Ҳ к°ҖнҶЁлҰӯмқҳ к·ҖмЎұ м„ёл Ҙкіј н•Ёк»ҳ м •нҶөнҢҢ кё°лҸ…көҗмқҳ мқҙн•ҙлҘј лҢҖліҖн•ҳкі мһҗ н–Ҳмңјл©° лӮҳм•„к°Җ м•„лҰ¬мҡ°мҠӨмЈјмқҳлҘј мӢ лҙүн•ҳлҠ” лҸҷкі нҠёмЎұкіј лӢҲмјҖм•„ мӢ мЎ°лҘј л”°лҘҙлҠ” лҸҷ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кҙҖкі„лҘј к°ңм„ н•ҳкі мһҗ н–ҲлӢӨ. н•ҳм§Җл§Ң к·ёлҠ” 523л…„ л¬ҙл ө л°ҳлһҖ нҳҗмқҳмһҗмқҳ лҚ«м—җ кұёлҰ°лӢӨ. вҖҳлҸҷлЎңл§Ҳ нҷ©м ңмҷҖ лӮҙнҶөн•ҳл©° (м•„лҰ¬мҡ°мҠӨнҢҢлҘј мӢ лҙүн•ҳлҠ”) лҸҷкі нҠёмЎұмқҳ мҷ•(н…ҢмҳӨлҸ„лҰӯ)мқ„ м „ліөн•ҳл Ө н•ңлӢӨвҖҷлҠ” нҳҗмқҳлЎң мІҙнҸ¬лҗҳм–ҙ мІҳнҳ•лҗңлӢӨ. н…ҢмҳӨлҸ„лҰӯ нҷ©м ңлҠ” лӢ№мӢң лЎңл§Ҳ к·ҖмЎұл“Өмқҙ лҸҷлЎңл§Ҳ(мң мҠӨнӢ°лҲ„м•„лҲ„мҠӨ нҷ©м ң)мҷҖ мҶҗмқ„ мһЎкі мһҗмӢ мқ„ мЈҪмқҙл Ө н•ңлӢӨкі ліҙм•ҳмңјлҜҖлЎң ліҙм—җнӢ°мҡ°мҠӨлҠ”, мӮ¬мӢӨ м—¬л¶ҖлҘј л– лӮҳ, мӮҙн•ҙ мқҢлӘЁмқҳ лҚ«м—җм„ң лІ—м–ҙлӮ мҲҳ м—Ҷм—ҲлӢӨ.
ліҙм—җнӢ°мҡ°мҠӨлҠ” к·ёлҰ¬мҠӨм–ҙм—җ мң м°Ҫн–Ҳмңјл©° лҸҷмӢңм—җ к·ёлҰ¬мҠӨ мІ н•ҷмһҗ н”ҢлқјнҶӨкіј м•„лҰ¬мҠӨнҶ н…”л ҲмҠӨ мӮ¬мғҒм—җлҸ„ м •нҶөн–ҲлӢӨ. к·ёлҠ” л‘җ мІ н•ҷмһҗлҘј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м–ём–ҙ лқјнӢҙм–ҙлЎң лІҲм—ӯн•ҳл Өкі кі„нҡҚн•ҳкі мһҲм—ҲлӢӨ. к·ёлҠ” м•„лҰ¬мҡ°мҠӨнҢҢ нҶөм№ҳмһҗ н…ҢмҳӨлҸ„лҰӯ мҲҳн•ҳм—җ мһҲм—Ҳм§Җл§Ң лӢҲмјҖм•„ мӢ мЎ°(лӢ№мӢң м •нҶөнҢҢмқҳ мӢ мЎ°)мҷҖ лЎңл§Ҳ м „нҶө мІ н•ҷмқ„ кІ°н•©н•ҳкі мһҗ н–ҲлӢӨ. к·ёлҹ¬н•ң мӢңлҸ„мқҳ лҢҖн‘ңмһ‘мқҙ к·ёмқҳ мҳҘмӨ‘м„ң гҖҺмІ н•ҷмқҳ мң„м•Ҳм—җ лҢҖн•ҳм—¬(De Consolatione Philosophiae)гҖҸлӢӨ. вҖҳмІ н•ҷмқҳ мң„м•Ҳм—җ лҢҖн•ҳм—¬вҖҷм—җм„ң ліҙм—җнӢ°мҡ°мҠӨлҠ” кі лҢҖ мІ н•ҷ нҠ№нһҲ н”ҢлқјнҶӨВ·м•„лҰ¬мҠӨнҶ н…”л ҲмҠӨВ·мҠӨнҶ м•„ мІ н•ҷмқ„ м •нҶө кё°лҸ…көҗ мӢ м•ҷкіј м ‘лӘ©мӢңнӮЁлӢӨ. л§Өмҡ° нқҘлҜёлЎңмҡҙ м җмқҖ м§Ғм ‘м Ғмқё м„ұкІҪ мқёмҡ©лҸ„ мҳҲмҲҳ к·ёлҰ¬мҠӨлҸ„м—җ лҢҖн•ң м–ёкёүмқҙ кұ°мқҳ м—ҶлӢӨ. мӮ°л¬ёкіј мҡҙл¬ёмқҙ көҗм°Ён•ҳлҠ” лҢҖнҷ”мІҙлЎң мқҙлЈЁм–ҙ진 лӮҙмҡ©мңјлЎң м Ҳл§қм—җ л№ м§„ вҖҳліҙм—җнӢ°мҡ°мҠӨвҖҷмҷҖ к·ёлҘј мң„лЎңн•ҳлҠ” л¶Җмқёмқё вҖҳмІ н•ҷ(Philosophia)вҖҷмқҙ лҢҖнҷ”лҘј н•ҳлҠ” л°©мӢқмқҙлӢӨ. мЈјмҡ” лӮҙмҡ©л“ӨмқҙлӢӨ. к¶Ңл Ҙкіј л¶Җ к·ёлҰ¬кі лӘ…мҳҲлҠ” лҚ§м—Ҷмңјл©° вҖҳн–үмҡҙ(Fortuna)вҖҷмқҳ мҲҳл Ҳл°”нҖҙлҠ” мңӨнҡҢн•ңлӢӨ. м°ёлҗң н–үліөмқҙлһҖ мҳӨм§Ғ м„ мһҗмІҙмқё н•ҳлӮҳлӢҳ(мөңкі м„ , Summum Bonum) м•Ҳм—җм„ңл§Ң к°ҖлҠҘн•ҳлӢӨ. н•ҳлӮҳлӢҳмқҳ м„ӯлҰ¬(Providentia)лҠ” к¶Ғк·№м ҒмңјлЎң м„ н•ҳл©°, м„ёмғҒ мӮ¬кұҙл“ӨмқҖ к·ёлҹ¬н•ң м„ӯлҰ¬мқҳ м§Ҳм„ң мҶҚм—җ вҖҳмҡҙлӘ…(Fatum)вҖҷмңјлЎң нҸ¬н•ЁлҗңлӢӨ. н•ҳлӮҳлӢҳмқҳ м „м§Җ(е…ЁзҹҘ)н•ҳмӢ¬кіј мқёк°„мқҳ мһҗмң мқҳм§ҖлҠ” м–‘лҰҪн•ңлӢӨ.
ліҙм—җнӢ°мҡ°мҠӨлҠ” м„ӯлҰ¬мҷҖ мҡҙлӘ…м—җ лҢҖн•ҙ лӢӨмқҢкіј к°ҷмқҖ нҢҗлӢЁмқ„ лӮҙлҰ°лӢӨ. м„ӯлҰ¬лҠ” н•ҳлӮҳлӢҳмқҳ мҳҒмӣҗн•ң кі„нҡҚмңјлЎңм„ң к¶Ғк·№м Ғ м„Өкі„лҸ„лқјл©ҙ мҡҙлӘ…мқҖ м„Өкі„лҸ„к°Җ мӢңк°„кіј кіөк°„ мҶҚм—җм„ң м „к°ңлҗҳлҠ” кіјм •мқҙлӢӨ. м„ӯлҰ¬к°Җ мҙҲмӣ”м ҒВ·мҳҒмӣҗм Ғ м°Ёмӣҗмқҙл©° мҡҙлӘ…мқҖ мӢңк°„В·кіөк°„ м•Ҳм—җм„ң мқёмӢқк°ҖлҠҘн•ң мқёкіјм Ғ м§Ҳм„ңлӢӨ. м„ӯлҰ¬к°Җ н•ҳлӮҳлӢҳмқҳ мөңкі м„ мқҙ к¶Ғк·№м Ғ лӘ©м Ғмқҙлқјл©ҙ мҡҙлӘ…мқҖ н”јмЎ° м„ёкі„мқҳ мӮ¬кұҙВ·мӣҗмқёВ·кІ°кіјм—җ н•ҙлӢ№н•ңлӢӨ. к·ёлһҳм„ң м„ӯлҰ¬лҠ” л¶ҲліҖмқҙм§Җл§Ң мҡҙлӘ…мқҖ л°ҳл“ңмӢң мқёкіјлІ•м№ҷм—җ л”°лқј ліҖнҷ”н•ҙм•ј н•ңлӢӨ. мқҙл Үл“Ҝ м„ӯлҰ¬лҘј кұҙ축к°Җмқҳ лЁёлҰҝмҶҚм—җ л“ мҷ„м „н•ң м„Өкі„лҸ„лқјл©ҙ мҡҙлӘ…мқҖ м„Өкі„лҸ„м—җ л”°лқј 짓лҠ” кұҙ축 кіјм •мқҙлқјкі н• мҲҳ мһҲлӢӨ. к°Җл № н…ҢмҳӨлҸ„лҰӯ мҷ•мқҙ л°ҳлһҖкө°м—җ мқҳн•ҙ лӘ©мҲЁмқ„ мһғлҠ” кІғмқҖ мҡҙлӘ…(fatum)мқҙм§Җл§Ң мқҙ мӮ¬кұҙмқҖ лӢӨлҘё лӘЁл“ мӮ¬кұҙкіј н•Ёк»ҳ м—°кҙҖлҗҳм–ҙ н•ҳлӮҳлӢҳмқҳ к¶Ғк·№м Ғ лӘ©м Ғ(м„ӯлҰ¬)мқ„ мқҙлЈ¬лӢӨ. к·ёлҠ” м„ӯлҰ¬мҷҖ мҡҙлӘ…мқ„ кө¬л¶„н•ЁмңјлЎңмҚЁ н•ҳлӮҳлӢҳмқҳ к¶Ғк·№м Ғ м„ н•ҳмӢ¬кіј м„ёмғҒмқҳ ліҖнҷ”л¬ҙмғҒ мӮ¬кұҙл“Өмқ„ мІ н•ҷм Ғ л…јлҰ¬лЎң м—°кҙҖ м§“кі мһҗ н•ңлӢӨ. ліҙм—җнӢ°мҡ°мҠӨмқҳ мқҙлҹ¬н•ң м„ӯлҰ¬мҷҖ мҡҙлӘ…мқҳ кҙҖкі„ м„ӨлӘ…мқ„ нҶөн•ҙ лӢ№мӢң м§Җл°°м Ғ мӮ¬мғҒмқҙм—ҲлҚҳ мҠӨнҶ м•„ мІ н•ҷмқҳ мҲҷлӘ…лЎ мқ„ к·№ліөн•ҳкі лӘ©м ҒлЎ м Ғ(teleological) м§Ҳм„ңлҘј к°•мЎ°н•ҳкі мһҗ н•ңлӢӨ.
ліҙм—җнӢ°мҡ°мҠӨлҠ” н•ҳлӮҳлӢҳмқҳ ліём„ұм—җм„ң лӮҳмҳӨлҠ” мҳҒмӣҗн•ң к¶Ғк·№м Ғ кі„нҡҚмқё вҖҳм„ӯлҰ¬вҖҷмҷҖ к·ё м„ӯлҰ¬к°Җ мӢңк°„В·кіөк°„ м•Ҳм—җм„ң нҺјміҗм§ҖлҠ” л°©мӢқмқё вҖҳмҡҙлӘ…вҖҷмқҳ кҙҖкі„лҘј нҶөн•ҙ мқёк°„мқҳ мһҗмң мқҳм§Җ(Liberum Arbitrium)лҘј мҳ№нҳён•ңлӢӨ. м„ӯлҰ¬мқҳ м§Җл°°лҘј л°ӣлҠ” мҡҙлӘ…мқҖ мқёк°„мқҙ кІҪн—ҳн•ҳлҠ” мӮ¬кұҙмқ„ л§Ңл“ңлҠ” мӣҗмқёВ·кІ°кіјлқјлҠ” мӮ¬мҠ¬мқҙлӢӨ. мқҙ мӮ¬мҠ¬мқҳ мҡҙлӘ… мҶҚм—җм„ңлҸ„ мқёк°„мқҙ м„ нғқн• мҲҳ мһҲлҠ” лҸ„лҚ•м Ғ лҠҘл Ҙмқҙ мЎҙмһ¬н•ҳлҠ”лҚ° мқҙлҘј вҖҳмһҗмң мқҳм§ҖвҖҷлқјкі н•ңлӢӨ. н•ҳлӮҳлӢҳмқҖ мҳҒмӣҗ мҶҚм—җм„ң мқёк°„мқҳ м„ нғқмқ„ вҖҳлҜёлҰ¬вҖҷ м•Ңкі мһҲм§Җл§Ң, к·ё мҳҲм§Җ(иұ«зҹҘ)к°Җ мқёк°„ мһҗмң лҘј нҢҢкҙҙн•ҳм§Җ м•ҠлҠ”лӢӨкі ліёлӢӨ. мқёкіјлІ•м№ҷмқҙ м§Җл°°н•ҳлҠ” мҡҙлӘ…мқҙ м „к°ңлҗҳл©ҙм„ң к·ё мҡҙлӘ… м•Ҳм—җм„ң мқёк°„мқҙ мӢӨм ңлЎң мһҗкё° кё°мӨҖмңјлЎң м„ нғқн•ҳлҠ” нҷңлҸҷмқҙ мқјм–ҙлӮҳлҠ”лҚ° мқҙлҘј мһҗмң мқҳм§Җлқјкі н•ңлӢӨ.
<278нҳём—җм„ң кі„мҶҚ>
 кіјкұ°лЎң нҳ„мһ¬лҘј м–өм••н•ҳлҠ” м—ӯмӮ¬мЈјмқҳлҘј кІҪкі„н•ҳлқј!
кіјкұ°лЎң нҳ„мһ¬лҘј м–өм••н•ҳлҠ” м—ӯмӮ¬мЈјмқҳлҘј кІҪкі„н•ҳлқј! к·јлҢҖ м—ӯмӮ¬н•ҷмқҖ мӨ‘м„ё мӢ н•ҷмқҳ мһ¬нҸ¬мһҘмқҙлӢӨ!
к·јлҢҖ м—ӯмӮ¬н•ҷмқҖ мӨ‘м„ё мӢ н•ҷмқҳ мһ¬нҸ¬мһҘмқҙлӢӨ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