мӢ н•ҷ
мІҳм°ён•ң кі нҶө, мӢ м„ұ(зҘһжҖ§)м—җ лҢҖн•ң м Ҳл§қ !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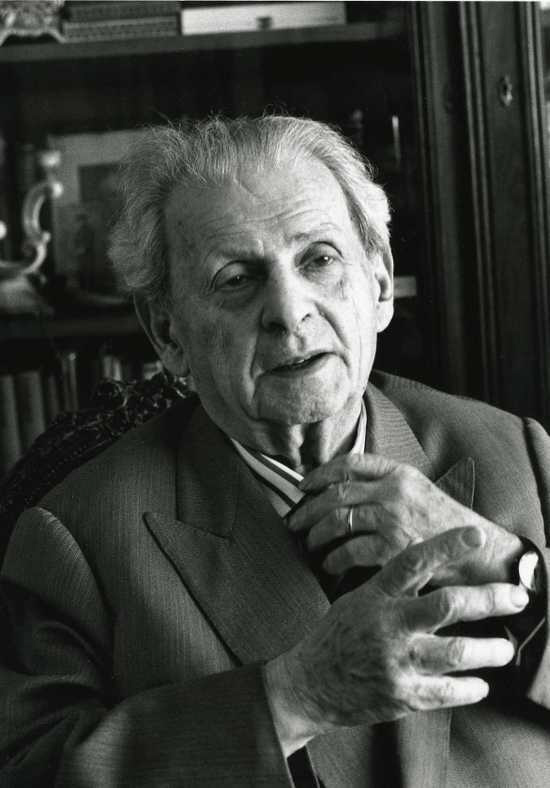
л Ҳ비лӮҳмҠӨлҠ” мқёк°„мқҙ нҢҢм•…н•ҳл ӨлҠ” к¶Ғк·№м Ғ мЎҙмһ¬лҘј вҖҳ비мқёкІ©м Ғ мӮјмқём№ӯвҖҷм—җ 비мң н•ңлӢӨ. вҖҳIt rains.вҖҷм—җм„ң вҖҳItвҖҷмқҖ л¬ҙм—Үмқём§Җ к·ңм •н• мҲҳ м—ҶлӢӨ. мқҙ кө¬мЎ°м—җм„ң мЈјм–ҙлҠ” мІҳмқҢл¶Җн„° к·ңм •н• мҲҳ м—ҶлҠ” кІғмңјлЎңм„ң, л¬ёлІ•м Ғ н•„мҡ”м„ұ л•Ңл¬ём—җ л“ұмһҘн•ң кІғмқҙлӢӨ. к·ёл ҮлӢӨкі л№„к°Җ лӮҙлҰ¬лҠ” мӮ¬кұҙмқҳ л°°нӣ„м—җ м–ҙл–Ө мӣҗмқёмқ„ к°Җм •н•ҳкұ°лӮҳ нҳ„мғҒмқҳ м •нҷ•н•ң мӣҗмқёмқ„ лӘ…нҷ•н•ҳкІҢ м„ӨлӘ…н•ҳлҠ” кІғлҸ„ мІҳмқҢл¶Җн„° л¶Ҳк°ҖлҠҘн•ҳлӢӨ. л¬ёмһҘм—җ л“Өм–ҙмһҲлҠ” лӘЁл“ мЈјм–ҙлҠ” л¬ёлІ•м Ғ кё°лҠҘмқ„ мҲҳн–үн• лҝҗ к¶Ғк·№м Ғмқё лҢҖмғҒмқҙ лҗ мҲҳлҠ” м—ҶлӢӨ. л¬ҙм—Үмқёк°Җ н‘ңнҳ„н•ҳл Өкі мқҳлҸ„лҗң л¬ёмһҘмқҙм§Җл§Ң к·ё лҢҖмғҒкіј н–үмң„мқҳ н•„м—°м Ғ м—°кҙҖм„ұмқ„ мЈјмһҘн•ҳкё°м—җлҠ” н•ңкі„к°Җ мһҲлӢӨ.
진лҰ¬лҘј л§җн• л•Ң мқјл°ҳм ҒмңјлЎң к°ңл…җкіј лҢҖмғҒмқҳ мқјм№ҳлқјкі н•ңлӢӨ. мӮ¬кіјлҘј ліҙкі мӮ¬кіјлқјкі л§җн•ҳл©ҙ 진лҰ¬мқҙм§Җл§Ң мӮ¬кіјлҘј ліҙкі л°°лқјкі н•ҳл©ҙ 비진лҰ¬к°Җ лҗңлӢӨ. лӮҳлҘј ліҙкі вҖҳл°•нҷҚкё°вҖҷлқјкі н•ҙм•јм§Җ вҖҳнҷҚкёёлҸҷвҖҷмқҙлқјкі н•ҳл©ҙ 비진лҰ¬к°Җ лҗңлӢӨ. к·ёлҹ¬лӮҳ вҖҳмҡ©кё°вҖҷлӮҳ вҖҳмӮ¬лһ‘вҖҷ, вҖҳн–үліөвҖҷмқҙлӮҳ вҖҳмһҗмң вҖҷлҘј м§Җм№ӯн•ңлӢӨкі н• л•Ң мқҙлҹ¬н•ң лҢҖмқ‘кҙҖкі„лҠ” к·ё нһҳмқ„ мһғм–ҙлІ„лҰ°лӢӨ. мҷңлғҗн•ҳл©ҙ мң„мқҳ к°ңл…җл“ӨмқҖ мІҳн•ң кІҪмҡ°л§ҲлӢӨ к·ё к·ңм •н•ҳлҠ” л°”мқҳ мқҳлҜёк°Җ к°Ғк°Ғ лӢӨлҘҙкё° л•Ңл¬ёмқҙлӢӨ. вҖҳмӢ (зҘһ)вҖҷмқҙлӮҳ вҖҳмЎҙмһ¬(еӯҳеңЁ)вҖҷлҘј лҢҖмғҒмңјлЎң н•ҳл©ҙ мҡ°лҰ¬лҘј лҚ” лҜёк¶ҒмңјлЎң лӘ°м•„к°„лӢӨ. лӢӨмӢң л§җн•ҙ к°ңл…җкіј лҢҖмғҒмқҳ м •нҷ•н•ң мқјм№ҳлҘј 진лҰ¬лқјкі ліҙлҠ” мҡ°лҰ¬мқҳ нғңлҸ„лҠ” ліём§Ҳм Ғ 진лҰ¬м—җ лҸ„лӢ¬н•ҳкё° м—җлҠ” к·јліём Ғ н•ңкі„к°Җ мһҲлӢӨ.
н•ҳм§Җл§Ң л Ҳ비лӮҳмҠӨлҠ” вҖҳм •мқҳ(жӯЈзҫ©)вҖҷлӮҳ вҖҳнҸүнҷ”вҖҷк°Җ л¬ҙм—Үмқём§Җ м •нҷ•н•ҳкІҢ к·ңм •н• мҲҳ м—ҶлӢӨлҠ” н•ңкі„ мҶҚм—җм„ң, к·ңм •н• мҲҳлҠ” м—Ҷм§Җл§Ң вҖҳмқҙлҜё кІҪн—ҳн•ҳкі мһҲлҠ”вҖҷ 진лҰ¬мқҳ мӮ¬кұҙ мҰү вҖҳк¶Ғк·№м Ғ мЎҙмһ¬вҖҷм—җ лҢҖн•ң нқ¬лҜён•ҳм§Җл§Ң л¬ҙмӢңн• мҲҳ м—ҶлҠ” вҖҳл№ӣвҖҷмқҙ лӢӨк°ҖмҳЁлӢӨкі ліёлӢӨ. к°Җл № вҖҳм •мқҳлһҖ л¬ҙм—ҮмқҙлӢӨвҖҷлҠ” лӘ…нҷ•н•ң к·ңм •ліҙлӢӨ, вҖҳм •мқҳлһҖ л¬ҙм—Үмқј мҲҳ м—ҶлӢӨвҖҷлҠ” мҶҢк·№м Ғмқҙл©° л¶Җм •м Ғ(пҘ§е®ҡзҡ„)мқё к·ңм • мҶҚм—җ лҚ”мҡұ нҺём•Ҳн•ҳкі м№ңмҲҷн•ң 진лҰ¬ кІҪн—ҳмқ„ н• мҲҳ мһҲлӢӨлҠ” кІғмқҙлӢӨ. вҖңн•ңлӮ®м—җ лӮҳнғҖлҠ” л°ӨвҖқ(м—җл§Ҳлүҳм—ҳ л Ҳ비лӮҳмҠӨ, мЎҙмһ¬м—җм„ң мЎҙмһ¬мһҗлЎң, м„ңлҸҷмҡұ мҳ®к№Җ, 96)мқҙлқјлҠ” лӘЁмҲңм–ҙлІ•м—җм„ң л Ҳ비лӮҳмҠӨлҠ” к¶Ғк·№м Ғ мЎҙмһ¬лӮҳ 진лҰ¬м—җ лҢҖн•ң мқёмӢқмқҙ мқёк°„мқҳ кІӘлҠ” нҳјлҸҲкіј н•ңкі„м—җ лҢҖн•ң мІҳм Ҳн•ң кІҪн—ҳ мҶҚм—җ л“ңлҹ¬лӮҳкі мһҲлӢӨлҠ” м җмқ„ к°•мЎ°н•ңлӢӨ.
к·ём—җ л”°лҘҙл©ҙ к¶Ғк·№м Ғ 진лҰ¬м—җ м°ём—¬н• мҲҳ мһҲлҠ” к°ҖлҠҘм„ұмқҖ м№ңмҲҷн•ЁмқҙлӮҳ м№ңл°Җн•Ём—җ мһҲм§Җ м•ҠлӢӨ. мҳӨнһҲл Ө лӢЁм ҲмқҙлӮҳ лӮҜм„Ұ, кҙ‘лӘ…ліҙлӢӨ м–ҙл‘җмӣҖкіј кіөнҸ¬лҘј нҶөн•ҙ мһҗкё° мЈјмІҙмқҳ к°ҖлҠҘм„ұмқ„ лӘЁл‘җ нҸ¬кё°н•ҙк°Ҳ л•Ң к°ҖлҠҘн•ҳлӢӨ. мҳӨнһҲл Ө мһҗмӢ мқҳ мқёкІ©мқ„ нҷ•кі н•ҳкІҢ к·ңм •н–ҲлҚҳ л¶Җ분л“Өмқ„ л¶Җм •н•ҳкұ°лӮҳ мҶҢл©ён•ҳкі м•„л¬ҙкІғлҸ„ м•„лӢҢ кІғ(з„Ў)мңјлЎң лӘ°м•„к°ҖлҠ” л…ёл Ҙм—җм„ң мқёк°„мқҖ мһҗкё° мЎҙмһ¬мҷҖ м„ёкі„лҘј мўҖлҚ” мқјм№ҳмӢңнӮӨкІҢ лҗңлӢӨ. м„ кіј м•…мқҳ 분별мқ„ л„ҳм–ҙм„ңм„ң к·№лӢЁмқ„ мһҗкё°лӮҙл©ҙнҷ”н•ҳл Өкі мӢңлҸ„н•ңлӢӨ. 진лҰ¬мҷҖ 비진лҰ¬мқҳ лҢҖлҰҪкіј 충лҸҢ, к°Ҳл“ұкіј нҲ¬мҹҒмқҙ кІ©л ¬н•ҳкІҢ 진н–үлҗҳм§Җ м•ҠлҠ” кіім—җм„ң мқёк°„мқҳ к¶Ғк·№м Ғ мЎҙмһ¬ л¬ём ңм—җ м ‘к·јн•ҳкё° нһҳл“ӨлӢӨлҠ” кІғмқҙ л Ҳ비лӮҳмҠӨмқҳ м§Җм ҒмқҙлӢӨ.
2м°Ё м„ёкі„лҢҖм „мқҳ мөңлҢҖ н”јн•ҙмһҗмқҳ н•ң мӮ¬лһҢмңјлЎң мӮҙм•ҳлҚҳ нҳ„лҢҖмІ н•ҷмһҗ л Ҳ비лӮҳмҠӨмқҳ мқёк°„ мЎҙмһ¬м—җ лҢҖн•ң кі лҮҢлҘј мғқк°Ғн•ҳл©ҙ вҖҳнҳјлҸҲвҖҷмқ„ м Ғк·№ мӮ¬мң н•ҳл ӨлҠ” к·ёмқҳ нғңлҸ„м—җлҠ” л§ҺмқҖ кіөк°җмқҙ к°„лӢӨ. лӘ°л ӨмҳӨлҠ” мЈҪмқҢмқҳ кіөнҸ¬мҷҖ вҖҳмқёмў…мІӯмҶҢвҖҷмқҳ л°Өмқ„ мқёк°„ мЎҙмһ¬мқҳ мқҳлҜёлЎң мҠ№нҷ”мӢңнӮӨл ӨлҠ” к·ёмқҳ мӮ¬кі лҠ” кҙҖл…җмқҳ мң нқ¬к°Җ м•„лӢҳмқ„ мқём •н•ңлӢӨ.
к·ёлҹ¬лӮҳ л‘җл ӨмӣҖкіј кіөнҸ¬лҘј мҲҳмҡ©н•ҳл ӨлҠ” к·№лӢЁм Ғ мӮ¬мң мҷҖ к·ёкІғмңјлЎңл¶Җн„° лІ—м–ҙлӮҳлҠ” кІғкіјлҠ” м „нҳҖ лӢӨлҘё л¬ём ңлЎң лӮЁлҠ”лӢӨ. кі лҮҢмқҳ к№Ҡмқҙк°Җ к№Ҡмқ„мҲҳлЎқ лӮҳмқҳ мқҳм§ҖмҷҖ м „нҳҖ л¬ҙкҙҖн•ҳкІҢ мЎҙмһ¬н•ҳлҠ” м ҲлҢҖм Ғмқҙл©° м „лҠҘн•ҳмӢ н•ҳлӮҳлӢҳмқҳ мЎҙмһ¬м—җ лҢҖн•ң мқҙн•ҙмқҳ м—¬м§Җк°Җ мӮ¬лқјм§„лӢӨл©ҙ лӮҙ мӢӨмЎҙмқҳ м •нҷ©мқҖ м–ҙл– н• м§Җ мІҳм°ён•ҳкІҢ л¬ҙл„Ҳ진 мҡҘмқҳ мһ…м—җм„ң лӮҳмҳЁ лӢӨмқҢмқҳ кі л°ұмқ„ лҳҗ лӢӨмӢң л– мҳ¬л Ө ліёлӢӨ.
2 вҖңмЈјлӢҳмқҖ лӘЁл“ кІғмқ„ н• мҲҳ мһҲмңјмӢңл©°, мЈјлӢҳмқҳ м–ҙл–Ө кі„нҡҚлҸ„ м Җм§Җлҗ мҲҳ м—ҶмқҢмқ„ м ҖлҠ” м••лӢҲлӢӨ. 3 м•Ңм§Җ лӘ»н•ҳл©ҙм„ң мқҙм№ҳлҘј к°ҖлҰ¬лҠ” мһҗк°Җ лҲ„кө¬мһ…лӢҲк№Ң? м •л§җлЎң м ңк°Җ к№ЁлӢ«м§Җ лӘ»н•ҳкі , м ңкІҢ л„Ҳл¬ҙ кё°л¬ҳн•ҳм—¬ м•Ңм§Җ лӘ»н•ҳлҠ” кІғмқ„ м ңк°Җ л§җн•ҳмҳҖмҠөлӢҲлӢӨ. 4 л“ӨмңјмҶҢм„ң. м ңк°Җ л§җн•ҳкІ мҠөлӢҲлӢӨ. м ңк°Җ мЈјк»ҳ м—¬мӯҷкІ мңјлӢҲ,
м ңкІҢ к°ҖлҘҙм№ҳмҶҢм„ң.(мҡҘ 42:2~4)
|
кёҖм“ҙмқҙ н”„лЎңн•„ кёҖм“ҙмқҙ : л°•нҷҚкё° л°•мӮ¬ (мЈјн•„ мІ н•ҷл°•мӮ¬ лҜёкөӯ мҳӨмқҙмҪ”мҠӨлҢҖн•ҷкөҗ көҗмҲҳ) мқҙл©”мқј : |
 нғ„мҶҢмқҳ м—¬н–ү нғ„мҶҢмқҳ м—¬н–ү |
 м ң2к¶Ң м ң 9 мһҘ мңЁлІ•кіј ліөмқҢмқҳ кҙҖкі„ м ң2к¶Ң м ң 9 мһҘ мңЁлІ•кіј ліөмқҢмқҳ кҙҖкі„ |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