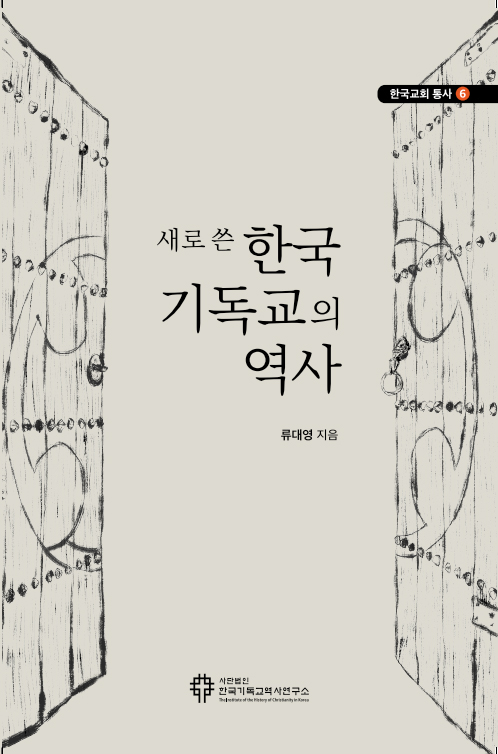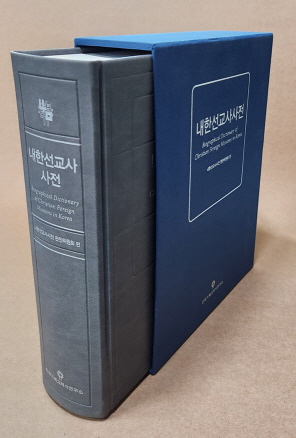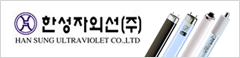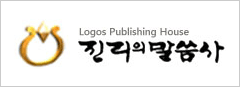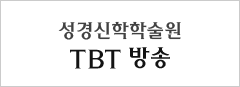мҳӨн”јлӢҲм–ё
м„ұкІҪмқҳ м ҲлҢҖ к¶Ңмң„мҷҖ м •кІҪ нҷ•м •мқҳ м„ӯлҰ¬ кіјм • (в…Ј)
10. мҲҳмӮ¬н•ҷкіј л¬ён•ҷмқҳ мў…кІ°кіј мҷ„м„ұмңјлЎңм„ң м„ұкІҪ
мҙҲлҢҖ көҗнҡҢ лӢ№мӢң кі лҢҖ к·ёлҰ¬мҠӨ мҲҳмӮ¬н•ҷм—җ лҠҘнҶөн–ҲлҚҳ көҗл¶Җл“ӨмқҖ м„ұкІҪмқҳ л¬ён•ҷм Ғ к°Җм№ҳлҘј к·ёлҰ¬мҠӨ кі м „ л¬ён•ҷкіј лҢҖ비н•ҳл©ҙм„ң м„ұкІҪмқҖ кіјкұ° м–ҙл–Ө нҷ”л Өн•ҳкі л°©лҢҖн•ң л¬ён•ҷліҙлӢӨ лӣ°м–ҙлӮң 진лҰ¬мқҳ лӘ…нҷ•м„ұмқ„ ліҙм—¬мЈјкі мһҲлӢӨлҠ” м җм—җм„ңлҸ„ нҷ•мӢ мқ„ кі мҲҳн–ҲлӢӨ. мҰү вҖңм„ұкІҪмқҳ лӢЁмҲңм„ұмқҙ кі лҢҖмқҳ лӢӨлҘё мһ‘н’Ҳл“Өмқҙ к°–кі мһҲлҠ” нҷ”л Өн•Ём—җ лҢҖн•ҙ мҠ№лҰ¬лҘј кұ°л’ҖлӢӨвҖқкі м№ӯмҶЎн–ҲлӢӨ. к°Җл № м•„мҡ°кө¬мҠӨнӢ°лҲ„мҠӨлҠ”, мһҗмӢ мқҳ м „л¬ё 분야мҳҖлҚҳ мҲҳмӮ¬н•ҷ(дҝ®иҫӯеӯё)мқ„ мӨ‘мӢ¬мңјлЎң, м„ұкІҪмқҙ м§ҖлӢҢ л¬ён•ҷ мһ‘н’ҲмңјлЎңм„ң нғҒмӣ”м„ұмқ„ к°•мЎ°н–ҲлӢӨ. к·ёлҠ” л„Ө к°Җм§Җ мӣҗм№ҷмқ„ мҲҳлҰҪн•ңлӢӨ. 1. м„ұкІҪ кё°мһҗл“ӨмқҖ кі лҢҖ мҲҳмӮ¬н•ҷмқҳ мқјл°ҳм Ғ к·ңм№ҷмқ„ л”°лһҗлӢӨ. 2. м„ұкІҪмқҳ мӣ…ліҖкіј к·ё м•„лҰ„лӢӨмӣҖмқҖ кі мң н•ң к°Җм№ҳк°Җ мһҲлӢӨ. 3. м„ұкІҪмқҳ л¬ёмІҙмҷҖ л©”мӢңм§Җ лӮҙмҡ©мқҖ 분лҰ¬лҗ мҲҳ м—ҶлӢӨ.(нҳ„лҢҖ л¬ён•ҷ мқҙлЎ мқҳ нҶ лҢҖ м—ӯн• мқ„ н•Ё) к·ёлҰ¬кі 4. м„ұкІҪмқҳ л¬ён•ҷм Ғ мҲҳмӮ¬лІ•мқҖ мқёк°„мқҳ кё°көҗлЎң л¶Ҳк°ҖлҠҘн•ҳл©° мҳӨм§Ғ н•ҳлӮҳлӢҳмқҳ мқҳм§Җм—җм„ң 비лЎҜн•ңлӢӨ.(169) мқҙн•ҳм—җм„ңлҠ” мқҙлҹ¬н•ң мҲҳмӮ¬н•ҷм Ғ м „нҶөмқҙ м–ҙл–»кІҢ м„ұкІҪ к¶Ңмң„мҷҖ м—°кҙҖлҗҳл©° лӮҳм•„к°Җ м„ұкІҪмқ„ мқёк°„ мғҒмғҒл Ҙмқҳ мӮ°л¬јлЎң м·Ёкёүн–ҲлҚҳ вҖҳм„ұкІҪн•ҷвҖҷмқҳ н•ңкі„лҘј 비нҢҗм ҒмңјлЎң м ‘к·јн•ҳкі мһҗ н•ңлӢӨ.
мҲҳмӮ¬н•ҷкіј л¬ён•ҷм—җ лҢҖн•ң мҙҲлҢҖ көҗнҡҢ м „нҶөмқҖ 16-17м„ёкё° мў…көҗк°ңнҳҒ мӢңкё°мҷҖ к·ё мқҙнӣ„ вҖҳм„ұкІҪкіј л¬ён•ҷмқҳ нҶөн•©вҖҷ л¬ём ңлЎң н–Ҙн–ҲлӢӨ. мў…көҗк°ңнҳҒмһҗл“Өкіј к·ё нӣ„мҳҲл“ӨмқҖ м„ұкІҪмқ„ н•ҳлӮҳлӢҳмқҙ мЈјмӢ вҖҳкі„мӢң л¬ён•ҷвҖҷ(revelational literature)мңјлЎң ліҙкі мһҗ н–ҲлӢӨ.(170) н•ҳм§Җл§Ң кі„мӢңмқҳ мӢ м Ғ к¶Ңмң„лҘј л°ӣм•„л“Өмқҙм§Җ м•ҠмқҖ лҘҙл„ӨмғҒмҠӨ м „нҶөм—җ мҶҚн•ң л¬ён•ҷк°Җл“ӨмқҖ м„ұкІҪлҸ„ мқјл°ҳ л¬ён•ҷ мһ‘н’ҲмІҳлҹј вҖҳмғҒмғҒм—җ мқҳн•ң л¬ён•ҷ(imagivative literature)вҖҷмңјлЎң 분лҘҳн–ҲлӢӨ. мқҙл“ӨмқҖ м„ұкІҪмқ„ вҖңмқёк°„ кІҪн—ҳмқҳ кө¬мІҙм„ұ нҳ№мқҖ нҡҢнҷ”м„ұвҖқ(170)мңјлЎң 분лҘҳн•ҳкі мһҗ н–ҲлӢӨ. м„ұкІҪмқҖ л¬ён•ҷ мһҘлҘҙлЎңм„ң к·ё кө¬мЎ°лҠ” мғҒ징м Ғмқҙл©° мӢңм Ғмқё кІғмңјлЎң мЈјлЎң вҖңмғҒ징주мқҳлқјлҠ” мһҘм№ҳм—җ мқҳмЎҙвҖқ(170)н•ңлӢӨкі ліҙм•ҳлӢӨ. к·ё кІ°кіј м„ұкІҪмқҖ л¬ён•ҷ мһ‘н’ҲмңјлЎңм„ң лҸ…ліҙм Ғмқё мӢ м Ғ к¶Ңмң„лҠ” мӮ¬лқјм§ҖкІҢ лҗңлӢӨ. мқёл¬ёмЈјмқҳлҘј мӢ лҙүн•ҳлҠ” мһ‘к°Җл“Өм—җкІҢ м„ұкІҪмқҖ л¬ён•ҷм Ғ н•ҙм„қм—җ мў…көҗм Ғ мқҳлҜёлҘј к°ҖлҜён•ң кІ°кіјл¬јмқҙлӢӨ. вҖңм„ұкІҪм—җ лҢҖн•ң л¬ён•ҷм Ғ н•ҙм„қмқҙ м„ұкІҪмқ„ кұ°лЈ©н•ң мұ…мңјлЎң м—¬кё°лҠ” мў…көҗм Ғ лҜҝмқҢкіј лі‘н–үвҖқ(170)н•ҳлҠ” кІғмңјлЎң ліҙкі мһҗ н–ҲлӢӨ.
м„ұкІҪм—җм„ң мӢ м Ғ к¶Ңмң„лӮҳ мў…көҗм Ғ лҜҝмқҢмқ„ м җм җ м ңкұ°н•ҳл©ҙм„ң вҖҳлӮӯл§ҢмЈјмқҳвҖҷ(лҢҖлһө н”„лһ‘мҠӨ лҢҖнҳҒлӘ… мӢңлҢҖмқё 1780л…„л¶Җн„° 1850л…„лҢҖ л¬ҙл ө) мӢңлҢҖм—җ мқҙлҘҙл©ҙ м„ұкІҪмқҖ (мӢ м Ғ кі„мӢңмқҳ к¶Ңмң„к°Җ м•„лӢҲлқј) мҳӨм§Ғ л¬ён•ҷм Ғ мёЎл©ҙмқҳ к°Җм№ҳл§Ң л¶Җк°ҒлҗңлӢӨ. вҖңм„ұкІҪмқҳ м„ёкі„м—җ лӮҙнҸ¬лҗң мӣҗмӢңм Ғ лӢЁмҲңм„ұвҖқкіј вҖңм„ұкІҪмқҳ м—¬лҹ¬ мӢңл“Өмқҙ к°–кі мһҲлҠ” м—ҙм •м Ғмқё мҲӯкі н•ЁвҖқ(171)мқҖ м„ұкІҪмқҳ мӢ м Ғ к¶Ңмң„лҘј м•Ҫнҷ”н•ҳлҠ” кІ°кіјлҘј мҙҲлһҳн•ңлӢӨ. мӣҗмӢңм Ғмқё кІғкіј м—ҙм •м Ғмқё кІғм—җ лҢҖн•ң м„ нҳё мқҙмң лҠ”, м„ұкІҪмқҳ мӢ м Ғ к¶Ңмң„ нҷ•мҰқмқҙ лӘ©м Ғмқҙ м•„лӢҲлқј, м„ңкө¬ мӮ¬нҡҢмқҳ м„ёмҶҚнҷ”к°Җ к°ҖмҶҚнҷ”н•ЁмңјлЎңмҚЁ, мӢңмқёл“Өмқҙ вҖңмқёк°„мқҳ мӮ¶ мҶҚмңјлЎң мҳҒм Ғ мӢӨмһ¬вҖқлҘј мЈјмһ…н•ҳкі мһҗ м„ұкІҪм—җм„ң вҖңмҳҲмҲ мқҳ мң„лҢҖн•ң м•”нҳёвҖқ(171)лҘј м°ҫкі мһҗ н–Ҳкё° л•Ңл¬ёмқҙлӢӨ. мқҙлҹ¬н•ң мғҒнҷ©мқ„ лқјмқҙмј„мқҖ мқҙл ҮкІҢ м •лҰ¬н•ңлӢӨ. вҖңлӮӯл§ҢмЈјмқҳ мӢңмқёл“ӨмқҖ л¬ён•ҷмқҳ мӣҗмІңкіј лӘЁлҚёлЎңм„ңмқҳ м„ұкІҪм—җлҠ” кҙҖмӢ¬мқ„ к°ҖмЎҢмңјлӮҳ мў…көҗм Ғ лҜҝмқҢмқҳ мӣҗмІңмңјлЎңм„ңмқҳ м„ұкІҪм—җ лҢҖн•ҙм„ңлҠ” л¬ҙкҙҖмӢ¬н–ҲлӢӨ.вҖқ(172) [н•„мһҗлҠ” мқҙ мһҗмІҙк°Җ мў…көҗк°ңнҳҒмһҗл“Өмқҙ мҷёміӨлҚҳ вҖҳм„ұкІҪк¶Ңмң„вҖҷк°Җ к·ё мӢңлҢҖ л¬ён•ҷк°Җл“Өмқ„ 진лҰ¬мқҳ л§җм”ҖмңјлЎң мӢ¬нҢҗн•ҳлҠ” м—ӯмӮ¬лЎң ліҙкі мһҗ н•ңлӢӨ.] м„ұкІҪ мһҗмІҙмқҳ мӢ м Ғ к¶Ңмң„ліҙлӢӨлҠ” нҳ„лҢҖ л¬ён•ҷмқҳ мӣҗмІңкіј лӘЁлҚёлЎңм„ң к°„мЈјн•ҳкі м„ұкІҪмқ„ лҸ„мҡ©(зӣңз”Ё)н•ҳлҠ” мғҒнҷ©мңјлЎң м „лқҪн•ң кІғмқҙлӢӨ. н•ҳлӮҳлӢҳ л§җм”ҖмңјлЎңм„ң м„ұкІҪ к¶Ңмң„мқҳ вҖҳмӮҙм•„ мһҲлҠ” мҡҙлҸҷл ҘвҖҷ(нһҲ 4:12)мқҙ лӮӯл§ҢмЈјмқҳлҘј мӢ¬нҢҗн•ң кІғмқҙл©° мқҙлҹ¬н•ң н•ҳлӮҳлӢҳмқҳ м„ӯлҰ¬лҠ” к·ё мқҙнӣ„ м„ңкө¬ мЈјлҸ„мқҳ л¬ён•ҷ비нҸүк°Җл“Өм—җлҸ„ мқҙм–ҙ진лӢӨ.
мқҙ мӨ‘ лҢҖн‘ңм Ғ л¬ён•ҷ비нҸүк°Җк°Җ The Educated Imaginationмқҳ м Җмһҗ л…ёмҠӨлҹҪ н”„лқјмқҙ(Northrop Frye, 1912–1991)мқҙлӢӨ. к·ёлҠ”, мӢ м Ғ к¶Ңмң„к°Җ м•„лӢҢ, м„ёмҶҚм Ғ л¬ён•ҷ м„ңнҒҙ м•Ҳм—җм„ң мқёк°„ мғҒмғҒл Ҙмқҳ мӮ°л¬јмқё л¬ён•ҷ мһ‘н’ҲмңјлЎңм„ң вҖҳм„ұкІҪвҖҷм—җ лҢҖн•ң көҗмңЎмқ„ к°•мЎ°н•ңлӢӨ. к·ёмқҳ л§җмқҙлӢӨ. вҖңм„ұкІҪмқҖ л¬ён•ҷ көҗмңЎм—җм„ң к°ҖмһҘ кё°ліёмқҙ лҗҳлҠ” м§Җмёөмқ„ мқҙлЈ¬лӢӨ. к·ёкІғмқҖ мҡ°лҰ¬мқҳ м •мӢ мқҳ л°‘л°”лӢҘк№Ңм§Җ мҠӨл©°л“Ө мҲҳ мһҲлҸ„лЎқ м•„мЈј мҙҲкё°м—җ к·ёлҰ¬кі м•„мЈј мІ м Җн•ҳкІҢ к°ҖлҘҙміҗм•ј н•ңлӢӨ. к·ёлһҳм„ң нӣ—лӮ лӮҳнғҖлӮҳлҠ” лӘЁл“ кІғл“Өмқҙ к·ёкІғм—җ мқҳмЎҙн• мҲҳ мһҲм–ҙм•ј н•ңлӢӨ.вҖқ м–јн•Ҹ м„ұкІҪмқҳ к¶Ңмң„мҷҖ к·ё к°Җм№ҳлҘј к°•мЎ°н•ҳлҠ” кІғмІҳлҹј ліҙмқҙм§Җл§Ң, мқҙлҠ” м„ұкІҪмқҙ мҳӨм§Ғ мқёк°„ мғҒмғҒл Ҙмқҳ мӮ°л¬јмқё л¬ён•ҷ мһ‘н’ҲмқҙлқјлҠ” мӮ¬мӢӨмқ„ м „м ңлЎң н•ңлӢӨ. к·ёмқҳ мқҙлҹ¬н•ң м„ұкІҪм—җ лҢҖн•ң нҸүк°ҖлҠ” л¬ён•ҷ 분야м—җ мҳҒн–Ҙл Ҙмқ„ лҜёміҗм„ң вҖҳм„ұкІҪн•ҷ(biblical scholarship)вҖҷм—җ лҢҖн•ң кҙҖмӢ¬мқ„ кі мЎ°мӢңмј°мңјл©° вҖңмӢ н•ҷм Ғмқҙкі м—ӯмӮ¬м Ғмқё н•ҙм„қм—җ лҢҖн•ң 집착мқҙ л¬ён•ҷм Ғ 분м„қ л°©лІ•м—җ мһҗлҰ¬лҘј лӮҙмЈјлҠ” нҢЁлҹ¬лӢӨмһ„мқҳ ліҖнҷ”вҖқлҘј м•јкё°н–ҲлӢӨ.(173) к·ё кІ°кіј 1990л…„лҢҖ м„ұкІҪ м—°кө¬к°Җ лҢҖн•ҷм—җм„ң л¬ён•ҷ비нҸү кіјлӘ©мңјлЎң нҒ° мқёкё°лҘј лҒҢм—Ҳмңјл©° мқҙлҠ” (мӢ м Ғ к¶Ңмң„мқҳ л§җм”ҖмңјлЎңк°Җ м•„лӢҢ мқёк°„ мғҒмғҒл Ҙмқҳ мӮ°л¬јлЎңм„ң) м„ұкІҪм—җ лҢҖн•ң вҖҳл¬ён•ҷм ҒвҖҷ кҙҖмӢ¬мқ„ мҙүл°ңн–Ҳмңјл©°, мқҙлҠ” м„ұкІҪ к¶Ңмң„ нҷ•мҰқмқ„ мң„н•ң м„ұкІҪ м—°кө¬ л°©лІ•мқ„ мқёл¬ён•ҷмқҳ л¬ён•ҷ비нҸү л°©лІ•м—җ к·ё мһҗлҰ¬лҘј л„ҳкІЁмЈјкІҢ лҗңлӢӨ. мқҙлЎңмҚЁ мқҙм ң м„ұкІҪ ліёл¬ёмқҖ нҳ„лҢҖ л¬ён•ҷ비нҸүмқҳ лҸ„кө¬—кө¬мЎ°мЈјмқҳ, нғҲкө¬мЎ°мЈјмқҳ, лӮҙлҹ¬нӢ°лёҢ 비нҸү лҸ„кө¬—лЎң к·ё к°Җм№ҳк°Җ кІ©н•ҳн•ңлӢӨ. н•„мһҗлҠ” мқҙлҹ¬н•ң кіјм •мқҙ вҖҳмӮҙм•ҳкі мҡҙлҸҷл Ҙ мһҲлҠ” н•ҳлӮҳлӢҳ л§җм”Җмқҳ мҡҙлҸҷл ҘвҖҷ(нһҲ 4:12 м°ёмЎ°)м—җ мқҳн•ң н•ҳлӮҳлӢҳмқҳ кҙҖлҰ¬мҷҖ нҶөм ңмҷҖ мӢ¬нҢҗмқҳ м—ӯмӮ¬лЎң ліҙкі мһҗ н•ҳлҠ” кІғмқҙлӢӨ.
м„ұкІҪмқ„ мқёк°„ мғҒмғҒл Ҙм—җ мқҳн•ң мӮ°л¬јлЎңм„ң к·ңм •н•ҳлҠ” м„ұкІҪн•ҷм—җм„ң л§җн•ҳлҠ” м„ұкІҪмқҳ лҸ…нҠ№м„ұмқҖ вҖңн•ҳлӮҳлӢҳ мӨ‘мӢ¬м„ұкіј мҙҲмһҗм—°м Ғ м •н–Ҙ(е®ҡеҗ‘)вҖқ(176)мқҙлӢӨ. кі лҢҖ л¬ён•ҷл“Өкіј лӢӨлҘё лҸ…нҠ№м„ұмқҖ м„ұкІҪмқҖ вҖңлҚ”мҡұ мқјкҙҖлҗҳкІҢ м„ёмғҒмқҳ мӮ¶мқҳ мқјмғҒм Ғмқё мҳҒм—ӯ мҶҚмңјлЎң м№ЁнҲ¬н•ҙ л“Өм–ҙмҳӨлҠ” н•ҳлӮҳлӢҳмқҳ м„ёкі„вҖқ(176)лҘј ліҙм—¬мӨҖлӢӨкі л§җн•ңлӢӨ. мқҙлҘј л’·л°ӣм№Ён•ҳлҠ” кІғмқҖ вҖҳмӢ м Ғ мҳҒк°җмқҙ к°–лҠ” к¶Ңмң„вҖҷлқјлҠ” нҸүк°Җк№Ңм§Җ мқҙлҒҢм–ҙ лӮҙм—Ҳмңјл©°, мқҙлҠ” м„ұкІҪ 진лҰ¬м—җ лҢҖн•ң м ҲлҢҖм„ұмқ„ к·№лҢҖнҷ”н•ҳлҠ” нҸүк°Җк№Ңм§Җ мқҙлҘҙкІҢ лҗңлӢӨ. мқҙлҹ¬н•ң м„ұкІҪмқҳ м „м ңм Ғ(е°ҲеҲ¶зҡ„) нҠ№м„ұм—җ лҢҖн•ҙ мҳҒкөӯмқҳ л¬ён•ҷмһҗмқҙл©° 비нҸүк°Җмқҙкі лҳҗн•ң ліҖмҰқк°ҖмҳҖлҚҳ C. S. лЈЁмқҙмҠӨ(Clive Staples Lewis, 1898-1963)лҠ” мқҙл ҮкІҢ м •лҰ¬н•ңлӢӨ. вҖңм„ұкІҪмқҳ л§ҺмқҖ л¶Җ분м—җм„ң к·ёкІғмқҳ лӘЁл“ лӮҙмҡ©мқҖ м•”мӢңм ҒмңјлЎң нҳ№мқҖ лӘ…мӢңм ҒмңјлЎң вҖҳм—¬нҳёмҷҖк»ҳм„ң л§җм”Җн•ҳмӢңлҗҳвҖҷлқјлҠ” л§җкіј н•Ёк»ҳ мҶҢк°ңлҗңлӢӨ. м„ұкІҪмқҖ вҖҰвҖҰ лӢЁмҲңнһҲ кұ°лЈ©н•ң мұ…мқҙ м•„лӢҲлқј мІ м Җн•ҳкІҢ к·ёлҰ¬кі м§ҖмҶҚм ҒмңјлЎң кұ°лЈ©н•ң мұ…мқҙкё°м—җ лӢЁм§Җ мӢ¬лҜём Ғмқҙкё°л§Ң н•ң м ‘к·јмқ„ мҡ”кө¬н•ҳм§Җ м•Ҡмқ„ лҝҗ м•„лӢҲлқј, к·ёлҹ° м ‘к·јмқ„ л°°м ңн•ҳкі кұ°л¶Җн•ңлӢӨ.(The Literary Import of the Authorized Version, 32-33)вҖқ(177)
мқҙл ҮкІҢ м„ұкІҪн•ҷмқҖ л¬ён•ҷ 비нҸүмқ„ нҶөн•ҙ м„ұкІҪ кё°лЎқм—җ лҢҖн•ҙ кұ°лЈ©м„ұкіј л¬ён•ҷм Ғ мӢ¬лҜёмЈјмқҳк№Ңм§Җ л„ҳм–ҙм„ңлҠ” к¶Ңмң„к°Җ мһҲлӢӨлҠ” нҸүк°Җм—җ мқҙлҘҙкІҢ лҗңлӢӨ. м„ұкІҪмқ„ мһҘлҘҙ л©ҙм—җм„ң л¬ён•ҷ мһ‘н’Ҳкіј л¬ён•ҷ 비нҸүмқҳ лІ”мЈјм—җ к·ҖмҶҚн•ҳлҠ” кІғмқҖ к·јліё мҳӨлҘҳк°Җ мһҲлӢӨкі м§Җм Ғн•ҳлҠ” м•һмқҳ нҸүк°ҖлҠ” м„ұкІҪн•ҷм—җ лҢҖн•ң м¶ңл°ң мһҗмІҙк°Җ мҳӨлҘҳмқҙл©° к·јмӢңм•Ҳм Ғ н•ңкі„мһ„мқ„ л“ңлҹ¬лӮё кІҪмҡ°лқјкі н• мҲҳ мһҲлӢӨ. лЈЁмқҙмҠӨмқҳ нҸүк°ҖмІҳлҹј м„ұкІҪмқҙ л¬ён•ҷ мһ‘н’Ҳмқ„ нҸүк°Җн•ҳлҠ” мӢ¬лҜём Ғ кҙҖм җмқ„ кұ°л¶Җн•ҳлҠ” кё°лЎқмқҙлқјл©ҙ, мӮ¬мӢӨмғҒ, лҚ” нҒ° кіјм ңк°Җ лӮЁлҠ”лӢӨ. кіјкұ°м—җ мӢ м Ғ к¶Ңмң„мқҳ л§җм”ҖмңјлЎң н•ҙм„қн–ҲлҚҳ кҙҖм җл“Ө-лҢҖн‘ңм ҒмңјлЎң кө¬мҶҚмӮ¬м Ғ кҙҖм җмқҙлӮҳ н•ҳлҠҳлӮҳлқј кҙҖм җ-мқҙ м•„лӢҢ лӢӨлҘё н•ҙм„қн•ҷм Ғ нӢҖмқ„ м ңмӢңн•ҙм•ј н•ңлӢӨлҠ” м җмқҙлӢӨ.
<лӢӨмқҢ нҳём—җ кі„мҶҚ>
|
кёҖм“ҙмқҙ н”„лЎңн•„ кёҖм“ҙмқҙ : л°•нҷҚкё° л°•мӮ¬ (мЈјн•„ мІ н•ҷл°•мӮ¬ лҜёкөӯ мҳӨмқҙмҪ”мҠӨлҢҖн•ҷкөҗ көҗмҲҳ) мқҙл©”мқј : |
 м„ұкІҪмқҳ м ҲлҢҖ к¶Ңмң„мҷҖ м •кІҪ нҷ•м •мқҳ м„ӯлҰ¬ кіјм • (в…§) м„ұкІҪмқҳ м ҲлҢҖ к¶Ңмң„мҷҖ м •кІҪ нҷ•м •мқҳ м„ӯлҰ¬ кіјм • (в…§) |